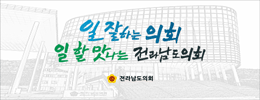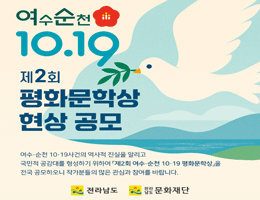[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돈카츠와 돈가스
 |
“밥으로 하시겠습니까? 빵으로 하시겠습니까?” 경양식집에서 이런 질문 한 번쯤 받아 보셨다면, 혹은 소개팅이나 연애를 하면서 돈가스 접시를 앞에 두고 서툰 ‘칼질’ 한 번이라도 해 보신 분이라면, 당신은 이미 장년층이다. 그렇다고 돈가스가 반드시 추억의 음식인 것만은 아니다. 지금도 학교나 군대 급식에서 반찬으로 돈가스가 나오는 날은 여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세대마다 기억하는 방식이 다를 뿐, 돈가스는 여전히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외래 음식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헷갈린다. 과연 이 음식의 올바른 명칭이 돈카츠인지 아니면 돈가스인지.
국립국어원이 제정한 ‘외래어표기법’ 제1장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면 돈카츠 혹은 돈까스가 아닌 돈가스가 올바른 표현이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일 뿐. 표기법이 음식에 담긴 역사를 온전히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돈카츠와 돈가스는 엄연히 다른 음식이다. 그러니 규칙은 잠시 잊고 이 음식의 역사를 통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서기 675년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일본의 텐무왕은 ‘소, 말, 개, 돼지, 원숭이, 닭 등의 육식을 금지한다’는 칙서를 반포했다. 칙서는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인들의 식생활을 규정한다. 왕의 말을 철석같이 따랐던 일본인들은 무려 1200년 동안 이를 지켰다. 그러나 근대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 국가로 탈바꿈한 일본은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지식인과 기술자를 유럽과 미국으로 보냈다. 유럽과 미국을 처음 방문한 일본인들은 서양의 앞선 기술과 문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특히 그들을 절망에 빠트린 것은 자신들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서양인들의 체구였다. 기술과 문화는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었지만 신체 ‘사이즈’ 만큼은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일본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했다. 육식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당시 일본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서양인들처럼 육식을 해야만 그들처럼 크고 단단한 몸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무려 1200년 동안 지켜 왔던 ‘육식 금지’의 역사는 그렇게 무너졌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평생 고기를 멀리해 왔던 사람들에게 육식은 낯설고 두려운 방식이었다. 경계심을 풀어 줄 음식이 필요했다. 그때 발견한 음식이 ‘코틀레트’(cotelette)였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전통 음식이었던 코틀레트는 송아지나 돼지고기 등을 넓게 펴서 소금과 후추 등으로 간을 하고 밀가루, 계란 노른자, 빵가루를 입혀 프라이팬에 버터를 두르고 양면이 갈색이 되도록 굽는 음식이었다. 고기 요리지만 고기처럼 보이지 않으니 안성맞춤이었다. 돼지고기로 만든 ‘포크 코틀레트’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포크 까쓰레쓰’가 된다.
일본은 한 발 더 나아가 포크 까쓰레쓰가 온전히 일본 음식이 되길 원했다. 그 과정에는 아주 분명한 원칙 하나가 있었다. 그들의 주식인 밥과 어울려야 했다. 포크 까쓰레쓰의 개량이 시작됐다. 우선 포크와 나이프를 버렸다. 젓가락만으로 먹을 수 있어야 일본 음식답다고 믿었다. 기름에 튀겨 낸 고깃덩어리를 칼로 잘랐다. 밥반찬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간이 필요했다. 영국의 우스터소스를 개량해 이를 끼얹거나 찍어 먹도록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된장국을 곁들였다. 비로소 일본 음식다워 보였다. 내친김에 명칭에서도 서양의 느낌을 지워 버렸다. 포크는 돼지 돈(豚)으로 바꾸고 까쓰레쓰는 카츠로 줄였다. ‘돈카츠’는 이렇게 탄생했고 이후 일본 근대 음식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일제 강점기 서양 음식의 대표 주자로 한반도에 전해진 포크 까쓰레쓰는 해방 이후 일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착된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원형인 코틀레트에 가깝게 변형됐다. 스프를 곁들이고 여전히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며 심지어 명칭도 ‘포크 커틀릿’이라는 영어식 표현을 쓰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양분식집’으로 상징되는 대중음식점에서는 대중화의 길을 걷는다. 주식인 밥과 어울리도록 한다는 목표는 일본과 같았지만 방식은 달랐다. 한국식과 서양식을 절충하는 방식을 택한다. 고기를 최대한 얇고 넓게 펴고 우스터소스 대신 브라운 그래비소스를 베이스로 만든 소스를 끼얹고 포크와 나이프를 유지하는 대신 숟가락과 젓가락을 더했다. 더욱 극적인 것은 김치, 깍두기, 풋고추를 곁들이고 된장찌개까지 함께 냄으로써 일종의 백반 개념을 구현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인이 분식집이나 기사 식당 등에서 흔히 만나는 돈가스 혹은 ‘돈까스’다.
코틀레트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돈카츠와 돈가스는 엄연히 다른 음식이다. 돈카츠가 일본 음식이라면 돈가스는 당연히 한국 음식이다. ‘돈가스 백반’이나 ‘왕돈까스’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오로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음식이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가 만든 이 대담한 전통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맛 칼럼니스트>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 국가로 탈바꿈한 일본은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지식인과 기술자를 유럽과 미국으로 보냈다. 유럽과 미국을 처음 방문한 일본인들은 서양의 앞선 기술과 문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특히 그들을 절망에 빠트린 것은 자신들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서양인들의 체구였다. 기술과 문화는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었지만 신체 ‘사이즈’ 만큼은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일본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했다. 육식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당시 일본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서양인들처럼 육식을 해야만 그들처럼 크고 단단한 몸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무려 1200년 동안 지켜 왔던 ‘육식 금지’의 역사는 그렇게 무너졌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평생 고기를 멀리해 왔던 사람들에게 육식은 낯설고 두려운 방식이었다. 경계심을 풀어 줄 음식이 필요했다. 그때 발견한 음식이 ‘코틀레트’(cotelette)였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전통 음식이었던 코틀레트는 송아지나 돼지고기 등을 넓게 펴서 소금과 후추 등으로 간을 하고 밀가루, 계란 노른자, 빵가루를 입혀 프라이팬에 버터를 두르고 양면이 갈색이 되도록 굽는 음식이었다. 고기 요리지만 고기처럼 보이지 않으니 안성맞춤이었다. 돼지고기로 만든 ‘포크 코틀레트’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포크 까쓰레쓰’가 된다.
일본은 한 발 더 나아가 포크 까쓰레쓰가 온전히 일본 음식이 되길 원했다. 그 과정에는 아주 분명한 원칙 하나가 있었다. 그들의 주식인 밥과 어울려야 했다. 포크 까쓰레쓰의 개량이 시작됐다. 우선 포크와 나이프를 버렸다. 젓가락만으로 먹을 수 있어야 일본 음식답다고 믿었다. 기름에 튀겨 낸 고깃덩어리를 칼로 잘랐다. 밥반찬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간이 필요했다. 영국의 우스터소스를 개량해 이를 끼얹거나 찍어 먹도록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된장국을 곁들였다. 비로소 일본 음식다워 보였다. 내친김에 명칭에서도 서양의 느낌을 지워 버렸다. 포크는 돼지 돈(豚)으로 바꾸고 까쓰레쓰는 카츠로 줄였다. ‘돈카츠’는 이렇게 탄생했고 이후 일본 근대 음식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일제 강점기 서양 음식의 대표 주자로 한반도에 전해진 포크 까쓰레쓰는 해방 이후 일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착된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원형인 코틀레트에 가깝게 변형됐다. 스프를 곁들이고 여전히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며 심지어 명칭도 ‘포크 커틀릿’이라는 영어식 표현을 쓰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양분식집’으로 상징되는 대중음식점에서는 대중화의 길을 걷는다. 주식인 밥과 어울리도록 한다는 목표는 일본과 같았지만 방식은 달랐다. 한국식과 서양식을 절충하는 방식을 택한다. 고기를 최대한 얇고 넓게 펴고 우스터소스 대신 브라운 그래비소스를 베이스로 만든 소스를 끼얹고 포크와 나이프를 유지하는 대신 숟가락과 젓가락을 더했다. 더욱 극적인 것은 김치, 깍두기, 풋고추를 곁들이고 된장찌개까지 함께 냄으로써 일종의 백반 개념을 구현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인이 분식집이나 기사 식당 등에서 흔히 만나는 돈가스 혹은 ‘돈까스’다.
코틀레트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돈카츠와 돈가스는 엄연히 다른 음식이다. 돈카츠가 일본 음식이라면 돈가스는 당연히 한국 음식이다. ‘돈가스 백반’이나 ‘왕돈까스’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오로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음식이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가 만든 이 대담한 전통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맛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