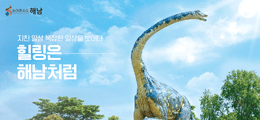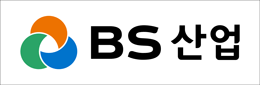누군가를 온전히 ‘존중하는 태도’- 신우진 광주시민인문학(협) 이사장
 |
고등학교 1학년 새 학기를 맞이한 어느 봄날이었다. 새 교복의 빳빳한 촉감, 교실 창밖으로 스쳐 가던 따뜻한 바람, 어딘가 어색하고 설레는 분위기. 그런 날들 한가운데에서 나는 운명처럼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원제: 노르웨이의 숲)를 만났다.
그날 이후로 나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었다. ‘상실의 시대’ 속 와타나베 토오루를 알게 되면서였다. 그는 특별히 화려한 인물도, 특별한 재능을 지닌 인물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청년. 그러나 그는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침묵 속에서도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섣불리 조언하거나 위로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짓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방식으로 타인의 외로움과 어깨를 맞대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매료되었다. 단숨에, 그리고 깊게. 그때 처음 깨달았다. 세상에는 거창한 목표나 성취보다도, 누군가를 온전히 ‘존중하는 태도’가 더 절실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와타나베처럼 살고 싶다는 바람은 내게 하나의 윤리가 되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쉽게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속도를 맞추어주는 것.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방식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퇴색되지 않았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지키고 싶은 방향감각이자, 내 마음속 북극성이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전부 모아 반복해 읽었다. 그의 문장은 기묘하게 고요했다. 쓸쓸하면서도 따뜻했고, 고독하지만 결코 절망적이지 않았다. 하루키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무수히 길을 잃고 방황한다. 그러나 그 고독은 어쩌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이기도 했다. 누구도 완벽하게 이해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연대가 있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침묵으로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순간들.
나는 하루키의 문장 속에서 ‘타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와타나베의 태도를 삶에 적용하려 애썼다. 말수를 줄이고, 먼저 나서지 않고, 상대가 마음을 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내 방식이었다. 연애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요한 협정 같은 것이니까. 서로의 고독을 인정하면서도 끝내 곁을 지키는 것.
그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면, 나는 자주 하루키의 소설 문구를 인용했다. “봄날의 아기 곰만큼 네가 좋아!” “온 세계에 조용히 내리는 비처럼 널 그리워해!” 언제 읽어도 참으로 달콤하고 순수한 문장들이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다정하고 담담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늘 놀라웠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친절함’이란 결국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지켜내는 습관.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를 향한 존중을 하나의 생활양식처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와타나베가 보여준 방식이었다.
하루키의 인물들이 보여준 배려는 결코 감상적이지 않다. 그들은 때로는 차갑고, 무심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결코 무례하지 않고, 거리감을 두되 무관심하지 않다. 이 미묘한 온도. 바로 이 균형을 나는 배우고 싶었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시에 나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나를 존중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아직도 내 방 책장엔 ‘상실의 시대’가 가장 손이 잘 닿는 자리에 놓여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펼치지는 않지만, 힘들거나 길을 잃은 기분이 들 때면, 무심코 그 표지를 스쳐본다. 그러면 마치 오래전 봄날의 다짐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살아가자.” 누군가를 존중하고, 끝까지 들어주며,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다.
그날 이후로 나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었다. ‘상실의 시대’ 속 와타나베 토오루를 알게 되면서였다. 그는 특별히 화려한 인물도, 특별한 재능을 지닌 인물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청년. 그러나 그는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침묵 속에서도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섣불리 조언하거나 위로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짓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방식으로 타인의 외로움과 어깨를 맞대는 사람이었다.
나는 하루키의 문장 속에서 ‘타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와타나베의 태도를 삶에 적용하려 애썼다. 말수를 줄이고, 먼저 나서지 않고, 상대가 마음을 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내 방식이었다. 연애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요한 협정 같은 것이니까. 서로의 고독을 인정하면서도 끝내 곁을 지키는 것.
그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면, 나는 자주 하루키의 소설 문구를 인용했다. “봄날의 아기 곰만큼 네가 좋아!” “온 세계에 조용히 내리는 비처럼 널 그리워해!” 언제 읽어도 참으로 달콤하고 순수한 문장들이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다정하고 담담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늘 놀라웠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친절함’이란 결국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지켜내는 습관.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를 향한 존중을 하나의 생활양식처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와타나베가 보여준 방식이었다.
하루키의 인물들이 보여준 배려는 결코 감상적이지 않다. 그들은 때로는 차갑고, 무심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결코 무례하지 않고, 거리감을 두되 무관심하지 않다. 이 미묘한 온도. 바로 이 균형을 나는 배우고 싶었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시에 나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나를 존중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아직도 내 방 책장엔 ‘상실의 시대’가 가장 손이 잘 닿는 자리에 놓여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펼치지는 않지만, 힘들거나 길을 잃은 기분이 들 때면, 무심코 그 표지를 스쳐본다. 그러면 마치 오래전 봄날의 다짐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살아가자.” 누군가를 존중하고, 끝까지 들어주며,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