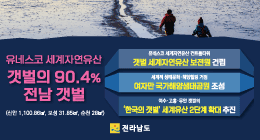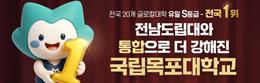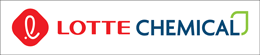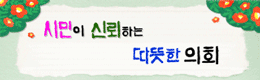1980년·2024년 두 번의 계엄…거리의 기억을 노래로 연결하다
‘공명-기억과 연결된 현재’전
사운드아트-미디어아트 아카이브
8월 1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사운드아트-미디어아트 아카이브
8월 1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8월17일까지 민주인권평화전 ‘공명-기억과 연결된 현재’를 연다. |
‘임을 위한 행진곡’, ‘오월의 노래’, ‘광주출정가’, ‘그날이 오면’….
80년대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많이 불렸던 민중가요들이다. 노래 속에는 당시의 아픔과 상흔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
시대를 초월해 불리는 노래에는 생명력이 있다. 당대의 모순과 불의에 저항하며 불렀던 노래는 그 시대를 헤쳐 왔던 이들의 가슴에 선명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파면으로 막을 내린 비상계엄은 광주시민들에게 80년 5·18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시대는 다르지만 80년. 2024년 두 계엄령은 데자뷔처럼 많은 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줬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불의에 저항하며 연대했다. 거기에는 바로 노래가 있었다. 시민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는 바로 ‘노래’인 것이다.
5·18과 2024년 거리의 기억을 노래라는 매개체로 연결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오는 8월 17일까지 ‘공명-기억과 연결된 현재’를 주제로 제1~2전시실에서 전시를 펼친다.
주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수상 강연이 모티브가 됐다. 한강은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전시실은 사운드아트-미디어아트 작품과 음악을 소재로 한 아카이브로 구성됐다. 역사적 사건, 시민의 목소리를 시각적으로 담아내 관객들이 해석하고 참여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먼저 전시실에 들어서면 다채로운 아카이브로를 만난다. ‘임을 위한 행진곡’, ‘오월의 노래’, ‘광주출정가’, ‘그날이 오면’ 등 시민들에게 익숙한 20여 곡이 플레이리스트로 구성돼 전시장 곳곳에서 울려 퍼진다. ‘음악적 기억’이 시공간을 넘어 오늘에 현현하는 실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적이다.
정희석 학예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음악사에도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명확해진 빌런, 선명해진 정의, 뚜렷해진 저항의 방법, 대학가 중심으로 노래를 즐기는 문화에 변화가 찾아왔다”며 “음악에 내포된 감성적 연결선이 사회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각과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에서는 1984년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 출신 멤버들과 이화여대 ‘한소리’, 고려대 ‘노래얼’, 성균관대 ‘소리사랑’ 등 졸업생들이 ‘새벽’을 조직하고 ‘노래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또한 정희석 학예사는 “80년 5월 14일~16일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는 민족민주화성회가 열렸다. 광주 시내 거리 행진이나 분수대 광장 집회에서 ‘아리랑’,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애국가’, ‘선구자’ 등을 불렀고 ‘아침이슬’, ‘투사의 노래’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불렀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는 많은 시민들이 합류하며 누구나 알 수 있는 노래와 쉽게 배울 수 있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전시장에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김민기 ‘학전’ 대표, 노래패 새벽에 관한 아카이브 자료들도 만날 수 있다.
특히 노찻사를 소개하는 내용은 80년대를 살아온 관객들에게는 아련한 추억과 기억을 환기한다. 다음은 노찾사 홈페이지에 소개된 일부 글이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음반은 노래패 1세대가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서 ‘노래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하나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음반은 당시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음반사가 창고에 묻어두면서 사실상 사장됐다. 이후 1987년 6월 항쟁의 민주화의 국면에서 우리 삶에 밀착된 진실한 노래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고, 이를 계기로 1집 음반 참가자를 중심으로 동명의 노래 모임을 결성해 그해 가을(1987년 10월 13일) 첫 공연을 가졌다.”
전시 후반부는 민중가요를 비롯해 개사곡, K-팝 등 다양한 장르가 혼재된 음악 문화를 보여준다. 현장의 시민들은 단순한 수용자를 넘어 재해석의 주체, 다양한 문화소비자로 참여했다는 방증이다.
권혜원의 ‘바리케이드에서 만나요’를 비롯해 성기완의 ‘HLKG518’, 신도원의 ‘너-기억의 투영’, 임용현의 ‘발화의 등대’, 양민하의 ‘그대와 그대의 대화’ 등은 기억과 노래를 매개로 의미있는 메시지를 발신한다.
한편 윤익 관장은 “노래는 동서고금을 넘어 가장 강력한 소통의 매개체 가운데 하나”라며 “80년대와 2024년 계엄령 하에서 시민들이 불렀던 노래는 동시대 예술로서 공명한 명징한 사례”라고 전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80년대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많이 불렸던 민중가요들이다. 노래 속에는 당시의 아픔과 상흔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
시대를 초월해 불리는 노래에는 생명력이 있다. 당대의 모순과 불의에 저항하며 불렀던 노래는 그 시대를 헤쳐 왔던 이들의 가슴에 선명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불의에 저항하며 연대했다. 거기에는 바로 노래가 있었다. 시민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는 바로 ‘노래’인 것이다.
5·18과 2024년 거리의 기억을 노래라는 매개체로 연결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주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수상 강연이 모티브가 됐다. 한강은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전시실은 사운드아트-미디어아트 작품과 음악을 소재로 한 아카이브로 구성됐다. 역사적 사건, 시민의 목소리를 시각적으로 담아내 관객들이 해석하고 참여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먼저 전시실에 들어서면 다채로운 아카이브로를 만난다. ‘임을 위한 행진곡’, ‘오월의 노래’, ‘광주출정가’, ‘그날이 오면’ 등 시민들에게 익숙한 20여 곡이 플레이리스트로 구성돼 전시장 곳곳에서 울려 퍼진다. ‘음악적 기억’이 시공간을 넘어 오늘에 현현하는 실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적이다.
정희석 학예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음악사에도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명확해진 빌런, 선명해진 정의, 뚜렷해진 저항의 방법, 대학가 중심으로 노래를 즐기는 문화에 변화가 찾아왔다”며 “음악에 내포된 감성적 연결선이 사회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각과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에서는 1984년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 출신 멤버들과 이화여대 ‘한소리’, 고려대 ‘노래얼’, 성균관대 ‘소리사랑’ 등 졸업생들이 ‘새벽’을 조직하고 ‘노래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또한 정희석 학예사는 “80년 5월 14일~16일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는 민족민주화성회가 열렸다. 광주 시내 거리 행진이나 분수대 광장 집회에서 ‘아리랑’,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애국가’, ‘선구자’ 등을 불렀고 ‘아침이슬’, ‘투사의 노래’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불렀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는 많은 시민들이 합류하며 누구나 알 수 있는 노래와 쉽게 배울 수 있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전시장에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김민기 ‘학전’ 대표, 노래패 새벽에 관한 아카이브 자료들도 만날 수 있다.
특히 노찻사를 소개하는 내용은 80년대를 살아온 관객들에게는 아련한 추억과 기억을 환기한다. 다음은 노찾사 홈페이지에 소개된 일부 글이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음반은 노래패 1세대가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서 ‘노래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하나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음반은 당시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음반사가 창고에 묻어두면서 사실상 사장됐다. 이후 1987년 6월 항쟁의 민주화의 국면에서 우리 삶에 밀착된 진실한 노래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고, 이를 계기로 1집 음반 참가자를 중심으로 동명의 노래 모임을 결성해 그해 가을(1987년 10월 13일) 첫 공연을 가졌다.”
전시 후반부는 민중가요를 비롯해 개사곡, K-팝 등 다양한 장르가 혼재된 음악 문화를 보여준다. 현장의 시민들은 단순한 수용자를 넘어 재해석의 주체, 다양한 문화소비자로 참여했다는 방증이다.
권혜원의 ‘바리케이드에서 만나요’를 비롯해 성기완의 ‘HLKG518’, 신도원의 ‘너-기억의 투영’, 임용현의 ‘발화의 등대’, 양민하의 ‘그대와 그대의 대화’ 등은 기억과 노래를 매개로 의미있는 메시지를 발신한다.
한편 윤익 관장은 “노래는 동서고금을 넘어 가장 강력한 소통의 매개체 가운데 하나”라며 “80년대와 2024년 계엄령 하에서 시민들이 불렀던 노래는 동시대 예술로서 공명한 명징한 사례”라고 전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