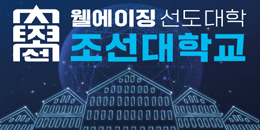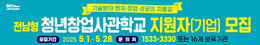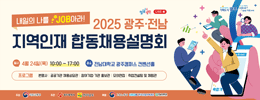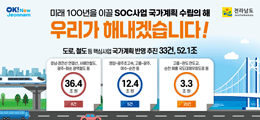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말- 김진균 성균관대 초빙교수
 |
한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한다. 현행법상 주당 노동 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낮추면 사용자는 직장건강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등의 여러 부담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맡을 일을 여러 명에게 맡겨서, 누구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게 만드는 ‘쪼개기 노동’이란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하루에 몇 개의 사업장을 전전해도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삶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에서 끝없는 생존의 미로를 헤매다닐 수밖에 없다.
초단시간 노동자 증언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매우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여러 대학을 오가며 강의를 해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비정규 교수의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발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차마 준비해간 이야기를 제대로 늘어놓지 못했다.
노년유니온에서 나온 분은 이렇게 말했다. 사무실에 웬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찾아와 박카스 한 병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고 한다. 이런 데에 뭘 이런 걸 사오시느냐고 감사의 인사를 하며 그 박카스 병을 집어들었는데 허름한 노인은 화를 내며 그거 자기가 먹을 것이니 먹지 말라고 하더란다. 고약한 노인이 주지도 않을 박카스를 왜 꺼내놨나 싶었는데 그 안에 담긴 것은 박카스가 아니라 농약이었다고 한다.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입으로 밥값과 병원비를 감당하며 어렵사리 버티고 있던 노인은, 그 일자리사업이 없어져서 이제는 밥을 굶든 병원을 못 가든 할 판이라, 어차피 죽을 거 이런 데에서 마지막 하소연이나 하고 죽으려고 가져왔다고 한다. 함께 울며 잘 달래서 돌려보냈다고는 하는데 그 노인은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공공사업 규모를 축소 편성한 직후였다.
또 다른 발언자는 재가요양보호사 측에서 나온 분이었다. 초단시간 노동이라고 해도 사실상 365일 밤낮없이 일하게 되는 셈이라는 얘기와 휴식 없는 노동으로 건강을 잃어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처럼 치료가 필요한 처지가 되어버린 얘기. 더듬더듬 발언하던 끝에 울음을 삼키느라 준비한 내용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도 못했단다.
농약을 들고 방황했을 그 노인과 울음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한 재가요양보호사분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말을 품고 살았을 것이다. 들리지 않을 말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처지는 누구도 헤아려주지 않는다.
대학 강의의 절반을 책임지면서도 인건비는 1할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 교수는 방학 기간마다 보릿고개를 겪고, 공강 시간마다 캠퍼스를 유령처럼 떠돌며, 대학의 의사 결정 구조에서도 철저히 배제된다. 비정규 교수의 처지를 제대로 헤아려주는 사람도 없고 비정규 교수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도 없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말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누군가보다는 더 나은 편일지도 모른다.
목민심서의 ‘형전’에 갓난아이는 아프거나 가려워도 스스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갓난아이의 병을 ‘벙어리과(啞科)’라고 한다는 대목이 있다. 정약용은 이 비유를 통해 하소연조차 어려운 백성들의 처지를 이해하라고 수령에게 요구했던 것이다. 갓난아이의 병을 살피듯 말 못 하는 이들의 하소연을 듣듯 백성의 사정을 살피는 것이 수령의 임무라는 뜻이다. 백성들을 양떼처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 그 시대의 가장 양심적이었던 엘리트의 윤리관이라서 모든 시민이 자기 입장을 스스로 말할 수 있다고 믿는 21세기의 사회에서는 낡은 시대의 철지난 이야기로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력과 문화를 자랑하게 된 지금도 수렁에 빠진 약자들은 여전히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말을 품고 살아간다. 수렁에 빠진 이들은 운이 나빴고 빠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들도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모두가 수렁 속에서 좌절을 겪거나 그 옆에서 불안을 달고 살아간다. 각자도생이 유일한 전략이 되어버린 사회는 그 자체로 더 깊은 수렁을 만든다. 수렁을 메우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무간도의 풍경이 영원히 지속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서로에게 말 못 하는 이들의 하소연을 듣듯 귀를 기울이고, 갓난아이의 병을 살피듯 돌봐주어야 함께 수렁을 메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 끝없는 무간도를 벗어나는 문이 열린다.
또 다른 발언자는 재가요양보호사 측에서 나온 분이었다. 초단시간 노동이라고 해도 사실상 365일 밤낮없이 일하게 되는 셈이라는 얘기와 휴식 없는 노동으로 건강을 잃어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처럼 치료가 필요한 처지가 되어버린 얘기. 더듬더듬 발언하던 끝에 울음을 삼키느라 준비한 내용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도 못했단다.
농약을 들고 방황했을 그 노인과 울음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한 재가요양보호사분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말을 품고 살았을 것이다. 들리지 않을 말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처지는 누구도 헤아려주지 않는다.
대학 강의의 절반을 책임지면서도 인건비는 1할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 교수는 방학 기간마다 보릿고개를 겪고, 공강 시간마다 캠퍼스를 유령처럼 떠돌며, 대학의 의사 결정 구조에서도 철저히 배제된다. 비정규 교수의 처지를 제대로 헤아려주는 사람도 없고 비정규 교수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도 없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말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누군가보다는 더 나은 편일지도 모른다.
목민심서의 ‘형전’에 갓난아이는 아프거나 가려워도 스스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갓난아이의 병을 ‘벙어리과(啞科)’라고 한다는 대목이 있다. 정약용은 이 비유를 통해 하소연조차 어려운 백성들의 처지를 이해하라고 수령에게 요구했던 것이다. 갓난아이의 병을 살피듯 말 못 하는 이들의 하소연을 듣듯 백성의 사정을 살피는 것이 수령의 임무라는 뜻이다. 백성들을 양떼처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 그 시대의 가장 양심적이었던 엘리트의 윤리관이라서 모든 시민이 자기 입장을 스스로 말할 수 있다고 믿는 21세기의 사회에서는 낡은 시대의 철지난 이야기로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력과 문화를 자랑하게 된 지금도 수렁에 빠진 약자들은 여전히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말을 품고 살아간다. 수렁에 빠진 이들은 운이 나빴고 빠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들도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모두가 수렁 속에서 좌절을 겪거나 그 옆에서 불안을 달고 살아간다. 각자도생이 유일한 전략이 되어버린 사회는 그 자체로 더 깊은 수렁을 만든다. 수렁을 메우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무간도의 풍경이 영원히 지속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서로에게 말 못 하는 이들의 하소연을 듣듯 귀를 기울이고, 갓난아이의 병을 살피듯 돌봐주어야 함께 수렁을 메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 끝없는 무간도를 벗어나는 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