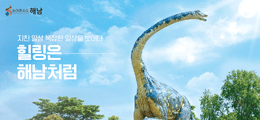[80년 되짚어 본 광주·전남 아·태전쟁 유적] 왜적 막아낸 이순신 호국의 섬에 日 군용 동굴 ‘아픈 상처’
<5> 목포 고하도
日, 1945년 세계대전 전세 불리해지자
일본 가는 길목 ‘목포’ 요새화하기 시작
전남산 물자 빼돌릴 전략적 항구로 이용
해안절벽 따라 남겨진 동굴 17개로 추정
군수물자 수송용으로 사용 가능성 높아
조건 교수 “한반도 침략전쟁 직접 증거물”
日, 1945년 세계대전 전세 불리해지자
일본 가는 길목 ‘목포’ 요새화하기 시작
전남산 물자 빼돌릴 전략적 항구로 이용
해안절벽 따라 남겨진 동굴 17개로 추정
군수물자 수송용으로 사용 가능성 높아
조건 교수 “한반도 침략전쟁 직접 증거물”
 목포 고하도의 북동부에 목포항 방향으로 뚫린 주정기지. 밀물이 들면 동굴 안쪽까지 물이 차올라 배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된 흔적이 뚜렷하다. |
깎아지른 듯한 해안절벽과 섬을 덮은 숲 사이로 솟아오른 해송(海松), 자연 절경이 바다 너머 유달산과 목포 시가지와 함께 어우러지는 목포시 유달동의 섬 ‘고하도’에는 숨겨진 수십개의 깊은 ‘흉터’가 남아 있다.
고하도 해안절벽을 따라 곳곳에 검게 뚫려 있는 해안 동굴이 그것이다. 자연동굴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각형’ 형태의 이 동굴들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일본군이 조선인 민간인들을 대거 동원해 군사용 동굴을 뚫게 한 흔적이다.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그들의 노동력으로 조선 땅에 구멍을 내고 속을 파낸 흔적은 지금도 흉터처럼 섬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다.
더욱이 고하도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이후 수군의 본진을 차렸던 곳으로, 전남도 지정 문화유산인 ‘이충무공 유적’과 조선시대 세워진 ‘이충무공 기념비’가 남아있는 곳이다.
고하도에 남은 일본군의 흔적들은,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막아낸 역사를 품은 섬을 되레 일본군이 차지하고 자신들의 전선(戰線)으로 삼았다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
고하도는 목포 유달산 남쪽으로 목포항을 둘러싸고 있는 섬으로, ‘높은 산’인 유달산 아래(高下)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전해진다. 다른 이름으로는 보화도, 비로도, 칼섬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은 목포를 광주·전남 서부 지역의 대외 진출지이자 전남 지역 물자를 일본이나 제주도로 옮길 수 있는 전략적인 항구로 여겼다.
당초 일본은 아·태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 즈음인 1944년까지도 목포에 별다른 군사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1945년께 전황이 불리해지자 미국이 제주도를 거쳐 일본 본토까지 침투할 것으로 보고 그 길목인 목포를 최전선으로 삼아 요새화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고하도는 목포항과 불과 1.2㎞ 떨어져 있을 만큼 가까웠던 터라 일본군은 고하도를 곧장 군사 기지로 개조하고 나섰다. 조선인 민간인들을 강제동원해 고하도 해안 곳곳에 1945년 8월 패전 직전까지 군사용 동굴을 파게 한 것이다.
고하도에서 확인된 일본군이 남긴 동굴은 총 17개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 동굴진지 2곳을 제외한 대부분인 15개 동굴은 해안가를 따라 조성된 주정(舟艇·소형 배)기지다. 주정기지 중 현재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11개다.
주정기지는 폭 3.5~5m, 높이 3m, 길이는 6.8~18m 수준으로 사각형, 원형 등 모양으로 뚫려 있다.
대부분 미완성 상태에서 중단돼 공정률은 60~70% 안팎으로 추정되며, 동굴 내에는 해안의 단단한 암반을 뚫기 위해 정(丁)으로 깎아내거나 폭약을 사용해 파낸 흔적이 남아 있다. 동굴 벽을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섬 북서쪽의 ‘용머리’에는 7개의 동굴이 몰려있다.이 동굴들은 먼 바다에서 목포항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용머리 외 동굴은 섬 북동쪽에 있으며 외해(外海)가 아닌 목포항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주정기지는 동굴 바닥을 바다 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만들고 해안까지 평탄화 작업을 해 배를 내기 좋게 했으며, 해안가에 바짝 붙여 만들어 밀물이 들면 동굴 내부로 물이 차오르게 설계돼 있다.
고하도 주정기지는 군수 물자를 옮기기 위한 ‘발동정’(發動艇·상륙용 배)을 은닉하기 위한 동굴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단거리 연안을 오가며 물자 수송을 하기 위한 길이 10m 안팎의 소발동정(쇼하츠), 15m 안팎의 대발동정(다이하츠) 등을 숨겨 놓았다는 것이다.
일본군이 1944년 10월에 세운 ‘조선군 축성계획’이 근거다.
이 계획에는 목포 일대에 선박항행 또는 박지(泊地)를 엄호하는 임시 포대를 구축하고, 그 포대를 엄호하는 동시에 상륙 방어를 위한 보병 2개 대대분을 축성하며 소형 주정에 의한 연안항로대(沿岸航路帶)를 설정하기 위해 목포 등지에 주정 기지 공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일본군은 고하도를 목포·여수에 모인 군수물자를 미군의 감시·방해를 피해 제주도까지 옮기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 삼았다는 것이 된다.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적선을 공격하기 위한 자살특공정을 숨겨두기 위해 주정기지를 만들었다는 연구도 있다.
고하도에는 주정기지 외에도 일본군의 흔적이 남아있다.
고하도 북동쪽의 ‘윗마을’ 인근 도로 한 켠에는 길이 40m에 너비 6m, 높이 3.5m의 길쭉한 건물이 있다. 이순신 장군이 수군 통제영을 차렸던 유적지로부터가 불과 180m 떨어진 곳이다.
이 건물은 과거 일본군이 주둔했던 막사로 추정되고 있다. 이 건물은 광복 후 섬 사람들의 교회 내지 기도원으로 활용되다가 현재는 버려진 상태다.
현재 내부에는 교회에 있을 법한 교단과 나무 십자가 등이 널브러져 있으며 오랜 기간 방치돼 천장재가 떨어지고 바닥 목재가 꺼진데다 수십년 세월의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다.
막사 건물 뒤편에도 일본군이 만들어놓은 15m 길이의 동굴이 있다. 입구는 3.6m, 높이는 1.8m로 비교적 작은 동굴로, 공습 대피용 또는 물자 보관용으로 뚫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동굴은 바닥 마감이 돼 있지 않고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돼 있지 않은 점,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 폭격 등을 당하면 봉쇄될 위험이 큰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미완성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 인근에는 또 너비 3.3m, 높이 2.3m, 길이 70m 수준의 동굴이 하나 더 있는데, 역시 방공호 또는 물자보관소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건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목포 고하도는 1945년도 일본이 미군의 공격을 막는 ‘본토 결전’을 준비하면서 일본 땅이 아닌 한반도를 전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침략전쟁의 직접적인 증거물이다”며 “목포뿐 아니라 제주도와 여수, 남해 등 남해안 전역에 동굴을 뚫겠다며 조선 사람들을 강제 동원한 아픔이 그대로 서려 있는 현장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고하도 북동쪽에 있는 일부 주정기지는 해상데크로 연결돼 관광자원화 됐으나, 나머지 동굴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하도와 접해 있는 허사도 또한 20여개 주정기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나, 목포 신항만이 조성되고 목포대교가 개통되는 사이 상당수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
/목포=글·사진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고하도 해안절벽을 따라 곳곳에 검게 뚫려 있는 해안 동굴이 그것이다. 자연동굴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각형’ 형태의 이 동굴들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일본군이 조선인 민간인들을 대거 동원해 군사용 동굴을 뚫게 한 흔적이다.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그들의 노동력으로 조선 땅에 구멍을 내고 속을 파낸 흔적은 지금도 흉터처럼 섬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다.
고하도에 남은 일본군의 흔적들은,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막아낸 역사를 품은 섬을 되레 일본군이 차지하고 자신들의 전선(戰線)으로 삼았다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은 목포를 광주·전남 서부 지역의 대외 진출지이자 전남 지역 물자를 일본이나 제주도로 옮길 수 있는 전략적인 항구로 여겼다.
당초 일본은 아·태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 즈음인 1944년까지도 목포에 별다른 군사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1945년께 전황이 불리해지자 미국이 제주도를 거쳐 일본 본토까지 침투할 것으로 보고 그 길목인 목포를 최전선으로 삼아 요새화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고하도는 목포항과 불과 1.2㎞ 떨어져 있을 만큼 가까웠던 터라 일본군은 고하도를 곧장 군사 기지로 개조하고 나섰다. 조선인 민간인들을 강제동원해 고하도 해안 곳곳에 1945년 8월 패전 직전까지 군사용 동굴을 파게 한 것이다.
고하도에서 확인된 일본군이 남긴 동굴은 총 17개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 동굴진지 2곳을 제외한 대부분인 15개 동굴은 해안가를 따라 조성된 주정(舟艇·소형 배)기지다. 주정기지 중 현재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11개다.
주정기지는 폭 3.5~5m, 높이 3m, 길이는 6.8~18m 수준으로 사각형, 원형 등 모양으로 뚫려 있다.
대부분 미완성 상태에서 중단돼 공정률은 60~70% 안팎으로 추정되며, 동굴 내에는 해안의 단단한 암반을 뚫기 위해 정(丁)으로 깎아내거나 폭약을 사용해 파낸 흔적이 남아 있다. 동굴 벽을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섬 북서쪽의 ‘용머리’에는 7개의 동굴이 몰려있다.이 동굴들은 먼 바다에서 목포항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용머리 외 동굴은 섬 북동쪽에 있으며 외해(外海)가 아닌 목포항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주정기지는 동굴 바닥을 바다 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만들고 해안까지 평탄화 작업을 해 배를 내기 좋게 했으며, 해안가에 바짝 붙여 만들어 밀물이 들면 동굴 내부로 물이 차오르게 설계돼 있다.
고하도 주정기지는 군수 물자를 옮기기 위한 ‘발동정’(發動艇·상륙용 배)을 은닉하기 위한 동굴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단거리 연안을 오가며 물자 수송을 하기 위한 길이 10m 안팎의 소발동정(쇼하츠), 15m 안팎의 대발동정(다이하츠) 등을 숨겨 놓았다는 것이다.
일본군이 1944년 10월에 세운 ‘조선군 축성계획’이 근거다.
이 계획에는 목포 일대에 선박항행 또는 박지(泊地)를 엄호하는 임시 포대를 구축하고, 그 포대를 엄호하는 동시에 상륙 방어를 위한 보병 2개 대대분을 축성하며 소형 주정에 의한 연안항로대(沿岸航路帶)를 설정하기 위해 목포 등지에 주정 기지 공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일본군은 고하도를 목포·여수에 모인 군수물자를 미군의 감시·방해를 피해 제주도까지 옮기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 삼았다는 것이 된다.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적선을 공격하기 위한 자살특공정을 숨겨두기 위해 주정기지를 만들었다는 연구도 있다.
고하도에는 주정기지 외에도 일본군의 흔적이 남아있다.
고하도 북동쪽의 ‘윗마을’ 인근 도로 한 켠에는 길이 40m에 너비 6m, 높이 3.5m의 길쭉한 건물이 있다. 이순신 장군이 수군 통제영을 차렸던 유적지로부터가 불과 180m 떨어진 곳이다.
이 건물은 과거 일본군이 주둔했던 막사로 추정되고 있다. 이 건물은 광복 후 섬 사람들의 교회 내지 기도원으로 활용되다가 현재는 버려진 상태다.
현재 내부에는 교회에 있을 법한 교단과 나무 십자가 등이 널브러져 있으며 오랜 기간 방치돼 천장재가 떨어지고 바닥 목재가 꺼진데다 수십년 세월의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다.
막사 건물 뒤편에도 일본군이 만들어놓은 15m 길이의 동굴이 있다. 입구는 3.6m, 높이는 1.8m로 비교적 작은 동굴로, 공습 대피용 또는 물자 보관용으로 뚫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동굴은 바닥 마감이 돼 있지 않고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돼 있지 않은 점,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 폭격 등을 당하면 봉쇄될 위험이 큰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미완성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 인근에는 또 너비 3.3m, 높이 2.3m, 길이 70m 수준의 동굴이 하나 더 있는데, 역시 방공호 또는 물자보관소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건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목포 고하도는 1945년도 일본이 미군의 공격을 막는 ‘본토 결전’을 준비하면서 일본 땅이 아닌 한반도를 전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침략전쟁의 직접적인 증거물이다”며 “목포뿐 아니라 제주도와 여수, 남해 등 남해안 전역에 동굴을 뚫겠다며 조선 사람들을 강제 동원한 아픔이 그대로 서려 있는 현장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고하도 북동쪽에 있는 일부 주정기지는 해상데크로 연결돼 관광자원화 됐으나, 나머지 동굴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하도와 접해 있는 허사도 또한 20여개 주정기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나, 목포 신항만이 조성되고 목포대교가 개통되는 사이 상당수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
/목포=글·사진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