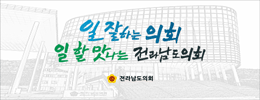기술문명이 초래한 변화, ‘미디어아트’로 조명하다
임용현 ‘새로운 연대’
양숙현 ‘사변적 물질들’
G.MAP, 6월 15일까지 초대전
양숙현 ‘사변적 물질들’
G.MAP, 6월 15일까지 초대전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은 미디어아티스트 임용현, 양숙현 초대전을 13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연다. 임용현 작가의 ‘Post Genesis’(제3~4전시실)를 주제로 한 전시. |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늘의 현대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실재와 사이버세계의 경계를 무화시키고 있다.
기술문명이 초래한 변화, 인간과 사물의 관계 등을 미디어아트로 조명하는 이색적인 전시가 열린다. 특히 이번 전시 는 광주 출신 역량 있는 두 작가가 현대 미디어 환경과 경계를 다채롭게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센터장 이경호)은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임용현, 양숙현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창작 지원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같은 듯 다른 두 작가의 작품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편리 이면에 드리워진 감시와 왜곡
먼저 임용현 작가는 ‘Post Genesis: 새로운 연대’(제3~4전시실)를 주제로 첨단기술의 어두운 면에 초점을 맞췄다.
임 작가의 작품은 특정한 서사를 지니고 있어 흥미롭다. 영상과 맵핑, VR 등 다채로운 미디어 기법과 맞물린 서사는 이해도를 높인다.
대학에서 연극영화를 공부하고 영국에서 순수미술 석사를 취득한 이색적인 경력과 맞물리는 지점이다. 작품에 스펙터클한 영상미와 특유의 서사가 결합돼 있는 것은 그런 연유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기술과 문명의 발전이 초래한 사회적 변화와 이면을 탐색한다.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탐구 주제는 기술문명의 명암. ‘달콤한 트루먼’은 스마트폰, CCTV 등 감시 시스템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미디어가 초래하는 불편한 진실에 포커스를 맞췄다.
다음으로 정보의 거대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구현한 ‘태풍’은 규모나 메시지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작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디지털 사회는 거대한 태풍과도 같다”며 “한시도 손에서 떼어놓지 않고 사용하는 휴대폰을 통해 현대인은 많은 정보를 부문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다에서 일정한 기간 기압과 수증기 등이 만나면 거대한 에너지가 발생하듯, 다양한 디지털 활동은 부지불식간에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기술이 소비문화를 변화시키는 양태를 홀로그램으로 표현한 작품도 있다. ‘Apple Consume’은 사과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반복하는 모습을 통해 기술이 초래한 노동시장의 변화, 소비의 패턴 등을 은유했다.
마지막으로 ‘아나스타시스 생존기’는 재생성을 주제로 한 대작이다. 폐허가 된 지구 도시를 탐험하며 인류를 대신한 ‘프라즈마 소울 나노봇’과 조우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인간의 착취와 무분별한 개발, 환경파괴가 낳은 폐해를 고발하는 한편 생명이 공존하는 새로운 질서를 희원한다는 내용이다.
◇인간 스스로 인지 못하는 물질성에 주목
‘사변적 물질들’을 주제로 한 양숙현 전시는 1전시실에서 진행된다. G.MAP의 뉴미디어아트특화전으로 기획된 전시는 기술과 환경, 데이터, 감각 등의 상호작용을 모티브로 작업해왔던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3D스캐닝을 비롯해 VR모델링, 인공지능 등 기술을 매개로 9개 작품이 출품됐다. ‘사변적 물질들’은 인간 중심주의 사고를 탈피해 개별 사물과 존재들을 탐구하는 철학적 사조인 ‘사변적 실재론’에서 연유한다.
홍대에서 회화를 전공한 양 작가는 동 대학원에서 인터랙션 디자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영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지금까지 알고리즘에서 파생되는 오류와 빅데이터에 반하는 마이너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속에서 드러나는 정보의 다양한 지점을 매체로 구현해왔다.
양 작가는 “미디어아트, 미디어테크로 대변되는 AI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기술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고민해왔다”며 “일반적인 디지털 기술이라는 관념을 넘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표작은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끌 만큼 이색적이다. ‘OOX 2.0_지구물질인간존재도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은 서양 기술과 동양철학을 접목한 작품이다. 방문객이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에서 생성한 시와 영상을 보여준다. 입력자마다 다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기술이 인간을 물질적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는 ‘도발적인’ 가능성을 암시한다.
홍희진 큐레이터는 “우리 모두는 기계화된 세상에서 존재한다. 이번 전시는 데이터가 어떻게 신체를 획득하는지 사유할 수 있게 한다”며 “데이터와 생명, 비인간존재와 사물 등에 대해 경계를 넘어 확장해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기술문명이 초래한 변화, 인간과 사물의 관계 등을 미디어아트로 조명하는 이색적인 전시가 열린다. 특히 이번 전시 는 광주 출신 역량 있는 두 작가가 현대 미디어 환경과 경계를 다채롭게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전시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창작 지원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같은 듯 다른 두 작가의 작품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편리 이면에 드리워진 감시와 왜곡
먼저 임용현 작가는 ‘Post Genesis: 새로운 연대’(제3~4전시실)를 주제로 첨단기술의 어두운 면에 초점을 맞췄다.
임 작가의 작품은 특정한 서사를 지니고 있어 흥미롭다. 영상과 맵핑, VR 등 다채로운 미디어 기법과 맞물린 서사는 이해도를 높인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기술과 문명의 발전이 초래한 사회적 변화와 이면을 탐색한다.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탐구 주제는 기술문명의 명암. ‘달콤한 트루먼’은 스마트폰, CCTV 등 감시 시스템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미디어가 초래하는 불편한 진실에 포커스를 맞췄다.
다음으로 정보의 거대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구현한 ‘태풍’은 규모나 메시지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작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디지털 사회는 거대한 태풍과도 같다”며 “한시도 손에서 떼어놓지 않고 사용하는 휴대폰을 통해 현대인은 많은 정보를 부문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다에서 일정한 기간 기압과 수증기 등이 만나면 거대한 에너지가 발생하듯, 다양한 디지털 활동은 부지불식간에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기술이 소비문화를 변화시키는 양태를 홀로그램으로 표현한 작품도 있다. ‘Apple Consume’은 사과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반복하는 모습을 통해 기술이 초래한 노동시장의 변화, 소비의 패턴 등을 은유했다.
마지막으로 ‘아나스타시스 생존기’는 재생성을 주제로 한 대작이다. 폐허가 된 지구 도시를 탐험하며 인류를 대신한 ‘프라즈마 소울 나노봇’과 조우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인간의 착취와 무분별한 개발, 환경파괴가 낳은 폐해를 고발하는 한편 생명이 공존하는 새로운 질서를 희원한다는 내용이다.
 양숙현 작가의 ‘사변적 물질들’ (제1전시실)을 주제로 한 전시. |
‘사변적 물질들’을 주제로 한 양숙현 전시는 1전시실에서 진행된다. G.MAP의 뉴미디어아트특화전으로 기획된 전시는 기술과 환경, 데이터, 감각 등의 상호작용을 모티브로 작업해왔던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3D스캐닝을 비롯해 VR모델링, 인공지능 등 기술을 매개로 9개 작품이 출품됐다. ‘사변적 물질들’은 인간 중심주의 사고를 탈피해 개별 사물과 존재들을 탐구하는 철학적 사조인 ‘사변적 실재론’에서 연유한다.
홍대에서 회화를 전공한 양 작가는 동 대학원에서 인터랙션 디자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영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지금까지 알고리즘에서 파생되는 오류와 빅데이터에 반하는 마이너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속에서 드러나는 정보의 다양한 지점을 매체로 구현해왔다.
양 작가는 “미디어아트, 미디어테크로 대변되는 AI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기술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고민해왔다”며 “일반적인 디지털 기술이라는 관념을 넘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표작은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끌 만큼 이색적이다. ‘OOX 2.0_지구물질인간존재도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은 서양 기술과 동양철학을 접목한 작품이다. 방문객이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에서 생성한 시와 영상을 보여준다. 입력자마다 다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기술이 인간을 물질적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는 ‘도발적인’ 가능성을 암시한다.
홍희진 큐레이터는 “우리 모두는 기계화된 세상에서 존재한다. 이번 전시는 데이터가 어떻게 신체를 획득하는지 사유할 수 있게 한다”며 “데이터와 생명, 비인간존재와 사물 등에 대해 경계를 넘어 확장해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