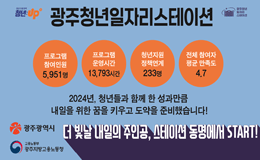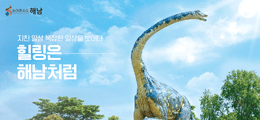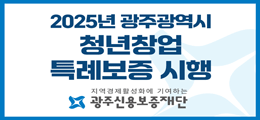뒤틀린 ‘남성 갑질’ 여전…편견·멸시에 우는 여성노동자
세계 여성의 날…광주 산업현장 여성노동자들 하소연 들어보니
친절·웃음 강요당하고 인격 모독
기술직 “가르쳐주면 아나” 조롱
식당 노동자 행패·폭언 시달려
아주머니·아가씨 호칭에 반말도
동료 의식·성인지 감수성 낮아
친절·웃음 강요당하고 인격 모독
기술직 “가르쳐주면 아나” 조롱
식당 노동자 행패·폭언 시달려
아주머니·아가씨 호칭에 반말도
동료 의식·성인지 감수성 낮아
 /클립아트코리아 |
광주·전남지역 여성 노동자들이 고질적인 편견과 차별·멸시를 받으며 생계를 위해 일터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일터에는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사고와 고정관념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광주·전남 지역 취업자(광주 77만 6000명, 전남 97만명) 중 여성 비율은 43.6%(광주 34만 1000명, 전남 42만 1000명)에 달한다.
여성 노동자가 절반에 달하지만 차별은 여전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광주지역 7개업종 남녀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광주지역 기업 성별격차 실태 모니터링’ 결과 채용단계부터 남녀 차별이 있다는 응답이 78.3%에 달했고, 동일직급, 동일업무에서 성별 임금 차이가 있다는 응답도 77.7%나 됐다.
일터의 현실은 여성에게 더 가혹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하루 앞둔 7일 만난 광주·전남 지역 여성 노동자 3명은 “여전히 일터에서 여성은 남성이 가르쳐야 하는 존재이고, 편견과 차별에 갇혀있다”고 입을 모았다.
남성 비율이 90%가 넘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15년 째 식당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정미선(여·50)씨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멸시를 경험했다.
육아를 위해 직장을 접고 전업주부로 돌아섰던 정씨는 아이들이 자라자 다시 일하기 위해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작업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공장식당에 온 직원에게 식권을 달라고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내가 여기 다닌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날 못알아보냐”며 정씨에게 대뜸 반말로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다.
정씨에게 ‘밥이 맛없다’고 쏘아붙이고 ‘왜 틱틱거리냐’며 친절을 강요하는 남성 직원들도 있었다. 식판까지 팽개치며 행패를 부리는 직원도 있어 그때마다 모멸감과 회의감이 들었지만 생계를 위해 참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정씨의 설명이다.
정씨는 “그나마 직원들이 우리를 ‘아줌마’라고 부르면 다행일만큼 언제나 반말과 멸시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며 “나도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인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다. 남자였다면 이런 취급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여성으로서’ 친절과 웃음을 강요당했던 정씨는 “남아선호사상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다보니 여성에 대한 은연 중의 차별은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성 비율이 높은 현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반도체 패키징 회사인 앰코에 다니는 이수옥(여·49)씨는 “여성 직원이 대부분이지만 현장의 주체는 역설적으로 여성이 아닌 남성이다”고 했다. 여성 직원이 기계를 만지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만져서 자재에 영향을 끼친다는 편견이 일반화돼 있고, 남성 직원의 실수로 자재에 불량이 생기면 이 마저도 여성 직원의 작동 실수아닌가 의심을 받는다.
여성 직원에게 지도할 때도 “가르쳐주면 아느냐?”며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자신의 휴게시간을 늘리기 위해 여성 노동자의 휴게시간을 줄이려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씨는 “한 남성 직원은 여자 직원에게 고백했다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 이후에는 피해자인척 노동조합에 찾아와 되레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직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담긴 말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최혜진(여·30) 사회복지사는 “‘여자니까 ~해야 한다’거나 ‘술자리에서는 여자가 술을 따라줘야 맛있다’는 등 남성직원들이 인격 모독,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서스름없이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해주는 일을 하는 최씨는 “어린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뜸 ‘아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외부 회의에 참여했을 때도 직급과 상관없이 여자라는 이유로 의견이 무시당하고, 말을 걸지 않기도 한다”고 했다.
최씨는 “여성이 당연히 못할거라고 생각하는 편견과 여자는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편견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소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2022년 지역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분야 ‘성별 임금격차’ 성평등지수는 광주가 전국 11위로 특·광역시 중 대구와 울산 다음으로 낮고, 전남이 17위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지역 일터에는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사고와 고정관념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광주·전남 지역 취업자(광주 77만 6000명, 전남 97만명) 중 여성 비율은 43.6%(광주 34만 1000명, 전남 42만 1000명)에 달한다.
일터의 현실은 여성에게 더 가혹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하루 앞둔 7일 만난 광주·전남 지역 여성 노동자 3명은 “여전히 일터에서 여성은 남성이 가르쳐야 하는 존재이고, 편견과 차별에 갇혀있다”고 입을 모았다.
육아를 위해 직장을 접고 전업주부로 돌아섰던 정씨는 아이들이 자라자 다시 일하기 위해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작업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공장식당에 온 직원에게 식권을 달라고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내가 여기 다닌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날 못알아보냐”며 정씨에게 대뜸 반말로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다.
정씨에게 ‘밥이 맛없다’고 쏘아붙이고 ‘왜 틱틱거리냐’며 친절을 강요하는 남성 직원들도 있었다. 식판까지 팽개치며 행패를 부리는 직원도 있어 그때마다 모멸감과 회의감이 들었지만 생계를 위해 참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정씨의 설명이다.
정씨는 “그나마 직원들이 우리를 ‘아줌마’라고 부르면 다행일만큼 언제나 반말과 멸시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며 “나도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인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다. 남자였다면 이런 취급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여성으로서’ 친절과 웃음을 강요당했던 정씨는 “남아선호사상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다보니 여성에 대한 은연 중의 차별은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성 비율이 높은 현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반도체 패키징 회사인 앰코에 다니는 이수옥(여·49)씨는 “여성 직원이 대부분이지만 현장의 주체는 역설적으로 여성이 아닌 남성이다”고 했다. 여성 직원이 기계를 만지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만져서 자재에 영향을 끼친다는 편견이 일반화돼 있고, 남성 직원의 실수로 자재에 불량이 생기면 이 마저도 여성 직원의 작동 실수아닌가 의심을 받는다.
여성 직원에게 지도할 때도 “가르쳐주면 아느냐?”며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자신의 휴게시간을 늘리기 위해 여성 노동자의 휴게시간을 줄이려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씨는 “한 남성 직원은 여자 직원에게 고백했다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 이후에는 피해자인척 노동조합에 찾아와 되레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직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담긴 말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최혜진(여·30) 사회복지사는 “‘여자니까 ~해야 한다’거나 ‘술자리에서는 여자가 술을 따라줘야 맛있다’는 등 남성직원들이 인격 모독,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서스름없이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해주는 일을 하는 최씨는 “어린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뜸 ‘아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외부 회의에 참여했을 때도 직급과 상관없이 여자라는 이유로 의견이 무시당하고, 말을 걸지 않기도 한다”고 했다.
최씨는 “여성이 당연히 못할거라고 생각하는 편견과 여자는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편견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소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2022년 지역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분야 ‘성별 임금격차’ 성평등지수는 광주가 전국 11위로 특·광역시 중 대구와 울산 다음으로 낮고, 전남이 17위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