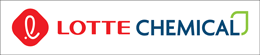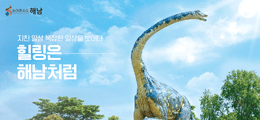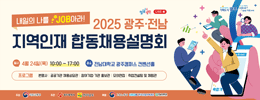휴지 한 장도 아끼는 마음 -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
얼마 전 서울에 갔다가 오랜 전통 음악과 후진 양성에 힘쓰는 교도님을 찾아뵙게 되었다. 마침 밖에 나오셨다가 반가이 맞아 주셨다. 집에 들어서다가 바람에 밀려다니는 포장지 조각을 보시더니 주워 들고 들어오셨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가위를 찾아 주워온 포장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상자에 담으시면서 “이런 걸 이렇게 쓰면 될 텐데 함부로 버리니 참 못마땅하다”는 말씀이었다.
그러고 보니 장롱이며 책장 위의 공간마다 헌 봉투며 크고 작은 상자들 그리고 깨끗이 씻어 놓은 우유 팩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옛날엔 헌 봉투 등을 모아 길가에 장사하는 분에게 주면 좋아했는데 비닐봉투가 나오고 각자 가방들을 가지고 다니고부터는 그것도 시들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즈음 버리자니 아깝고 쌓아 두자니 짐이 된다며 걱정을 토로했다.
매사가 이러하다보니 다른 생활에서도 모두 아끼고 모으는 생활이다. 혈혈단신인 처지에서 매사를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지나치거니 인색하거니 하는 핀잔이나 뒷소리가 없지도 않은 모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생활 속에서 모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바로 그 뜻을 이해하고 머리를 숙이게 된다. 스스로에게는 그토록 검박하면서도 후진 국악인과 전통 음악인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전국 연합회를 꾸려가고 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중에도 전통의 맥을 이을 학교를 건립하겠다는 염원을 알차게 키워가고 있다. 교도님의 이러한 생활 신조는 ‘원불교’를 만나면서 더욱 확고한 뿌리를 내리게 된다. 교전을 봉독할 때마다 어찌 그리 적실한 가르침일까 하고 무릎을 치며 좋아도 하고 매우 기뻐 수없이 눈물도 흘린다고 한다.
요즈음 음식점을 가보거나 대중 목욕탕을 가보거나 관광지를 가보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아까운 줄 모르고 버리고 낭비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고 있다. 밥 한 톨, 물 한 방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떤 수고로 여기까지 오는지, 그것을 어떻게 먹고 쓰고 생활하는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식탁 위에 흘린 밥알을 가리키며 농부의 땀을 이야기하던 교훈이 이제는 공허한 소리가 되고 말았다. 소비 욕구를 충동하는 갖가지 광고들을 보노라면 삶이란 바로 소비라는 생각이 든다.
잘 산다는 것은 비싼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열심히 땀 흘려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소비는 생산을 촉진시켜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점점 자원이 고갈되고 폐기물은 누적되며 환경은 오염되고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먹이사슬처럼 순환하며 상보적 균형을 유지해 왔지만 현대의 소비는 소비가 바로 소모요, 고갈이요, 공해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날로 늘어나는 소비 욕구에 발맞추다보면 머지않아 지구는 황폐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지구 온난화나 변화로 느끼고 있다.
대종사님께서 생활하실 때는 헌 종이, 몽당연필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으셨다 한다. 너무 오래전 얘기라 말이 맞지 않는 얘기일까? 아니면 그 당시는 물자가 귀한 때라서 그랬을까? 그것만은 아니다. 흘러가는 냇물도 함부로 쓰는 것을 나무라셨던 대종사님의 뜻을 헤아려보면 물자의 흔하고 귀함의 문제가 아니라 물건 자체를 소중하게 알고 아껴 쓰고 살려 쓰는 생활을 보여주심이며 보은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근검한 생활은 다만 가난을 극복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지혜다. 근검은 스스로의 처지에 긍지와 편안함을 갖게 하고 나눔을 실천할 여유가 되며 자원과 환경을 보존하는 요건이 된다.
“이 세상에는 모든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자원은 없다”고 한 간디의 말은 이 시대에 길이 음미할 교훈이 아닐 수 없다.
매사가 이러하다보니 다른 생활에서도 모두 아끼고 모으는 생활이다. 혈혈단신인 처지에서 매사를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지나치거니 인색하거니 하는 핀잔이나 뒷소리가 없지도 않은 모양이다.
요즈음 음식점을 가보거나 대중 목욕탕을 가보거나 관광지를 가보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아까운 줄 모르고 버리고 낭비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고 있다. 밥 한 톨, 물 한 방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떤 수고로 여기까지 오는지, 그것을 어떻게 먹고 쓰고 생활하는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식탁 위에 흘린 밥알을 가리키며 농부의 땀을 이야기하던 교훈이 이제는 공허한 소리가 되고 말았다. 소비 욕구를 충동하는 갖가지 광고들을 보노라면 삶이란 바로 소비라는 생각이 든다.
잘 산다는 것은 비싼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열심히 땀 흘려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소비는 생산을 촉진시켜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점점 자원이 고갈되고 폐기물은 누적되며 환경은 오염되고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먹이사슬처럼 순환하며 상보적 균형을 유지해 왔지만 현대의 소비는 소비가 바로 소모요, 고갈이요, 공해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날로 늘어나는 소비 욕구에 발맞추다보면 머지않아 지구는 황폐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지구 온난화나 변화로 느끼고 있다.
대종사님께서 생활하실 때는 헌 종이, 몽당연필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으셨다 한다. 너무 오래전 얘기라 말이 맞지 않는 얘기일까? 아니면 그 당시는 물자가 귀한 때라서 그랬을까? 그것만은 아니다. 흘러가는 냇물도 함부로 쓰는 것을 나무라셨던 대종사님의 뜻을 헤아려보면 물자의 흔하고 귀함의 문제가 아니라 물건 자체를 소중하게 알고 아껴 쓰고 살려 쓰는 생활을 보여주심이며 보은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근검한 생활은 다만 가난을 극복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지혜다. 근검은 스스로의 처지에 긍지와 편안함을 갖게 하고 나눔을 실천할 여유가 되며 자원과 환경을 보존하는 요건이 된다.
“이 세상에는 모든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자원은 없다”고 한 간디의 말은 이 시대에 길이 음미할 교훈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