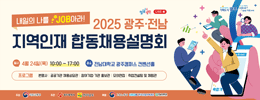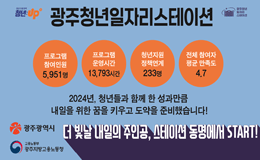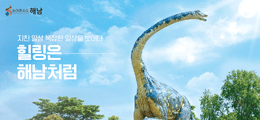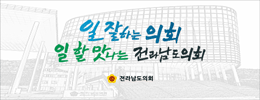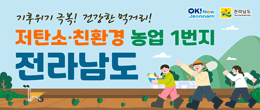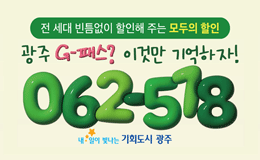지금 행복하십니까? - 중현 광주 증심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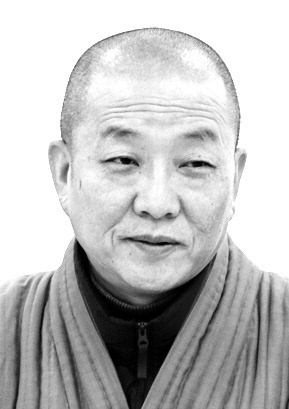 |
새벽부터 매미 소리가 유난스럽더니, 해가 뜨자 온 세상천지가 매미 소리로 가득하다. 태풍이 지나가자 생긴 변화이다. 태풍이 오기 전, 찌는 듯한 폭염의 한가운데에서도 매미소리의 기억은 없었다. 물론 폭염이 찾아오기 전,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들이부었던 길고도 긴 장마동안 매미소리는 당연히 없었다. 저들은 유충으로서 살았던 삶 전부를 담아 전심전력으로 울고 있다. 울음 소리에 자신들의 삶 전부를 담아내고 있다. 오늘 아침 티없이 맑고 따가운 햇살 아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매미들은 행복에 겨워하고 있다.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어놓고 매미들의 합창소리를 듣고 있는 나 역시 저들처럼 행복하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긴 장마가 끝나던 날이었다. 나는 장동 로타리에서 신호대기에 걸려 있던 참이었다. 그 때 거짓말처럼 갑자기 하늘이 개면서 파란 하늘이 눈 앞에 펼쳐졌다. 마침 라디오에서 음악방송의 디제이 멘트가 흘러나왔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세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했지요. 첫째, 하는 일이 있는가.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셋째, 희망하는 바가 있는가.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갑자기 등장한 새파란 하늘을 바라보던 나의 감정은 말하자면, 경외 혹은 감탄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행복에 관한 멘트를 듣자마자 그 감정은 곧바로 행복으로 급선회했다. 그러다가 곧이어 의문이 들었다. ‘정말 칸트가 저런 말을 했나. 칸트답지 않은데’. 금세 신호는 바뀌었고 잠시나마 행복했던 나도, 왠지 어설픈 처세술 강사같은 칸트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다시 세상은 분주하게 돌아갔다.
행복에 대해서라면 칸트보다, 평생을 행복에 대해 연구했다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셀리그만의 견해에 더 믿음이 간다. 그 역시 행복에 대해 세가지를 말했다. 첫번째, 즐거운 삶. 두번째, 자신의 일에 몰입하는 적극적인 삶. 세번째, 의미 있는 삶.
그런데 왜 나는 행복에 대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몇년전 죽은 도반이 생각나는 것일까? 아마도 지금 그 스님이 선물한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그런 모양이다. 혼자 멍하니 생각한다. ‘그 스님은 지금 행복할까’. 그 스님은 누구보다 수행에 열심이었다. 그러나 너무나 열심이었던 나머지, 그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증세가 심해진 뒤로는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몇차례 반복하다가 결국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이 티셔츠는 그 스님이 자신을 돌봐주던 도반들에게 고맙다며 선물한 것이다.
혹자는 말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다”라고. 행복도 살아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니 죽은 자에게서 행복을 찾는 것은 마치 물 속의 물고기에게 마실 물을 주려는 것과 같다. 애당초 삶에 이유나 목적 같은 것은 없다. 그 누구도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면서 생기는 목표는 기왕 사는 인생 더 잘 살아보려는 욕망의 발현일 뿐이다.
행복은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일종의 생존수단이다. 그렇다고 단순한 쾌락이나 충동같은 부류는 더더욱 아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행복이란 매우 복합적인 감정’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은 마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는 마음이다. 그러니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역시 마음 속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마음이란 원래 흔들리고, 동요하고, 지키기 어렵고, 보호하기 어렵고,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다. 화살을 만들려고 할 때 나무가 삐뚤빼뚤 굽어 있으면 쓸 수 없다.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눈 앞의 즐거움만 쫓는 욕망에서 벗어나려 하면, 가장 먼저 마음이 거칠게 반항하며 브레이크를 건다.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마음은 ‘나 하던 대로 할래’ 하면서 거칠게 몸부림친다. 그러니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곧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요란한 매미소리에 다시 생각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런데 매미들은 정말 행복할까. 매우 복합적인 감정이라는 행복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매미 정도의 신경구조로 행복을 경험하기는 어림없을 듯하다. 그래도 8월의 아침이 이리도 찬란하게 빛나니 매미들도 필시 행복할 것이다. 그것도 아주 많이.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세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했지요. 첫째, 하는 일이 있는가.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셋째, 희망하는 바가 있는가.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행복에 대해서라면 칸트보다, 평생을 행복에 대해 연구했다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셀리그만의 견해에 더 믿음이 간다. 그 역시 행복에 대해 세가지를 말했다. 첫번째, 즐거운 삶. 두번째, 자신의 일에 몰입하는 적극적인 삶. 세번째, 의미 있는 삶.
그런데 왜 나는 행복에 대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몇년전 죽은 도반이 생각나는 것일까? 아마도 지금 그 스님이 선물한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그런 모양이다. 혼자 멍하니 생각한다. ‘그 스님은 지금 행복할까’. 그 스님은 누구보다 수행에 열심이었다. 그러나 너무나 열심이었던 나머지, 그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증세가 심해진 뒤로는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몇차례 반복하다가 결국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이 티셔츠는 그 스님이 자신을 돌봐주던 도반들에게 고맙다며 선물한 것이다.
혹자는 말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다”라고. 행복도 살아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니 죽은 자에게서 행복을 찾는 것은 마치 물 속의 물고기에게 마실 물을 주려는 것과 같다. 애당초 삶에 이유나 목적 같은 것은 없다. 그 누구도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면서 생기는 목표는 기왕 사는 인생 더 잘 살아보려는 욕망의 발현일 뿐이다.
행복은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일종의 생존수단이다. 그렇다고 단순한 쾌락이나 충동같은 부류는 더더욱 아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행복이란 매우 복합적인 감정’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은 마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는 마음이다. 그러니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역시 마음 속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마음이란 원래 흔들리고, 동요하고, 지키기 어렵고, 보호하기 어렵고,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다. 화살을 만들려고 할 때 나무가 삐뚤빼뚤 굽어 있으면 쓸 수 없다.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눈 앞의 즐거움만 쫓는 욕망에서 벗어나려 하면, 가장 먼저 마음이 거칠게 반항하며 브레이크를 건다.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마음은 ‘나 하던 대로 할래’ 하면서 거칠게 몸부림친다. 그러니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곧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요란한 매미소리에 다시 생각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런데 매미들은 정말 행복할까. 매우 복합적인 감정이라는 행복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매미 정도의 신경구조로 행복을 경험하기는 어림없을 듯하다. 그래도 8월의 아침이 이리도 찬란하게 빛나니 매미들도 필시 행복할 것이다. 그것도 아주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