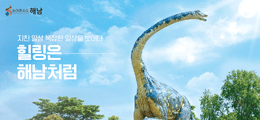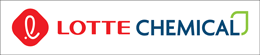당신은 여전히 통일이 소원인가- 지병근 조선대 교수
 |
서구의 역사에서 ‘민족 국가’는 전쟁을 통해 분리되어 있던 봉건 영토를 통합하는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막대한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야 했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행정 능력을 키워갔다. 시민들이 민족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민족이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라는 베네딕트 엔더슨의 말처럼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외세에 의해 분단되었고 ‘재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세월에는 장사가 없는 것처럼 과연 1953년 휴전 이후 장기간 분단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민들에게 통일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여전히 통일을 소원이라고 여기고 있을까? 최근에 발간된 통일연구원(KINU)의 통일 의식 조사(전국 1000명, 2022.4.6~5.2, 대면 면접 조사, 조사 기관 한국리서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시민들이 통일을 내재적 가치(instrinsic value), 즉 ‘그 자체로’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약해지고 있다.
통일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 가운데 22.7%만이 매우 혹은 조금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한국인 네 명 가운데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이 주장에 대하여 전혀 혹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이 50.7%에 달하였다. “경제 문제가 통일 문제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응답자는 8.7%에 불과하였다.
다만 통일의 외재적 가치(extrinsic value), 즉 수단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통일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거나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 해소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은 각각 65.0%와 72.4%였다.
이와 같은 통일 인식은 통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평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도 통일이 실현 가능한 과제라고 인식하는 이들은 21.4%이며, 통일이 20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 또한 19.2%에 불과하였다. 통일의 수혜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 조사에서 통일이 국가 전체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63.8%였던 반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불과 24.7%였다.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이는 무려 83.7%였다. 이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통일의 수혜자가 자신이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이나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통일의 외재적 가치에 편중된 인식은 민족주의를 동원하거나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감정적 호소보다 경제 발전이나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 통일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 교육의 초점을 전환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시민들 자신이 통일의 수혜자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시민들이 통일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문의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6조에는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초유의 군사 훈련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는 행위가 반헌법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통일의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였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다만 통일의 외재적 가치(extrinsic value), 즉 수단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통일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거나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 해소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은 각각 65.0%와 72.4%였다.
이와 같은 통일 인식은 통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평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도 통일이 실현 가능한 과제라고 인식하는 이들은 21.4%이며, 통일이 20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 또한 19.2%에 불과하였다. 통일의 수혜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 조사에서 통일이 국가 전체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63.8%였던 반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불과 24.7%였다.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이는 무려 83.7%였다. 이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통일의 수혜자가 자신이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이나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통일의 외재적 가치에 편중된 인식은 민족주의를 동원하거나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감정적 호소보다 경제 발전이나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 통일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 교육의 초점을 전환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시민들 자신이 통일의 수혜자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시민들이 통일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문의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6조에는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초유의 군사 훈련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는 행위가 반헌법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통일의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였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