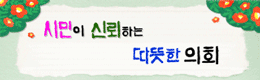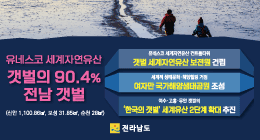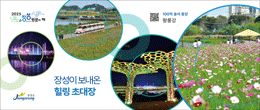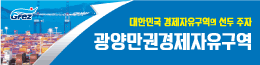정부, 5·18 소송 소멸시효 ‘이중 잣대’…강제동원 소송 참고했나
윤상원 열사 유족 등 ‘정신적 손배’ 소멸시효 기산점 항소…유공자·유족 달리 적용
“보상금 지급받은 날부터 계산 시효 끝나”…법조계 “헌재 결정 나온 2021년부터”
“보상금 지급받은 날부터 계산 시효 끝나”…법조계 “헌재 결정 나온 2021년부터”
 /클립아트코리아 |
5·18 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5·18 유공자와 일부 유가족에게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정부가 5·18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옛 전남도청을 지키다 계엄군 총탄에 맞아 숨진 윤상원 열사(1950~1980)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 고인과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고 가족들은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에 윤 열사의 가족들이 청구한 금액의 36.8%∼39%를 인정해 어머니에게 3억2000만원, 다른 가족에게 233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항소 이유로 그동안의 것과 다른 소멸시효를 들었다.
최근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5·18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잇따르면서 정부도 항소를 이어왔다.
그동안 정부는 5·18 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가리지 않고 항소하면서 손해배상금을 이유로 들었다. 손해배상금이 과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윤상원 열사 유족을 비롯해 일부 유가족들의 1심 결과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부터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문제는 5·18 피해 당사자인 유공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의 이유로 들지 않고 부모·배우자·형제 자매들에게만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권이 소멸했다고 봤다는 점이다.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계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기산점을 과거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2021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시점에서야 유가족들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안 날’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까지와 달리 소멸시효 기산점을 항소의 이유로 갑자기 꺼내 든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참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판결에서 피해자들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기업 쪽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일본기업 쪽의 손을 들어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하지만 정부가 5·18 유공자와 일부 유가족에게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 고인과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고 가족들은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에 윤 열사의 가족들이 청구한 금액의 36.8%∼39%를 인정해 어머니에게 3억2000만원, 다른 가족에게 233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최근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5·18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잇따르면서 정부도 항소를 이어왔다.
그동안 정부는 5·18 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가리지 않고 항소하면서 손해배상금을 이유로 들었다. 손해배상금이 과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윤상원 열사 유족을 비롯해 일부 유가족들의 1심 결과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부터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문제는 5·18 피해 당사자인 유공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의 이유로 들지 않고 부모·배우자·형제 자매들에게만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권이 소멸했다고 봤다는 점이다.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계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기산점을 과거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2021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시점에서야 유가족들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안 날’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까지와 달리 소멸시효 기산점을 항소의 이유로 갑자기 꺼내 든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참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판결에서 피해자들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기업 쪽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일본기업 쪽의 손을 들어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