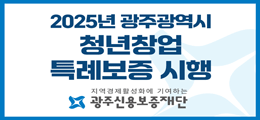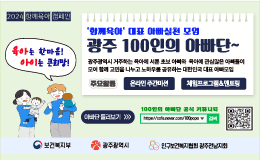자치경찰제 2년…시민 절반 “제도 모르고 변화 못 느껴”
조선대에서 학술대회…교통안전 원스톱 센터 신설 등 논의
45.2% ‘자치경찰 신뢰’…주민 참여 비율 제고 방안 마련을
45.2% ‘자치경찰 신뢰’…주민 참여 비율 제고 방안 마련을
 21일 조선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열린 ‘광주 자치경찰의 비전과 발전방안’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자치경찰제가 시행 2년째를 맞았지만 광주시민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자치경찰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명 중 5명이 제도 시행 이후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21일 조선대에서 열린 ‘광주 자치경찰의 비전과 발전방안’ 학술대회에서 공개됐다. 학술대회에서는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송정애 경찰대학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주민 참여 확대, 교통안전 원스톱 센터 신설, 지구대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제자를 맡은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광주시민 1460명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자치경찰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13.4%, 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29.7% 수준이었다. 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5.1%에 그쳤다.
제도 시행 후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시민의 비율도 50%에 달했다.
광주자치경찰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45.2%가 ‘신뢰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6%에 머물렀다.
자치경찰이 해야 할 일로는 ‘범죄 예방 및 생활안전’(44.2%)과 ‘사회적 약자 보호’(33.7%)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약자 보호 대상으로는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이 꼽혔는데 이 중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30.1%), 여성 대상 범죄(23.7%)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활동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25.6%), 가해자 재범 방지 대책 마련(23.9%), 신속한 경찰 수사(24.5%) 등이 중요하다고 꼽혔다.
또 범죄 예방 활동으로는 ‘경찰 순찰 활동을 강화해달라’(20.4%)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방범용 CCTV 설치(19.4%), 도로 조명 시설 확대(14.1%), 자율방범대 등 주민참여형 순찰(13.8%)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한편 명도현 남부대 교수는 자치경찰제에서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자치경찰의 ‘정책자문단 운영’, ‘청년서포터즈112’로는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으며, 단순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관리와 운영의 권한까지 주민에게 이양되는 수준의 참여를 제안했다.
‘광주형 자치경찰의 미래전략’ 발제를 맡은 장일식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부원장은 ‘교통안전 원스톱 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경찰서 민원실, 구청, 관할 지구대 등 교통민원을 원스톱으로 지정해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센터를 세우자는 제안이다.
지역 경찰 운용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세종 조선대 교수는 지구대 운영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광주형 자치경찰 모델을 위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지역 경찰간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명문화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선우 광주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국가사무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에서 경찰조직의 인사, 예산 권한을 갖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이같은 결과는 21일 조선대에서 열린 ‘광주 자치경찰의 비전과 발전방안’ 학술대회에서 공개됐다. 학술대회에서는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송정애 경찰대학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주민 참여 확대, 교통안전 원스톱 센터 신설, 지구대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치경찰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13.4%, 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29.7% 수준이었다. 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5.1%에 그쳤다.
제도 시행 후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시민의 비율도 50%에 달했다.
자치경찰이 해야 할 일로는 ‘범죄 예방 및 생활안전’(44.2%)과 ‘사회적 약자 보호’(33.7%)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약자 보호 대상으로는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이 꼽혔는데 이 중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30.1%), 여성 대상 범죄(23.7%)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활동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25.6%), 가해자 재범 방지 대책 마련(23.9%), 신속한 경찰 수사(24.5%) 등이 중요하다고 꼽혔다.
또 범죄 예방 활동으로는 ‘경찰 순찰 활동을 강화해달라’(20.4%)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방범용 CCTV 설치(19.4%), 도로 조명 시설 확대(14.1%), 자율방범대 등 주민참여형 순찰(13.8%)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한편 명도현 남부대 교수는 자치경찰제에서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자치경찰의 ‘정책자문단 운영’, ‘청년서포터즈112’로는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으며, 단순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관리와 운영의 권한까지 주민에게 이양되는 수준의 참여를 제안했다.
‘광주형 자치경찰의 미래전략’ 발제를 맡은 장일식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부원장은 ‘교통안전 원스톱 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경찰서 민원실, 구청, 관할 지구대 등 교통민원을 원스톱으로 지정해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센터를 세우자는 제안이다.
지역 경찰 운용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세종 조선대 교수는 지구대 운영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광주형 자치경찰 모델을 위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지역 경찰간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명문화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선우 광주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국가사무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에서 경찰조직의 인사, 예산 권한을 갖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