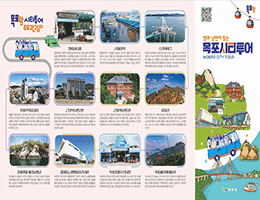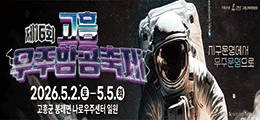[주윤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미얀마의 쿠데타와 한국의 민주주의
 |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시민들에게 실탄을 발사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쿠데타 소식에, 아시아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눈초리가 문득 떠올랐다. 먼저 IMF 직후 인도네시아로 배낭여행을 갔을 때다. 자카르타의 기차역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은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한국의 투쟁가를 불러주며, 한국의 학생 운동은 자신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운동권 학생이 아니었던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낯설게 그리고 부끄럽게 들었다.
중국 남경대에 학술 교류를 갔을 때에는 중국의 젊은 노동사회학자들과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메이리칭니엔’(美麗靑年)이란 영화를 보았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참을 생각해 보니,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란 영화였다. 한 학자는 노동사회학 강의에서 영화 ‘변호인’ 이야기를 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량과 민중의 힘을 부러워했다.
네팔의 현지 안내인 벅터람 씨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생활하다가, 이주노동운동을 하게 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을 배워 간 분이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그는 네팔 귀국 이후 현지의 가장 열악한 노동자와 히말라야의 셰르파들을 위해 노동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학습이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나라이자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선망의 대상이다. 단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룬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여기에 식민지의 핍박과 외세의 침임을 경험했던 많은 아시아인들은 한국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저 먼 서구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무언가 배울 수 있고 따라해 볼 것이 있는 나라로 느낀다. 아시아인들은 단지 한국 기업 제품 혹은 한류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우고 열망하는 시민들이기도 하다.
미얀마에서 쿠데타 소식이 들려온 이후 UN과 여러 나라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UN과 미국은 강력히 규탄하는 반응을 냈지만, 중국은 미얀마의 조속한 안정을 기원한다고만 했다. 양국의 반응에 광주의 5·18 당시 미국의 대응이 떠올랐다.
카터 대통령은 1980년 5월 30일 침묵을 깨고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한국군과 민간 지도자들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완전한 민주정부를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런 한편 우리가 주력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다. … (중략) … 우리는 우방과 친구, 교역,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해 그들을 소련의 영향권에 넘길 수는 없다. 그리고 그들 정권이 우리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복시킬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카터 대통령에게 인권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위해 언제든 잠시 보류할 수 있는 것이었다.
현재 중국에게 미얀마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해상무역로 확장을 꾀하고 일대일로를 통해 남아시아 지역에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에게 미얀마는 중요한 길목이다. 군부는 중국 정부와 협력 관계에 있지만, 신정부 수립 이후 이런 관계는 흔들렸다. 군부의 쿠데타는 신정부 이후 단절된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기에, 중국 정부는 최소한 묵인 혹은 방조하고 있다고 외신은 분석한다.
미얀마 군정을 피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민주화 운동가들은 광주의 민주화운동과 미얀마의 8888민주항쟁이 닮은 꼴이며, 같은 경험을 한 나라로서 한국에 배울 바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한국은 문화 부문에서 미얀마를 돕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에 후발 주자로 참여하고 있었다. 미얀마 신정부는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꾀했다. 영국 식민지를 오래 겪은 미얀마는 식민주의와 군사독재를 이겨 낸 한국식 독자적인 민주주의와 발전의 결합 모델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런데 현재 미얀마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대해 우리 한국 시민사회와 정부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80년대 한국이 흘렸던 민주주의의 피를 지금 다시 흘리고 있는 아시아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5월의 광주에서 미국이 그랬듯이 한국은 정치적 혹은 경제적 고려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에 잠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 민주주의를 선망하고 하나의 가능한 모델로 여겨 왔던 아시아의 이웃들이, 우리의 침묵과 무관심과 무지에 처절한 배신감과 좌절을 느끼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렵다.
네팔의 현지 안내인 벅터람 씨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생활하다가, 이주노동운동을 하게 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을 배워 간 분이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그는 네팔 귀국 이후 현지의 가장 열악한 노동자와 히말라야의 셰르파들을 위해 노동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학습이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 소식이 들려온 이후 UN과 여러 나라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UN과 미국은 강력히 규탄하는 반응을 냈지만, 중국은 미얀마의 조속한 안정을 기원한다고만 했다. 양국의 반응에 광주의 5·18 당시 미국의 대응이 떠올랐다.
카터 대통령은 1980년 5월 30일 침묵을 깨고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한국군과 민간 지도자들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완전한 민주정부를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런 한편 우리가 주력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다. … (중략) … 우리는 우방과 친구, 교역,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해 그들을 소련의 영향권에 넘길 수는 없다. 그리고 그들 정권이 우리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복시킬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카터 대통령에게 인권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위해 언제든 잠시 보류할 수 있는 것이었다.
현재 중국에게 미얀마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해상무역로 확장을 꾀하고 일대일로를 통해 남아시아 지역에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에게 미얀마는 중요한 길목이다. 군부는 중국 정부와 협력 관계에 있지만, 신정부 수립 이후 이런 관계는 흔들렸다. 군부의 쿠데타는 신정부 이후 단절된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기에, 중국 정부는 최소한 묵인 혹은 방조하고 있다고 외신은 분석한다.
미얀마 군정을 피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민주화 운동가들은 광주의 민주화운동과 미얀마의 8888민주항쟁이 닮은 꼴이며, 같은 경험을 한 나라로서 한국에 배울 바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한국은 문화 부문에서 미얀마를 돕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에 후발 주자로 참여하고 있었다. 미얀마 신정부는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꾀했다. 영국 식민지를 오래 겪은 미얀마는 식민주의와 군사독재를 이겨 낸 한국식 독자적인 민주주의와 발전의 결합 모델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런데 현재 미얀마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대해 우리 한국 시민사회와 정부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80년대 한국이 흘렸던 민주주의의 피를 지금 다시 흘리고 있는 아시아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5월의 광주에서 미국이 그랬듯이 한국은 정치적 혹은 경제적 고려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에 잠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 민주주의를 선망하고 하나의 가능한 모델로 여겨 왔던 아시아의 이웃들이, 우리의 침묵과 무관심과 무지에 처절한 배신감과 좌절을 느끼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