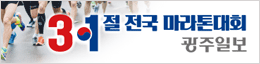(336)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달빛 아무리 밝아도 외롭고 쓸쓸하구나
 김홍도 작 ‘소림명월도’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사랑하는 것들은 모두/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 <백석 작 ‘흰 바람벽이 있어’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잠시 멈춘 탓인지 올 한해 하늘은 그 어느 해보다 유난히 깨끗하고 공활하다. 이즈음 밤하늘에 덩두렷이 걸려있는 보름달 역시 휘영청 밝다.
계절이 깊어지면서 스산해진 초겨울 분위기 탓인지, 사회전반에 스며든 것 같은 ‘코로나 블루’ 탓인지 그 달 아래 서면 달빛 아무리 밝아도 외롭고 쓸쓸해지는 것 같다. 우리나라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백석의 심정처럼 말이다.
김홍도(1745~1806)의 ‘소림명월도(疏林明月圖)’(1796년 작)는 꼭 이맘때의 달 밝은 밤 풍경을 묘사한 그림처럼 다가와 마음이 간다. 옛 그림이라는 생각이 도무지 들지 않을 만큼 친숙하고 현대적이다.
우리나라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야산에 나무가 듬성듬성 들어서 있는 숲 뒤편으로 보름달이 두둥실 떠있다.
오른 편에 선 작은 나무 아래로 조용하게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주변의 키 작은 나무들은 이파리를 모두 떨구고 있다. 풍경에 감정이입했던 화가의 정취, 단원의 고적감을 담았던 것일까. 인물 하나 등장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고요하고 소슬한 기운이 가슴 깊이 파고든다.
우리미술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우리 옛 그림을 연구해오면서 ‘단원 김홍도’ 연구를 한권의 역작으로 펴내기도 했던 미술사학자 오주석(1956~2005)은 “무엇을 그려도 조선적인, 가장 조선적인 우리 맛이 우러나게 그렸던 김홍도는 이 노년작에서 생애 만년에 신산스런 세상의 추이에서 맛보았던 씁쓸함, 그리고 허심으로 묘파한 미술혼의 깊이가 느껴진다”고 해석했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미술사박사>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잠시 멈춘 탓인지 올 한해 하늘은 그 어느 해보다 유난히 깨끗하고 공활하다. 이즈음 밤하늘에 덩두렷이 걸려있는 보름달 역시 휘영청 밝다.
김홍도(1745~1806)의 ‘소림명월도(疏林明月圖)’(1796년 작)는 꼭 이맘때의 달 밝은 밤 풍경을 묘사한 그림처럼 다가와 마음이 간다. 옛 그림이라는 생각이 도무지 들지 않을 만큼 친숙하고 현대적이다.
우리나라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야산에 나무가 듬성듬성 들어서 있는 숲 뒤편으로 보름달이 두둥실 떠있다.
우리미술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우리 옛 그림을 연구해오면서 ‘단원 김홍도’ 연구를 한권의 역작으로 펴내기도 했던 미술사학자 오주석(1956~2005)은 “무엇을 그려도 조선적인, 가장 조선적인 우리 맛이 우러나게 그렸던 김홍도는 이 노년작에서 생애 만년에 신산스런 세상의 추이에서 맛보았던 씁쓸함, 그리고 허심으로 묘파한 미술혼의 깊이가 느껴진다”고 해석했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미술사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