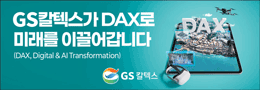[싸목싸목 남도 한바퀴-광양] 매화마을·망덕포구·라벤더 축제…꽃·철·빛의 도시
수월정 앞 ‘두꺼비 나루’ 섬진유래 조형물
550리 달려 온 섬진강 남해와 하나되고
망덕포구엔 전어잡이 노래 흥얼 흥얼
정병욱 가옥엔 윤동주 시인의 향기
배알도 수변공원엔 김시식지
터널 리모델링 와인동굴 복합예술공간
550리 달려 온 섬진강 남해와 하나되고
망덕포구엔 전어잡이 노래 흥얼 흥얼
정병욱 가옥엔 윤동주 시인의 향기
배알도 수변공원엔 김시식지
터널 리모델링 와인동굴 복합예술공간
 구봉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광양항과 이순신 대교 |
생명의 변화는 경이롭다. ‘코로나 블루’라고 불릴 정도로 답답해지는 요즘, 지방도 861호선을 따라 섬진강을 왼편에 끼고 광양으로 신록 마중을 가는 ‘드라이브 여행’에 나섰다. 섬진강은 수년전 강제된 ‘4대강 사업’의 삽질을 피할 수 있었다. 덕분에 지금까지 자연그대로의 서정적인 풍경을 유지하고 있다. 마스크를 벗고 차창을 내린 후 심호흡을 해본다.
3월이면 매화꽃 천지를 이루는 ‘광양 매화마을’앞 수월정에서 차를 멈춘다. 강물이 범람한다는 ‘수월’(水越)인가 지레짐작 했더니 현판을 보니 ‘수월’(水月)로 표기돼 있다. 송강 정철은 가사 ‘수월정기(記)’에서 “물은 달을 얻어 더욱 맑고/ 달은 물을 얻어 더욱 희니…”라고 노래했다. 수월정 앞에는 커다란 두꺼비 잔등에 앳된 처녀가 엎드려 있는 ‘두꺼비와 처녀’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본래 모래내, 다사강(多沙江), 두치강(豆置江)으로 부르던 강 이름이 ‘두꺼비 나루’라는 의미의 섬진(蟾津)으로 불린 유래를 알려주는 조형물이다.
강변에 자리한 진월면 오사리 돈탁마을에는 소나무 숲이 울창하다. 풍수지리적인 조화와 함께 홍수와 바람 등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비보(裨補=도와서 모자라는 것을 채움)숲이다.
◇바다와 합류하는 망덕포구와 배알도 수변공원=전북 진안 데미샘에서 발원한 섬진강은 550리를 흘러 광양 망덕포구에서 숨을 고르며 남해 푸른 바닷물과 만난다. ‘광양시지(誌)’에 따르면 망덕이라는 지명은 우리말 ‘망뎅이’(망댕이)에서 유래했다. 포구 뒷산에서 파수(망)를 보기에 알맞아 ‘망뎅이’라고 했는데 이를 한자로 망덕(望德)이라 표기했다는 설명이다. 또 뒷산이 전북 무주 덕유산이나 경남 남해 망운산을 바라보고 있다는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민족시인’ 윤동주(1917~1945)의 유고(遺稿)가 보존됐던 정병욱 가옥’(2007년 등록문화재 제341호 지정)은 현재 보수공사중이다. 가림막이 쳐져있어 내부를 볼 수 없었지만 시인의 향기를 품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
망덕포구 앞에는 자그마한 섬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배알도이다. 옛날에는 ‘뱀섬’(蛇島)이라 불렀다 한다. 포구에서 태인대교를 건너 태안도 북쪽에 자리한 배알도 수변공원으로 향한다.
수변공원과 배알도는 2018년 8월, 295m 길이의 해상보도교로 연결됐다. 배알도는 소나무와 벚나무 등 굵직한 나무들로 빽빽하다. 섬 정상에는 ‘해운정’(海雲亭)이 세워져 있다. 본래 1940년 진월면장 안상선 진월면장이 나무 등을 찬조하고, 백범 김구선생의 친필 휘호를 받아 건립했는데 1959년 9월 태풍 ‘사라호’ 내습으로 무너져버렸다고 한다. 현재 정자는 2015년 광양시에서 복원한 것이다.
해운정에서 소나무숲 사이로 바라보는 강 풍경은 서정적이면서 장쾌하다. 전어잡이 노래가 불려지고, 마룻바닥에 윤동주 시 원고를 감추던 옛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550리를 달려온 섬진강이 남해와 하나 되고, 전라도 광양과 경상도 하동이 한데 어우러진다. 자연은 경계가 없다. 푸른 물빛과 봄바람은 ‘코로나 19’에 대한 우려를 먼지처럼 날려버린다. 배알도와 망덕포구를 연결하는 해상보도교는 현재 공사 중으로 올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16세기 김과 21세기 라벤더, ‘블루 오션’ 개척=배알도는 김과도 연관있는 섬이다.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남쪽으로 2㎞ 떨어진 곳에 ‘김 시식지’(김여익 사당)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김을 양식한 김여익 공을 기리는 사당(영모재)과 김 역사관이 자리하고 있다.
영암 출신인 김여익은 태인도에서 사는 동안(1640~1660년) 소나무와 밤나무 가지를 이용해 김 양식법을 창안해 보급한 인물이다. 그는 어느 날 배알도 해안가를 거닐다 밤나무 가지에 이름 모를 해초가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됐다. 이를 무심히 넘겨보지 않고 연구를 거듭해 김을 인위적으로 양식하고, 김을 고루 펴서 건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정립했다. 김 역사관내에는 섶 만들기를 시작으로 김양식장 섶 꽂기→김 채취→김 세척→김 뜨기→김 건조→김 떼기 등 일련의 과정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았다.
김이 16세기에 광양 어민들의 ‘블루 오션’이었다면 21세기에는 라벤더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매년 6월께 광양읍 사곡리 사라실마을 일대는 보랏빛깔 라벤더 꽃밭이 끝없이 펼쳐진다. 사라실마을 김동필 이장과 주민들이 중심이 돼 2016년 사라실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라벤더 재배에 발 벗고 나선 결과물이다. 처음에는 입소문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왔지만 6월에 ‘라벤더 축제’를 개최하면서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핫플레이스인 광양 와인동굴(광양시 광양읍 강정길 33)은 와인과 관련된 복합 문화예술공간이다. 과거에 제철원료인 철광석과 완제품을 운반하던 기차가 오가던 길이 300여m의 터널을 리모델링해 와인역사와 와인저장고, 미디어아트, 빛터널 등 10개 구간에 다채로운 와인 관련 콘텐츠를 선보인다.
◇구봉산 전망대, ‘야간관광 100선(選)’에 포함=광양읍과 동광양 사이에 자리한 구봉산(해발 473m)에 오르면 광양만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구봉산전망대는 도로를 따라 차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산꼭대기에는 특수강으로 만든 ‘메탈아트 봉수대’가 우뚝 서 있다. 임동희 작가 작품으로, 작품명은 ‘빛(光)·꽃(花)·철(鐵)·항(港)’이다.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매화꽃잎으로 광양 12개 읍·면·동을 표현하면서 ‘빛의 도시’, ‘철의 도시’ 광양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높이 9.40m는 광양이라는 행정지명을 처음 사용한 해(940년)를 의미한다.
구봉산 전망대는 지난 4월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관광 100선’에 포함됐다. 매화를 형상화한 메탈아트 봉수대에 LED 조명을 하면 낮과 다른 느낌을 준다. 또 광양항과 광양제철소, 이순신 대교 야경은 산업현장의 역동감을 느끼게 한다. 이순신 대교는 광양시 금호동과 여수시 묘도를 연결하는 현수교이다. 총 길이가 2260m,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主徑間長)는 1545m에 달한다. 광양만 중앙에 자리한 묘도(猫島)는 정유재란 당시 명나라 진린 도독이 이끄는 수군 병력이 주둔했던 임진왜란 유적지이기도 하다.
‘코로나 19’는 사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수필가 피천득(1910~2007)은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이라고 했다. 생명력을 발산하는 신록을 만끽하며 ‘코로나 19’를 이겨내길 소망한다.
/글·사진=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섬진강 두꺼비 처녀상 |
 윤동주 유고 보관된 정병욱 가옥 |
‘민족시인’ 윤동주(1917~1945)의 유고(遺稿)가 보존됐던 정병욱 가옥’(2007년 등록문화재 제341호 지정)은 현재 보수공사중이다. 가림막이 쳐져있어 내부를 볼 수 없었지만 시인의 향기를 품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
망덕포구 앞에는 자그마한 섬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배알도이다. 옛날에는 ‘뱀섬’(蛇島)이라 불렀다 한다. 포구에서 태인대교를 건너 태안도 북쪽에 자리한 배알도 수변공원으로 향한다.
수변공원과 배알도는 2018년 8월, 295m 길이의 해상보도교로 연결됐다. 배알도는 소나무와 벚나무 등 굵직한 나무들로 빽빽하다. 섬 정상에는 ‘해운정’(海雲亭)이 세워져 있다. 본래 1940년 진월면장 안상선 진월면장이 나무 등을 찬조하고, 백범 김구선생의 친필 휘호를 받아 건립했는데 1959년 9월 태풍 ‘사라호’ 내습으로 무너져버렸다고 한다. 현재 정자는 2015년 광양시에서 복원한 것이다.
해운정에서 소나무숲 사이로 바라보는 강 풍경은 서정적이면서 장쾌하다. 전어잡이 노래가 불려지고, 마룻바닥에 윤동주 시 원고를 감추던 옛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550리를 달려온 섬진강이 남해와 하나 되고, 전라도 광양과 경상도 하동이 한데 어우러진다. 자연은 경계가 없다. 푸른 물빛과 봄바람은 ‘코로나 19’에 대한 우려를 먼지처럼 날려버린다. 배알도와 망덕포구를 연결하는 해상보도교는 현재 공사 중으로 올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광양시 다압면 홍쌍리 청매실농원. 초록 빛깔의 매실나무 사이로 보이는 돌담길이 정겹다. |
영암 출신인 김여익은 태인도에서 사는 동안(1640~1660년) 소나무와 밤나무 가지를 이용해 김 양식법을 창안해 보급한 인물이다. 그는 어느 날 배알도 해안가를 거닐다 밤나무 가지에 이름 모를 해초가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됐다. 이를 무심히 넘겨보지 않고 연구를 거듭해 김을 인위적으로 양식하고, 김을 고루 펴서 건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정립했다. 김 역사관내에는 섶 만들기를 시작으로 김양식장 섶 꽂기→김 채취→김 세척→김 뜨기→김 건조→김 떼기 등 일련의 과정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았다.
김이 16세기에 광양 어민들의 ‘블루 오션’이었다면 21세기에는 라벤더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매년 6월께 광양읍 사곡리 사라실마을 일대는 보랏빛깔 라벤더 꽃밭이 끝없이 펼쳐진다. 사라실마을 김동필 이장과 주민들이 중심이 돼 2016년 사라실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라벤더 재배에 발 벗고 나선 결과물이다. 처음에는 입소문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왔지만 6월에 ‘라벤더 축제’를 개최하면서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핫플레이스인 광양 와인동굴(광양시 광양읍 강정길 33)은 와인과 관련된 복합 문화예술공간이다. 과거에 제철원료인 철광석과 완제품을 운반하던 기차가 오가던 길이 300여m의 터널을 리모델링해 와인역사와 와인저장고, 미디어아트, 빛터널 등 10개 구간에 다채로운 와인 관련 콘텐츠를 선보인다.
 광양구봉산 전망대 |
구봉산 전망대는 지난 4월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관광 100선’에 포함됐다. 매화를 형상화한 메탈아트 봉수대에 LED 조명을 하면 낮과 다른 느낌을 준다. 또 광양항과 광양제철소, 이순신 대교 야경은 산업현장의 역동감을 느끼게 한다. 이순신 대교는 광양시 금호동과 여수시 묘도를 연결하는 현수교이다. 총 길이가 2260m,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主徑間長)는 1545m에 달한다. 광양만 중앙에 자리한 묘도(猫島)는 정유재란 당시 명나라 진린 도독이 이끄는 수군 병력이 주둔했던 임진왜란 유적지이기도 하다.
‘코로나 19’는 사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수필가 피천득(1910~2007)은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이라고 했다. 생명력을 발산하는 신록을 만끽하며 ‘코로나 19’를 이겨내길 소망한다.
/글·사진=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