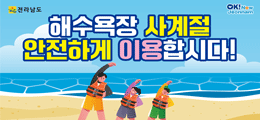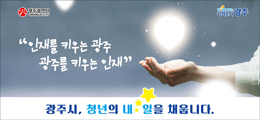제400회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광주정신’ 닮은 음악으로
14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서 ‘혁명가들’
 이병욱 광주시향 예술감독(오른쪽)과 김규연 피아니스트.<광주예술의전당 제공> |
“예술은 세상을 바꾸는 조용한 혁명이다.”
1976년 창단 이후 쉼 없이 이어온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의 예술의 여정이 어느덧 400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향의 제400회 정기연주회는 광주 예술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만한 무대다. 반세기에 걸친 광주시향의 여정은 곧 광주 음악사의 흐름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향이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400회 정기연주회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의 제목은 ‘혁명가들’. 시대와 맞서는 예술가의 정신을 주제로 삼은 이번 공연은 단순한 연주회를 넘어 지역과 함께 호흡해온 광주시향의 역사와 철학을 압축하는 무대로 관심을 모은다.
첫 곡은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다.
1913년 당시 ‘러시아 음악계의 반항아’로 알려진 프로코피예프는 이 곡을 통해 청중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서정 대신 폭발적인 리듬을, 균형 대신 불협화음의 충돌을 택한 그는 낭만주의의 익숙한 어법을 거침없이 부수며 새로운 음악의 지평을 열었다. 특히 1악장의 긴 카덴차와 격렬한 피날레는 연주자에게 한계에 가까운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김규연이 협연자로 나서 젊은 프로코피예프가 품었던 불안과 열정을 자신의 해석으로 풀어낸다.
김규연은 지나 박하우어 영 아티스트 국제 콩쿠르 우승, 더블린 국제 콩쿠르 준우승을 비롯해 퀸 엘리자베스, 클리블랜드 등 세계 주요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낸 연주자다. 2017년 카네기홀 리사이틀 데뷔 당시 ‘자연스러운 호흡과 진정성 있는 해석’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이다.
이 작품은 20세기 음악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예술과 체제의 갈등’을 담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소련 당국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쓰였지만 그 안에는 검열의 시대를 견디던 예술가의 복잡한 내면이 녹아 있다. 섬세한 선율이 점점 격정으로 번져가는 흐름은 인간이 억압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려는 몸부림과 같다. 특히 4악장의 승리 행진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상처 입은 시대가 맞이하는 ‘의지의 선언’으로도 읽힌다.
이번 공연을 지휘하는 이병욱 예술감독은 두 작품을 ‘예술가의 생존과 혁신’으로 연결해 풀어냈다.
그는 “프로코피예프와 쇼스타코비치는 체제의 압박 속에서도 예술로 말하고, 저항하고 살아남았다”며“그들의 음악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무엇인지를 묻는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1976년 창단 이후 쉼 없이 이어온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의 예술의 여정이 어느덧 400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향의 제400회 정기연주회는 광주 예술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만한 무대다. 반세기에 걸친 광주시향의 여정은 곧 광주 음악사의 흐름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 곡은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다.
1913년 당시 ‘러시아 음악계의 반항아’로 알려진 프로코피예프는 이 곡을 통해 청중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서정 대신 폭발적인 리듬을, 균형 대신 불협화음의 충돌을 택한 그는 낭만주의의 익숙한 어법을 거침없이 부수며 새로운 음악의 지평을 열었다. 특히 1악장의 긴 카덴차와 격렬한 피날레는 연주자에게 한계에 가까운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한다.
김규연은 지나 박하우어 영 아티스트 국제 콩쿠르 우승, 더블린 국제 콩쿠르 준우승을 비롯해 퀸 엘리자베스, 클리블랜드 등 세계 주요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낸 연주자다. 2017년 카네기홀 리사이틀 데뷔 당시 ‘자연스러운 호흡과 진정성 있는 해석’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이다.
이 작품은 20세기 음악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예술과 체제의 갈등’을 담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소련 당국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쓰였지만 그 안에는 검열의 시대를 견디던 예술가의 복잡한 내면이 녹아 있다. 섬세한 선율이 점점 격정으로 번져가는 흐름은 인간이 억압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려는 몸부림과 같다. 특히 4악장의 승리 행진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상처 입은 시대가 맞이하는 ‘의지의 선언’으로도 읽힌다.
이번 공연을 지휘하는 이병욱 예술감독은 두 작품을 ‘예술가의 생존과 혁신’으로 연결해 풀어냈다.
그는 “프로코피예프와 쇼스타코비치는 체제의 압박 속에서도 예술로 말하고, 저항하고 살아남았다”며“그들의 음악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무엇인지를 묻는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