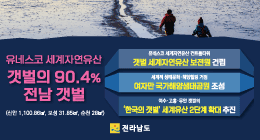일제 전쟁 유적이 사라지면
식민통치 증좌 기억도 사라져
기록학적 측면에서 보존 활용
반전교육현장 관광자원화를
특히 대다수 유적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관리·활용은커녕 문화재로도 등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존·활용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많은 유적들이 사유지 및 개인의 재산권 등의 문제와 맞물려 보존과 활용에 현실적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고, 도시개발 등의 요인에 따른 일제강점기 유적 자원의 소멸과 훼손을 무조건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 정 대표 설명이다.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변화와 함께 용도가 변하고, 철거·멸실 등의 위기에 처하면서 기록학적인 관점에서 유적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처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더라도 해당 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도면이나 기록을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최근 광주시가 소녀들이 아픔을 갖고 있는 강제 동원 현장인 광주 가네보 방직 공장을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을 전국적인 모범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같은 기억 보존 및 활용 시도 하나하나가 곧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기억 투쟁’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정 대표는 “아직도 실체를 모르는 유적지들이 많은데 추적해 실체를 찾아가고 공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역사성’을 기준으로 삼아 유적들이 인권과 평화의 교육의 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