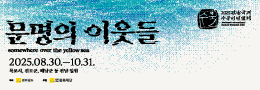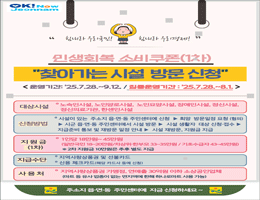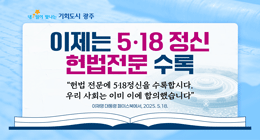사람이 머무는 도시, 광주의 해법 - 김경훈 광주교육시민 앰버서더
 |
“광주경영자총협회와 광주시교육청이 청소년들의 글로벌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나섰다.” 지난 8월 초 지역 언론이 전한 문장이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기업과 손잡고 해외 산업현장을 찾고 기업 간담회와 공장 견학, 대학 교류가 이어진다고 했다. 구호보다 움직임이 앞선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 광주는 숫자 앞에서 멈칫한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광주시 주민등록 인구가 140만명 선 아래(139만 9880명)로 내려앉았고 특히 청년의 순유출이 크다. 인구는 단지 통계가 아니다. 사람이 줄면 교실은 비고 가게의 불이 일찍 꺼지거나 아예 닫고 버스 노선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반대로 사람이 머물면 학교와 상점과 공장이 함께 살아난다. 아이가 자라서 지역에서 첫 월급을 받는 순간 도시의 심장은 다시 크게 뛴다. 그래서 인구는 중요하다. 생활의 온도와 지역의 자존, 다음 세대의 선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교육이 먼저 움직였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지역의 실제 일과 잇기 위해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열정적으로 운영해 왔다. 학생이 교실에서 익힌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졸업 이후의 길을 지역에서 설계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여기서 배웠으니 여기서 일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그 노력에 지역이 힘을 보탠다.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참여해 해외 산업현장 탐방을 함께 열고 기업들이 학교와 더 촘촘히 연결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교실로 들어와 경험을 나누고 학생은 방학과 학기 사이에 지역 공장과 연구실, 가게와 병원을 오가며 직업의 얼굴을 직접 만난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역 산업계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사실 자체가 변화다. 교육을 학교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의 과제로 끌어올리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결국 해법은 거창하지 않다. 배운 것을 일로, 일을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 주는 일상적 통로가 많아지면 된다. 학생이 동네 회사의 작은 프로젝트를 맡아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첫 채용 기회를 얻고 첫 월세를 내며 살림을 꾸리는 과정이 도시 곳곳에서 반복되면 된다. 행정은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고 기업은 실습생을 임시 인력이 아닌 미래 동료로 대하며 학교는 저녁의 실습실을 지역에 열어 세대가 섞여 배우게 하면 된다.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 주고 실패한 시도에도 다시 기회를 내주면 선순환은 더 빨라진다.
사람이 남는 도시의 얼굴은 거창하지 않다. 저녁이면 골목마다 불이 켜지고 동네 서점과 도서관 창문에 학생 작품과 채용 안내가 나란히 붙는다. 시장 상인은 학생들의 첫 결과물을 믿고 한 번 써 보고 시내버스 시간표는 실습과 수업에 맞춰 촘촘히 이어진다. 동네 장인은 일주일에 한 번 제자를 만나 기술을 전하고 시청이나 교육청의 원스톱 창구는 복잡한 서류를 한 장으로 줄인다. 이런 장면이 쌓일수록 머무름은 생활이 된다.
광주는 이름부터 ‘빛고을’이다. 교육이 불씨를 지피고 지역이 바람을 더하면 작은 불빛은 금세 등불이 된다.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가 닦아 놓은 길 위에 지역 산업계와 시민이 한 걸음씩 보태면 ‘떠나는 광주’는 ‘머무는 광주’로 바뀐다. 오늘 한 명의 학생이 지역에서 첫 경력을 시작하고, 내일 한 곳의 회사가 첫 기회를 내주며, 모레 한 가정이 이곳에 뿌리를 내릴 때 광주는 다시 빛난다. 교육이 길을 열고, 지역이 그 길을 넓히고, 시민이 그 길을 함께 걸으면 된다. 그러면 광주는 지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빛과 품격을 갖춘 글로컬한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교육이 먼저 움직였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지역의 실제 일과 잇기 위해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열정적으로 운영해 왔다. 학생이 교실에서 익힌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졸업 이후의 길을 지역에서 설계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여기서 배웠으니 여기서 일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해법은 거창하지 않다. 배운 것을 일로, 일을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 주는 일상적 통로가 많아지면 된다. 학생이 동네 회사의 작은 프로젝트를 맡아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첫 채용 기회를 얻고 첫 월세를 내며 살림을 꾸리는 과정이 도시 곳곳에서 반복되면 된다. 행정은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고 기업은 실습생을 임시 인력이 아닌 미래 동료로 대하며 학교는 저녁의 실습실을 지역에 열어 세대가 섞여 배우게 하면 된다.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 주고 실패한 시도에도 다시 기회를 내주면 선순환은 더 빨라진다.
사람이 남는 도시의 얼굴은 거창하지 않다. 저녁이면 골목마다 불이 켜지고 동네 서점과 도서관 창문에 학생 작품과 채용 안내가 나란히 붙는다. 시장 상인은 학생들의 첫 결과물을 믿고 한 번 써 보고 시내버스 시간표는 실습과 수업에 맞춰 촘촘히 이어진다. 동네 장인은 일주일에 한 번 제자를 만나 기술을 전하고 시청이나 교육청의 원스톱 창구는 복잡한 서류를 한 장으로 줄인다. 이런 장면이 쌓일수록 머무름은 생활이 된다.
광주는 이름부터 ‘빛고을’이다. 교육이 불씨를 지피고 지역이 바람을 더하면 작은 불빛은 금세 등불이 된다.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가 닦아 놓은 길 위에 지역 산업계와 시민이 한 걸음씩 보태면 ‘떠나는 광주’는 ‘머무는 광주’로 바뀐다. 오늘 한 명의 학생이 지역에서 첫 경력을 시작하고, 내일 한 곳의 회사가 첫 기회를 내주며, 모레 한 가정이 이곳에 뿌리를 내릴 때 광주는 다시 빛난다. 교육이 길을 열고, 지역이 그 길을 넓히고, 시민이 그 길을 함께 걸으면 된다. 그러면 광주는 지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빛과 품격을 갖춘 글로컬한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