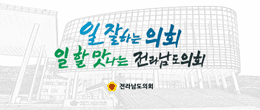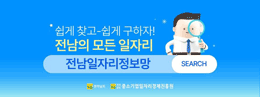‘기후대응댐’은 실패한 정책 재포장…기존 댐 건설과 유사
‘영산강·섬진강 유역 물관리’ 토론회…환경단체, 후보지 9곳 철회 요구
송미영 교수 “정부, 폐기사업 이름 바꿔 재추진…합리성·지역 수요 무관”
송미영 교수 “정부, 폐기사업 이름 바꿔 재추진…합리성·지역 수요 무관”
 /클립아트코리아 |
기후위기 해소를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정책에 대해, 실패한 과거 정책의 재포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기존의 물정책이 유역 통합관리와 생태복원 중심으로 전환되는 듯 보이지만, 신규 댐 중심의 접근이 다시 부활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20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영산강·섬진강 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 토론회에서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송미영 인하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기후대응댐은 과거 수차례 타당성 부족으로 폐기됐던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재추진하는 것”이라며 “공급 확대 중심의 하향식 정책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된 국가 물관리기본계획은 “자연적 물순환 회복, 통합 관리, 시민참여”를 핵심으로 했으나, 2023년 정권 교체 후 해당 계획이 일부 삭제 및 변경되면서 다시 전통적 치수 중심으로 후퇴했다.
송 교수는 기후대응댐 또한 같은 맥락에서 나온 정책으로, ‘기후대응’이라는 용어를 붙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댐 건설 중심 방식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사평댐, 옥천댐 등은 기존 댐 근처에 또 다른 댐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합리성이나 지역 수요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후대응댐 설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물 수요를 과도하게 추정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예컨대 해남, 나주 등지는 산업단지 확충 등을 근거로 일부 지역은 200% 증가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허가량 중 절반 이하만 사용되며, 재이용·수요관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영산강 유역의 경우,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외에도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등 중복된 계획들이 겹치면서 각각 부처나 기관이 따로 추진해 체계 혼란, 예산 낭비, 정책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정부가 ‘지역 주민과 합의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기후대응댐 계획을 통보하면서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내놨다.
송 교수는 전통적 방식의 치수 중심 수량 관리(댐, 보, 제방) 체계에서 벗어나 물의 순환 회복, 유역 간 형평성과 공정한 분배를 고려하고 주민 참여와 공감 가능한 대안을 반영한 물 관리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복된 계획을 정비하고 계획의 일관성과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기초자료 확충과 과학적 검증을 거쳐 기반시설 확대보다 회복력 중심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전남지역에 건설하기로 한 기후위기 댐 건설 계획 중 강진 병영천댐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 당초 건립 후보지로 선정됐던 화순 동복천댐과 순천 옥천댐은 각각 후보지, 보류지로 남겨뒀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 환경단체는 9곳 최종후보지 선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후위기댐은 환경부의 무능만 담은 수자원관리계획이라며 확정된 후보지 9곳의 건설 계획도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특히 기존의 물정책이 유역 통합관리와 생태복원 중심으로 전환되는 듯 보이지만, 신규 댐 중심의 접근이 다시 부활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20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영산강·섬진강 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 토론회에서 나왔다.
송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된 국가 물관리기본계획은 “자연적 물순환 회복, 통합 관리, 시민참여”를 핵심으로 했으나, 2023년 정권 교체 후 해당 계획이 일부 삭제 및 변경되면서 다시 전통적 치수 중심으로 후퇴했다.
정부가 기후대응댐 설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물 수요를 과도하게 추정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예컨대 해남, 나주 등지는 산업단지 확충 등을 근거로 일부 지역은 200% 증가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허가량 중 절반 이하만 사용되며, 재이용·수요관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영산강 유역의 경우,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외에도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등 중복된 계획들이 겹치면서 각각 부처나 기관이 따로 추진해 체계 혼란, 예산 낭비, 정책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정부가 ‘지역 주민과 합의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기후대응댐 계획을 통보하면서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내놨다.
송 교수는 전통적 방식의 치수 중심 수량 관리(댐, 보, 제방) 체계에서 벗어나 물의 순환 회복, 유역 간 형평성과 공정한 분배를 고려하고 주민 참여와 공감 가능한 대안을 반영한 물 관리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복된 계획을 정비하고 계획의 일관성과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기초자료 확충과 과학적 검증을 거쳐 기반시설 확대보다 회복력 중심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전남지역에 건설하기로 한 기후위기 댐 건설 계획 중 강진 병영천댐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 당초 건립 후보지로 선정됐던 화순 동복천댐과 순천 옥천댐은 각각 후보지, 보류지로 남겨뒀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 환경단체는 9곳 최종후보지 선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후위기댐은 환경부의 무능만 담은 수자원관리계획이라며 확정된 후보지 9곳의 건설 계획도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