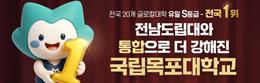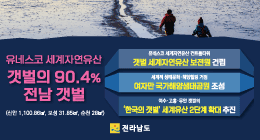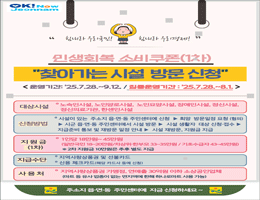‘달빛 곳곳말 겨루기 한마당’을 열었으면- 곽흥렬 수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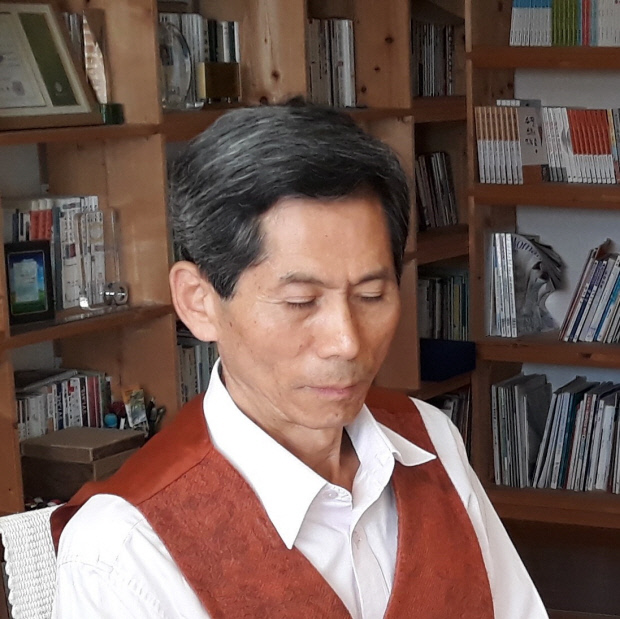 |
전라도 사투리 경연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해를 이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처음 전주에서 포문을 연 뒤로 고창, 장흥, 광주 등지로 지역을 넓혀 가며 열리고 있다. “워메워메 시상에 어짜쓰까” 전북 고창 대회에서 나온 전라도 사투리 한 토막이다. 표준말로는 ‘어머어머 세상에 어쩌면 좋을까’ 정도가 되지 싶다. 혀에 착착 감기는 표현이 절로 자꾸 되뇌어보게 만든다.
전라도만이 아니다. 경상도에서도 지역 사투리 경연대회가 열렸다는 뉴스를 여러 차례 만났다. 청도에서 반시 축제의 부대 행사로 치러졌는가 하면 창원, 창녕, 거창 등지에서는 각 지역 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되었다고 한다.
경상도 말과 전라도 말을 곰곰이 음미해 보노라면 둘 다 얼마나 정겨우면서 친근감이 느껴지는지 모른다. 게다가 맛깔스럽기까지 하다. 경상도 말에서는 투박한 뚝배기 맛이 난다면, 전라도 말에서는 상큼한 동치미 맛이 난다.
소식을 접하면서 앞으로는 경상도와 전라도가 합동으로 대회를 열면 훨씬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그러면서 나는 그 대회 이름을 ‘달빛 곳곳말 겨루기 한마당’으로 지었으면 하는 주장을 편다.
광주와 대구, 두 지역은 오랜 세월에 걸쳐 깊어진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골을 메우고 동서 화합을 이뤄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영호남 합동 신년 하례식을 개최한다, 학술 대회를 연다, 문화예술 박람회를 추진한다,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광주와 대구를 잇는 길을 뚫은 것도 두 지역 간의 교류가 큰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이름하여 ‘88올림픽고속도로’다. 처음엔 2차로이던 것을 훗날 4차로로 확장하면서 명칭을 ‘광대고속도로’로 바꾸었다. 이래 놓고 보니 어감이 영 좋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바꾼 것이 지금의 ‘광주대구고속도로’이다.
이러한 갖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그리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두 지역 간에 뿌리박힌 정서적 이질감을 통합하는 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 숙제를 풀 가장 좋은 해법으로 달빛 곳곳말 겨루기 한마당을 열었으면 하고 제안한다. 달빛 곳곳말 겨루기 한마당, 이 명칭을 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고안해 내었다.
먼저 경상도와 전라도를 합쳐 부르는 말로 각 고을의 머리글자를 딴 ‘경전’을 가져온다. ‘경전’은 반세기도 더 전인 꼬맹이 시절부터 익히 들어 온 말이다. 지난날 경상도를 대표하는 도시인 대구와 전라도를 대표하는 도시인 광주를 시외버스인 경전여객(慶全旅客)이 운행했었다. 경상도 하면 대구, 전라도 하면 광주를 떠올리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반 없을 줄 안다. 그만큼 두 도시는 뚜렷한 대표성을 갖고 두 지역의 터줏대감 노릇을 해왔다.
대구의 순우리말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 이름인 ‘빛고을’의 머리글자를 따서 ‘달빛’이 생겨났다. 이 신조어가 언젠가부터 언중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두루 쓰이고 있는 것은 아마도 정서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져서일 게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 논리의 근거는 얼추 갖추어진 것 같다. 여기서 일차적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합성어인 ‘경전’을 빌려오면 ‘경전 사투리 경연 대회’가 된다. 그다음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대표성을 지닌 두 도시 대구와 광주의 순우리말 이름을 앞머리에 세워 ‘달빛 사투리 경연 대회’로 바꾼다. 다시 그다음으로 ‘사투리’라는 단어는 말 자체가 어쩐지 어감이 좋지 못하니 ‘곳곳말’로 대체하고, ‘경연’과 ‘대회’는 한자어여서 뜻이 곧바로 전달되기도 어렵거니와 케케묵기까지 하여 각각 순우리말인 ‘겨루기’와 ‘한마당’으로 고친다. 이리하여 마침내 완성한 이름이 ‘달빛 곳곳말 겨루기 한마당’이다.
앞으로 달빛 곳곳말 겨루기 한마당을 광주와 대구, 대구와 광주에서 해마다 겨끔내기로 열어나갔으면 한다. 이 행사를 통해 서로의 정서와 문화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두 지역 간의 해묵은 대립과 갈등은 시나브로 풀어질 수 있을 것임을 굳게 믿는다.
경상도 말과 전라도 말을 곰곰이 음미해 보노라면 둘 다 얼마나 정겨우면서 친근감이 느껴지는지 모른다. 게다가 맛깔스럽기까지 하다. 경상도 말에서는 투박한 뚝배기 맛이 난다면, 전라도 말에서는 상큼한 동치미 맛이 난다.
소식을 접하면서 앞으로는 경상도와 전라도가 합동으로 대회를 열면 훨씬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그러면서 나는 그 대회 이름을 ‘달빛 곳곳말 겨루기 한마당’으로 지었으면 하는 주장을 편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광주와 대구를 잇는 길을 뚫은 것도 두 지역 간의 교류가 큰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이름하여 ‘88올림픽고속도로’다. 처음엔 2차로이던 것을 훗날 4차로로 확장하면서 명칭을 ‘광대고속도로’로 바꾸었다. 이래 놓고 보니 어감이 영 좋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바꾼 것이 지금의 ‘광주대구고속도로’이다.
이러한 갖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그리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두 지역 간에 뿌리박힌 정서적 이질감을 통합하는 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 숙제를 풀 가장 좋은 해법으로 달빛 곳곳말 겨루기 한마당을 열었으면 하고 제안한다. 달빛 곳곳말 겨루기 한마당, 이 명칭을 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고안해 내었다.
먼저 경상도와 전라도를 합쳐 부르는 말로 각 고을의 머리글자를 딴 ‘경전’을 가져온다. ‘경전’은 반세기도 더 전인 꼬맹이 시절부터 익히 들어 온 말이다. 지난날 경상도를 대표하는 도시인 대구와 전라도를 대표하는 도시인 광주를 시외버스인 경전여객(慶全旅客)이 운행했었다. 경상도 하면 대구, 전라도 하면 광주를 떠올리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반 없을 줄 안다. 그만큼 두 도시는 뚜렷한 대표성을 갖고 두 지역의 터줏대감 노릇을 해왔다.
대구의 순우리말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 이름인 ‘빛고을’의 머리글자를 따서 ‘달빛’이 생겨났다. 이 신조어가 언젠가부터 언중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두루 쓰이고 있는 것은 아마도 정서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져서일 게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 논리의 근거는 얼추 갖추어진 것 같다. 여기서 일차적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합성어인 ‘경전’을 빌려오면 ‘경전 사투리 경연 대회’가 된다. 그다음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대표성을 지닌 두 도시 대구와 광주의 순우리말 이름을 앞머리에 세워 ‘달빛 사투리 경연 대회’로 바꾼다. 다시 그다음으로 ‘사투리’라는 단어는 말 자체가 어쩐지 어감이 좋지 못하니 ‘곳곳말’로 대체하고, ‘경연’과 ‘대회’는 한자어여서 뜻이 곧바로 전달되기도 어렵거니와 케케묵기까지 하여 각각 순우리말인 ‘겨루기’와 ‘한마당’으로 고친다. 이리하여 마침내 완성한 이름이 ‘달빛 곳곳말 겨루기 한마당’이다.
앞으로 달빛 곳곳말 겨루기 한마당을 광주와 대구, 대구와 광주에서 해마다 겨끔내기로 열어나갔으면 한다. 이 행사를 통해 서로의 정서와 문화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두 지역 간의 해묵은 대립과 갈등은 시나브로 풀어질 수 있을 것임을 굳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