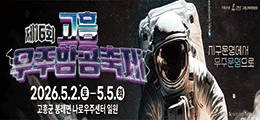광주의 대표영화 ‘양림동 소녀’를 아시나요?-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정치학 박사
 |
지난 24일 불금 저녁, 집에 들어서자 마자 KBS를 켰다. 하루 아침에 ‘땡윤 뉴스’로 전락해가는 9시 뉴스가 아니라, 제44회 청룡영화상 시상식 중계를 보기 위해서였다. 광주의 작가 임영희씨의 자전적 다큐 영화 ‘양림동 소녀’가 청룡영화상 단편영화상 후보에 올라 있어 시상식 중계를 놓칠 수 없었다.
‘양림동 소녀’는 이미 2023년 최고의 화제작이다. 2023년 4월 14일 KBS 독립영화관에서 인터뷰와 함께 전국에 방영되면서 각종 인권, 노인, 여성, 장애인 이름의 영화제와 지역 독립영화제에 초대되어 상영됐다. 상복도 쏟아져 제15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 노인감독부문 대상, 제24회 가치봄 영화제 인권상, 제24회 국제 제주 장애인인권영화제 대상을 수상하고, 마침내 제44회 청룡영화제 단편영화상 후보에 오른 것이다.
대한민국 영화계의 최정상 영화와 간판 스타들의 축제에 가히 시상대에 설수 있을지 기대반 설렘반으로 지켜봤다. 제44회 청룡영화제는 한국 영화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기고, 30년간 청룡영화제 MC로 활약했던 배우 김혜수의 감동적인 고별사와 함께 막을 내렸다. ‘양림동 소녀’는 끝내 시상대에 서진 못했다. 후보작에 오른 것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있는 영화적 성취이자, 불꽃같이 살아 온 임영희 작가에 대한 ‘신선한 답례’였다.
‘양림동 소녀’는 1969년 진도에서 광주로 유학 온 꿈많은 소녀, 임영희의 자전적 다큐 애니메이션 영화다. 군부독재와 민주항쟁의 격동기를 치열하게 살아 낸 소녀의 삶이 동화처럼 이쁜 그림과 어머니의 입담 해설, 잔잔한 배경음악에 입혀져 영화로 탄생했다. 양림동에서의 성장 스토리와 대학시절 학생운동, 1980년 5·18 한복판에서 시민군 활동과 12년전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으로 장애인으로 살아 가는 현재의 삶이 한장 한장 그림 영상으로 펼쳐진다.
처음 접할 때 느낌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내가 알고있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했던 임영희 작가의 삶이 존경스러웠고, 아들 오재형 감독의 멀티 재능으로 단편영화가 뚝딱 만들어진 것이 신기했다. 결코 쉽지 않은 양식의 다큐메니션이라는 영화 문법도 새로웠다.
광주에는 이제 ‘양림동 소녀’라는 대표 콘텐츠 하나가 더 해졌다. 숨막히게 고단하고 쓰라렸던 1970~80년대, 5·18 학살의 폭압과 아픔을 이겨낸 동시대의 삶이 영화가 되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온 것이다. 어찌 동시대 사람들 뿐이겠는가. 11월 8일 전남여고에 ‘기억 이음의 벽’ 설치 기념으로 ‘양림동 소녀’ 영화 상영과 그림 특별전이 열렸을 때 전남여고생들은 임 작가에게 예리한 질문을 쏟아냈다.
“군사독재 시절, 무섭고 어두운 이야기를 작가님은 어떻게 그렇게 밝고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80년 5월 26일 밤 계엄군의 강제 진압작전이 임박한 시점에서 광주YWCA에서 위험하니 집으로 가라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발을 내딛는 순간, 등뒤에서 총소리가 들렸다는 작가님의 표현이 정말 비장하고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반짝이는 질문 속에 건강한 다음 세대가 엿보인다. 광주의 역사와 정신이 세대를 이어 얼마든지 잘 기억되고 기록되고 계승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BTS의 K팝처럼 강력하진 않지만 잔잔한 세대 공감이다.
역시 문제는 스토리와 콘텐츠다. 콘텐츠 없이는 역사도 미래도 없다. 천년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콘텐츠가 광주를 살리는 원동력이다. ‘양림동 소녀’는 그 중 압권이다. 2023년 겨울은 ‘양림동 소녀’로 인해 가슴이 따뜻해진다. 오랜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를때 처럼 괜히 가슴이 뛰고 설렌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양림동 소녀와 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 아닐까.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우리도 각자 스토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때 함께 꿨던 꿈이 한낱 헛되지 않았노라고. 역행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신냉전 극복, 평화통일의 갈망과 의지가 여전히 오늘을 살게 하는 동력이라고 마음껏 소리쳤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영화계의 최정상 영화와 간판 스타들의 축제에 가히 시상대에 설수 있을지 기대반 설렘반으로 지켜봤다. 제44회 청룡영화제는 한국 영화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기고, 30년간 청룡영화제 MC로 활약했던 배우 김혜수의 감동적인 고별사와 함께 막을 내렸다. ‘양림동 소녀’는 끝내 시상대에 서진 못했다. 후보작에 오른 것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있는 영화적 성취이자, 불꽃같이 살아 온 임영희 작가에 대한 ‘신선한 답례’였다.
처음 접할 때 느낌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내가 알고있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했던 임영희 작가의 삶이 존경스러웠고, 아들 오재형 감독의 멀티 재능으로 단편영화가 뚝딱 만들어진 것이 신기했다. 결코 쉽지 않은 양식의 다큐메니션이라는 영화 문법도 새로웠다.
광주에는 이제 ‘양림동 소녀’라는 대표 콘텐츠 하나가 더 해졌다. 숨막히게 고단하고 쓰라렸던 1970~80년대, 5·18 학살의 폭압과 아픔을 이겨낸 동시대의 삶이 영화가 되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온 것이다. 어찌 동시대 사람들 뿐이겠는가. 11월 8일 전남여고에 ‘기억 이음의 벽’ 설치 기념으로 ‘양림동 소녀’ 영화 상영과 그림 특별전이 열렸을 때 전남여고생들은 임 작가에게 예리한 질문을 쏟아냈다.
“군사독재 시절, 무섭고 어두운 이야기를 작가님은 어떻게 그렇게 밝고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80년 5월 26일 밤 계엄군의 강제 진압작전이 임박한 시점에서 광주YWCA에서 위험하니 집으로 가라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발을 내딛는 순간, 등뒤에서 총소리가 들렸다는 작가님의 표현이 정말 비장하고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반짝이는 질문 속에 건강한 다음 세대가 엿보인다. 광주의 역사와 정신이 세대를 이어 얼마든지 잘 기억되고 기록되고 계승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BTS의 K팝처럼 강력하진 않지만 잔잔한 세대 공감이다.
역시 문제는 스토리와 콘텐츠다. 콘텐츠 없이는 역사도 미래도 없다. 천년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콘텐츠가 광주를 살리는 원동력이다. ‘양림동 소녀’는 그 중 압권이다. 2023년 겨울은 ‘양림동 소녀’로 인해 가슴이 따뜻해진다. 오랜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를때 처럼 괜히 가슴이 뛰고 설렌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양림동 소녀와 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 아닐까.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우리도 각자 스토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때 함께 꿨던 꿈이 한낱 헛되지 않았노라고. 역행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신냉전 극복, 평화통일의 갈망과 의지가 여전히 오늘을 살게 하는 동력이라고 마음껏 소리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