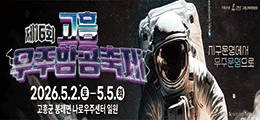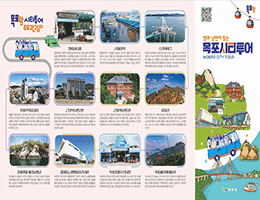저항의 축제 해방의 불꽃, 시위 - 송찬섭 외 지음
68혁명·촛불항쟁은 현재진행형의 역사다
 촛불집회는 ‘촛불’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급진성으로 정치를 새롭게 정의했다. 지난 2017년 3월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촛불집회. <광주일보DB> |
“…이에 조선 팔도가 마음을 합하고 수많은 인민이 뜻을 모아 의로운 깃발(義旗)을 들어 보국안민할 것이다. 이를 죽음으로써 맹세하는 바이다.”
1894년 3월 20일(음력), ‘녹두장군’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총봉기를 알리는 포고문을 발표한다. 진군하는 동학군 대열 선두에는 ‘보국안민창의’(輔國安民倡義)라는 큰 깃발과 인(仁)·의(義)·예(禮)·지(智) 깃발을 세웠다. 또 광대와 재인들이 태평소와 나발, 북을 울렸다. 관군과 일본군이 전투후 노획한 농민군 물품에는 무기류 외에도 어김없이 상당한 분량의 깃발이 있었다. 지금도 시위대 앞에는 깃발과 풍물패가 자리한다. 시대가 흘러도 시위 현장에는 격문과 구호, 노래, 선전 포스터 등이 함께 한다.
김양식 청주대 영화영상학과 교수는 “깃발이 농민군의 주요한 무기로 역할을 한 것은 그 자체가 농민으로 구성된 군대의 특징을 잘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농민군의 저항문화이자 농민적인 무기 수단이며, 농심을 대변하는 상징물이었다”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경험과 정신은 한국 근현대 역사 발전의 수원지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풀이한다.
신간은 지난 2017년 5~7월 민중의 저항과 혁명의 역사를 ‘시위문화’라는 관점에서 조망했던 ‘역사학연구소와 함께 하는 역사서당’ 강좌 가운데 일부를 글로 다듬어 펴낸 것이다. 송찬섭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명예교수를 비롯한 9명의 필진들이 국내외 주요한 9개의 시위·저항 문화를 살핀다.
국내 사례는 ‘1862년 농민항쟁’(송찬섭 교수)과 ‘동학농민혁명’(김양식 교수), ‘3·1 운동’(김정인 춘천교육대 교수), ‘4월 혁명과 6·3항쟁’(오제연 성균관대 교수), ‘촛불집회’(남영호 신한대 교수)를 들여다본다. 또한 외국의 경우는 ‘파리코뮌’(김종원 경희대 교수)과 ‘러시아 혁명’(황동하 전북대 교수), ‘스페인 내전’(이원근 하와이대 교수), ‘68혁명’(정대성 부산대 교수)을 다룬다. 저자들은 운동사 또는 혁명사 연구라기보다 ‘격정의 역사’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을 시도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민초들이 중심이 된 시위·집회는 역사의 물길을 바꿨다. 송 교수는 신간 ‘머리말’에서 “시위문화란 시위대가 상징적 행위, 곧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 적의 상징을 불태우거나 부수는 것, 자신의 요구를 적은 신문과 팸플릿 등을 배포하는 것 등으로 집단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실천하며 그 과정에서 시위의 대의를 경험해 나가는 것”이라며 “시위문화는 시위의 동력이자 중요한 무기였다”고 밝힌다. 지난 2008년과 2016~2017년 진행됐던 촛불집회에 대한 남영호 교수의 해석이 새롭다. 저자는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정치의 새로움은, 정치를 새로 정의하는 새로움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가 대중 사이에서 다시금 의미를 획득하는 새로움이다”고 분석한다.
‘68혁명과 시위문화’를 집필한 정대성 교수는 “논쟁이 있어야 역사도, 현재를 둘러싼 희망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말을 들어 “68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생생한 현재의 준거이다. 68은 빛나는 열정과 혁명적 상상력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 오늘을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한 ‘현재진행형의 역사’다”라고 강조한다.
시위·저항 문화로 살펴본 ‘촛불집회’와 ‘68혁명’ 등은 독자들에게 보다 생동감을 안겨준다. 19~20세기의 격랑을 헤쳐나오려 애쓴 역사속 민초들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서해문집·2만4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1894년 3월 20일(음력), ‘녹두장군’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총봉기를 알리는 포고문을 발표한다. 진군하는 동학군 대열 선두에는 ‘보국안민창의’(輔國安民倡義)라는 큰 깃발과 인(仁)·의(義)·예(禮)·지(智) 깃발을 세웠다. 또 광대와 재인들이 태평소와 나발, 북을 울렸다. 관군과 일본군이 전투후 노획한 농민군 물품에는 무기류 외에도 어김없이 상당한 분량의 깃발이 있었다. 지금도 시위대 앞에는 깃발과 풍물패가 자리한다. 시대가 흘러도 시위 현장에는 격문과 구호, 노래, 선전 포스터 등이 함께 한다.
 |
국내외를 막론하고 민초들이 중심이 된 시위·집회는 역사의 물길을 바꿨다. 송 교수는 신간 ‘머리말’에서 “시위문화란 시위대가 상징적 행위, 곧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 적의 상징을 불태우거나 부수는 것, 자신의 요구를 적은 신문과 팸플릿 등을 배포하는 것 등으로 집단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실천하며 그 과정에서 시위의 대의를 경험해 나가는 것”이라며 “시위문화는 시위의 동력이자 중요한 무기였다”고 밝힌다. 지난 2008년과 2016~2017년 진행됐던 촛불집회에 대한 남영호 교수의 해석이 새롭다. 저자는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정치의 새로움은, 정치를 새로 정의하는 새로움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가 대중 사이에서 다시금 의미를 획득하는 새로움이다”고 분석한다.
‘68혁명과 시위문화’를 집필한 정대성 교수는 “논쟁이 있어야 역사도, 현재를 둘러싼 희망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말을 들어 “68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생생한 현재의 준거이다. 68은 빛나는 열정과 혁명적 상상력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 오늘을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한 ‘현재진행형의 역사’다”라고 강조한다.
시위·저항 문화로 살펴본 ‘촛불집회’와 ‘68혁명’ 등은 독자들에게 보다 생동감을 안겨준다. 19~20세기의 격랑을 헤쳐나오려 애쓴 역사속 민초들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서해문집·2만4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