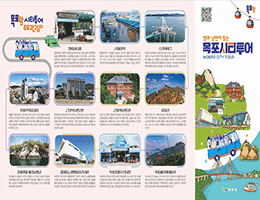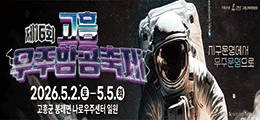독립운동의 시발점, 동학농민혁명- 송기동 예향부장 ·편집국 부국장
 |
“무릇(夫)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7177호에 의하여 백여 년 동안 악명 받아 구천에서 맴돌았을 원혼들에게 설원(雪寃)의 시대를 맞아서 먼저 참혹하게 살상당하신 영령에게 삼가 명목을 빌며 유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최근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에 자리한 청천재(淸川齋)를 찾았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서남부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대접주 배상옥(규인) 장군이 집강소를 열었다고 알려진 공간이다. 안쪽 벽면에는 ‘답통문’(答通文)이 걸려 있다. 무안 향교와 달성 배씨 무안 도문중(都文中)이 지난 2007년 9월에 배상옥 장군 위패를 사당(청천사)에 추배(追配)하면서 올린 글귀이다. 회복을 ‘돌아올 회’(回) 대신 ‘넓을 회’(恢)를 사용했다. 또 ‘원통한 사정을 풀어 없앤다’는 의미의 ‘설원’과 이어지는 문장에서 항왜(抗倭)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현존하는 배상옥 장군 무안 집강소
“한마디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항왜(抗倭) 3·1 독립만세운동으로 이어져 오늘에 정의롭고 자유로운 민주 국가의 영광을 안겨준 역사적 의의가 높은 애국 보국안민의 단성(丹誠)이었음을 절감하면서….”
배상옥 장군의 뜨거웠던 삶의 발자취를 현 시점에서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목포시 대양동(당시 무안현 삼향면 대월리) 생가 터는 무성한 풀과 나무로 뒤덮여 있다. 아무런 표지석이나 안내판도 세워져 있지 않았다. 골목길에서 마주친 주민에게 물어보아도 모른다고 했다. 장군이 뱃길로 창포만을 가로질러 동학농민군 훈련장이 있던 무안군 해제면 석용리 ‘민대들’ 등지로 오갔다던 포구인 ‘창포 바우백이’도 마찬가지다. 간척 사업의 영향으로 지형이 바뀌어 포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집강소로 쓰였던 청천재에서 배상옥 장군과 동학농민군의 숨결을 희미하게 나마 느낄 수 있었다.
앞서 ‘민대들에 삼의사(三義士) 비를 세운 까닭은’(광주일보 5월 3일자 참조)을 통해 무안 동학 지도자 ‘삼의사’(최장현·선현·기현)와 ‘김응문·효문·자문과 아들 김여정’ 그리고 무안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동학에 대해 다시 쓰게 된 까닭은 전남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사와 지도자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자성 때문이다.
129년 전인 1894년으로 시계를 돌려 보자. 그해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2월 고부 민란→4월 무장 기포(起包: 농민군이 동학의 조직인 포(包)를 중심으로 하여 봉기한 것)→5월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를 거쳐 6월 11일(음력 5월 8일) 전주 화약을 맺는다. 무안 청천재에 집강소가 마련된 때도 이즈음이다.
그런데 동학군 진압을 핑계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조선 땅에 상륙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는다. 일본군은 7월에 경복궁을 점령하고 친일 내각을 구성한 데 이어 청일전쟁을 일으킨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동학농민군은 10월 20일(음력 9월 18일) 전북 삼례에 집결한다.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이다. 배상옥 장군을 비롯한 2000여명의 무안 농민군들이 참여했다.
한양으로 진격하던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경군과 일본군의 화력에 밀려 피눈물을 흘렸다. 바다쪽에서 들어오는 일본군의 배후 공격을 예상해 무안으로 다시 돌아왔던 배상옥 장군 병력 또한 12월 ‘고막포 전투’에서 크게 패했다. 그리고 해남으로 피신했던 장군은 주민 밀고로 붙잡혀 일본군에 의해 현장에서 총살됐다.
2차 기포 농민군 독립 유공자 예우를
“상옥아 상옥아 배상옥아/ 백만 군대 어디 두고/ 쑥국대 밑에서 잠드느뇨.” 관군이 ‘호남 하도 거괴’(下道巨魁)라고 불렀던 배상옥 장군이 큰 뜻을 펴지 못하고 일본군에 의해 억울한 죽임을 당한 후 무안에서 불려진 노래라고 한다.
최근 2차 기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1895년 10월 명성황후가 시해된 뒤 일어난 을미의병부터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학연구자인 박맹수 전 원광대 총장은 이렇게 반박한다.
“을미의병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20~30년 전 사료가 발견되기 전 낡은 이론이다. 전봉준 장군의 공초(供草)와 일본군 토벌 대장의 문서, 일본군 병사의 종군기 등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명백히 항일 봉기다. 이제는 의견을 수렴할 시점이 왔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29주기였다. 국가보훈부는 2차 기포한 동학농민군에 대한 예우를 격상해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 당시 동학농민군은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선 의병이기도 했다. 항일 투쟁과 독립 운동의 출발점이다.
/song@kwangju.co.kr
최근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에 자리한 청천재(淸川齋)를 찾았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서남부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대접주 배상옥(규인) 장군이 집강소를 열었다고 알려진 공간이다. 안쪽 벽면에는 ‘답통문’(答通文)이 걸려 있다. 무안 향교와 달성 배씨 무안 도문중(都文中)이 지난 2007년 9월에 배상옥 장군 위패를 사당(청천사)에 추배(追配)하면서 올린 글귀이다. 회복을 ‘돌아올 회’(回) 대신 ‘넓을 회’(恢)를 사용했다. 또 ‘원통한 사정을 풀어 없앤다’는 의미의 ‘설원’과 이어지는 문장에서 항왜(抗倭)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한마디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항왜(抗倭) 3·1 독립만세운동으로 이어져 오늘에 정의롭고 자유로운 민주 국가의 영광을 안겨준 역사적 의의가 높은 애국 보국안민의 단성(丹誠)이었음을 절감하면서….”
앞서 ‘민대들에 삼의사(三義士) 비를 세운 까닭은’(광주일보 5월 3일자 참조)을 통해 무안 동학 지도자 ‘삼의사’(최장현·선현·기현)와 ‘김응문·효문·자문과 아들 김여정’ 그리고 무안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동학에 대해 다시 쓰게 된 까닭은 전남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사와 지도자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자성 때문이다.
129년 전인 1894년으로 시계를 돌려 보자. 그해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2월 고부 민란→4월 무장 기포(起包: 농민군이 동학의 조직인 포(包)를 중심으로 하여 봉기한 것)→5월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를 거쳐 6월 11일(음력 5월 8일) 전주 화약을 맺는다. 무안 청천재에 집강소가 마련된 때도 이즈음이다.
그런데 동학군 진압을 핑계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조선 땅에 상륙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는다. 일본군은 7월에 경복궁을 점령하고 친일 내각을 구성한 데 이어 청일전쟁을 일으킨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동학농민군은 10월 20일(음력 9월 18일) 전북 삼례에 집결한다.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이다. 배상옥 장군을 비롯한 2000여명의 무안 농민군들이 참여했다.
한양으로 진격하던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경군과 일본군의 화력에 밀려 피눈물을 흘렸다. 바다쪽에서 들어오는 일본군의 배후 공격을 예상해 무안으로 다시 돌아왔던 배상옥 장군 병력 또한 12월 ‘고막포 전투’에서 크게 패했다. 그리고 해남으로 피신했던 장군은 주민 밀고로 붙잡혀 일본군에 의해 현장에서 총살됐다.
2차 기포 농민군 독립 유공자 예우를
“상옥아 상옥아 배상옥아/ 백만 군대 어디 두고/ 쑥국대 밑에서 잠드느뇨.” 관군이 ‘호남 하도 거괴’(下道巨魁)라고 불렀던 배상옥 장군이 큰 뜻을 펴지 못하고 일본군에 의해 억울한 죽임을 당한 후 무안에서 불려진 노래라고 한다.
최근 2차 기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1895년 10월 명성황후가 시해된 뒤 일어난 을미의병부터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학연구자인 박맹수 전 원광대 총장은 이렇게 반박한다.
“을미의병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20~30년 전 사료가 발견되기 전 낡은 이론이다. 전봉준 장군의 공초(供草)와 일본군 토벌 대장의 문서, 일본군 병사의 종군기 등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명백히 항일 봉기다. 이제는 의견을 수렴할 시점이 왔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29주기였다. 국가보훈부는 2차 기포한 동학농민군에 대한 예우를 격상해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 당시 동학농민군은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선 의병이기도 했다. 항일 투쟁과 독립 운동의 출발점이다.
/s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