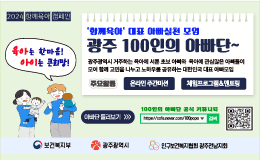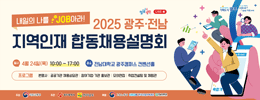‘3고’ 지역 중기 “시한폭탄 안고 산다”
원자재값 상승에 매출 감소
대출금리 올라 상환부담 늘어
대출 문턱 높아져 자금난까지
대출금리 올라 상환부담 늘어
대출 문턱 높아져 자금난까지
 올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대출이 1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시대 지역 중소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광주 하남산단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
“매출이 적자로 돌아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 매달 버티기가 힘듭니다. 회사 운영자금도 부족한데 추가 대출도 어려워 막막하네요.”
광주의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기업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을 받았다.
A씨는 한 시중은행에서 4.5%의 금리로 4억원의 기업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대출금리는 6.5%까지 오르게 됐다. 2%의 금리가 오르면서 매달 상환하던 이자도 200만원에서 280만원 치솟는다.
A씨는 “매출은 떨어지는 데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으로 영업이익률은 그야말로 추락하고 있다”며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고정비 지출 부담이 너무 커졌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추가 대출도 받기 어려워 인건비 주기도 벅차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유통회사 대표 B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그는 얼마 전 신규 사업장 구축과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9억원의 기업대출을 받았다. B씨가 받은 대출의 금리는 5.7%다. 10년 상환으로 3년간 이자만 납부하는 조건이다. 그가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금만 427만원이다. 3년 뒤에는 원금 625만원도 함께 상환해야 한다.
B씨는 “소비가 위축되면서 유통업계의 업황은 악화하는데 대출 이자까지 허리가 휜다”며 “예전이면 3%대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6%에 이른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왔지만 여기서 금리가 또 오르면 정말 답이 없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올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대출이 1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시대 지역 중소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영이 어려워 대출을 받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치솟은 금리로 기업들의 상환 부담은 커지자 중소기업의 채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대출 장벽이 높아지면서 자금난까지 겹친 지역기업들이 자칫 줄도산할 수 있다는 불안도 팽배하다.
1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여신 자료를 보면 지역 중소기업의 예금은행 신규 대출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조108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조7669억원에 비해 19.33%(3416억원) 증가한 것이다.
또 제2금융권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여신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1~8월 누적 신규 대출은 3조2157억원으로, 전년(2조5389억)보다 무려 26.66%(6768억원)이나 늘었다.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모두 더하면 올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1조184억원의 대출을 더 받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중소기업들은 많아지는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자금 경색으로 기업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파악한 지난 9월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87%다. 이는 2개월 전으로 최근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5% 후반에서 6%대로 형성되는 분위기다.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도 악재지만, 시중은행들이 4분기 들어 기업대출 문 턱을 높이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자금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돈 줄이 막히면서 코로나19 이후 빚으로 버텨온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하는 이유기도 하다.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대출 금리가 크게 올라 부실기업 우려가 확산, 최근에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PF 부실 우려로 채권시장마저 경색되자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들의 대출 수요도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기업대출 규모를 관리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기업대출 담당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기업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기업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위험을 관리하고자 심사를 강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자금 경색이 심화되면 신용도가 좋은 대기업과 달리 그렇지 못한 지역의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제2금융권이나 고금리 대출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기업들의 ‘흑자 도산’ 가능성도 있다. 지역 기업들의 체력이 바닥나기 전 숨통을 틔워줄 정책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의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기업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을 받았다.
A씨는 한 시중은행에서 4.5%의 금리로 4억원의 기업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대출금리는 6.5%까지 오르게 됐다. 2%의 금리가 오르면서 매달 상환하던 이자도 200만원에서 280만원 치솟는다.
광주의 한 유통회사 대표 B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그는 얼마 전 신규 사업장 구축과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9억원의 기업대출을 받았다. B씨가 받은 대출의 금리는 5.7%다. 10년 상환으로 3년간 이자만 납부하는 조건이다. 그가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금만 427만원이다. 3년 뒤에는 원금 625만원도 함께 상환해야 한다.
올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대출이 1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시대 지역 중소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영이 어려워 대출을 받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치솟은 금리로 기업들의 상환 부담은 커지자 중소기업의 채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대출 장벽이 높아지면서 자금난까지 겹친 지역기업들이 자칫 줄도산할 수 있다는 불안도 팽배하다.
1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여신 자료를 보면 지역 중소기업의 예금은행 신규 대출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조108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조7669억원에 비해 19.33%(3416억원) 증가한 것이다.
또 제2금융권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여신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1~8월 누적 신규 대출은 3조2157억원으로, 전년(2조5389억)보다 무려 26.66%(6768억원)이나 늘었다.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모두 더하면 올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1조184억원의 대출을 더 받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중소기업들은 많아지는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자금 경색으로 기업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파악한 지난 9월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87%다. 이는 2개월 전으로 최근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5% 후반에서 6%대로 형성되는 분위기다.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도 악재지만, 시중은행들이 4분기 들어 기업대출 문 턱을 높이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자금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돈 줄이 막히면서 코로나19 이후 빚으로 버텨온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하는 이유기도 하다.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대출 금리가 크게 올라 부실기업 우려가 확산, 최근에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PF 부실 우려로 채권시장마저 경색되자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들의 대출 수요도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기업대출 규모를 관리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기업대출 담당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기업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기업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위험을 관리하고자 심사를 강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자금 경색이 심화되면 신용도가 좋은 대기업과 달리 그렇지 못한 지역의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제2금융권이나 고금리 대출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기업들의 ‘흑자 도산’ 가능성도 있다. 지역 기업들의 체력이 바닥나기 전 숨통을 틔워줄 정책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