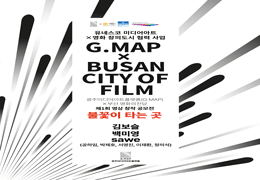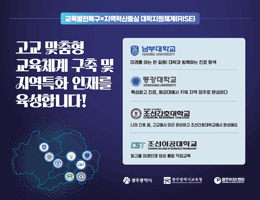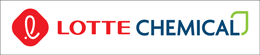옛사랑의 기억-중현 광주 증심사 주지
 |
아주 오랜만에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창을 가득 채운다. 이런 날이 얼마 만인지 기억도 제대로 나질 않는다. 이 아침에 눈부신 햇살을 맞이하며, 어찌된 일인지 지난 과거 내 마음속에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때가 떠오른다.
눈부신 햇살을 핑계 삼아, 시름시름 몸살을 앓고 있는 이 가을에 케케묵어 먼지 풀풀 날리는 사랑들을 하나둘 꺼낸다. 바닥에 스윽 펼쳐 놓고 물끄러미 바라본다. 긴 세월을 건너 다시 본 그것은 어쩌면 우정이었다. 아니면 어떤 것은 행복, 어떤 것은 쓰라린 고통, 어떤 것은 상실, 어떤 것은 좌절, 어떤 것은 연민, 어떤 것은 다만 욕심, 어떤 것은 자아도취, 어떤 것은 책임이었다. 한결같이 세월의 먼지에 삭아서 이게 정녕 사랑이었는지 의아하기만 하다. 왜 나는 그것들에게 사랑이란 라벨을 붙혀서 기억의 창고에 보관했을까?
사랑은 요구르트 같은 것이다. 순수한 사랑은 플레인 요구르트와 같다. 실제 플레인 요구르트만 먹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다. 마트에서 파는 요구르트는 대부분 딸기, 복숭아, 포도 같은 과일이 들어간 것이 많다. 생과일, 견과류, 시리얼, 꿀 같은 것들을 요구르트에 넣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다. 요구르트는 여러 가지를 넣어서 먹는 게 일반적이다. 사랑도 비슷하다. 순수한 사랑을 굳이 말로 하자면 조건 없는 자비심쯤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 맛이 밋밋하기 때문에, 즐거움, 행복, 애뜻함, 쓰라림 같은 감정들이 추가되고, 소유욕이나 권력욕 같은 욕망이 덧씌워지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사랑을 꺼내보면 거기엔 항상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덩그러니 놓여 있곤 한다.
그까짓 사랑 따위에 한 번도 눈이 멀어 보지 않은 이에게 사랑이란 그저 병들어 집착이 되어 버린 정(情)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이라도 정에 사무쳐 본 사람이라면 안다. 정이 깊어지면 사랑이 된다는 것을. 정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 ‘사람’이라는 글자에서 ‘ㅁ’의 모서리가 닳고 닳으면 ‘ㅇ’이 된다. 사람에 시간이 더해지면 곧 사랑이다. 사람에게 사랑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게 사랑이라고 했다. 사랑 타령만 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고 하면서도 인간은 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지치지도 않고 사랑타령을 하고 있다.
어떤 경험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알 수 있다. 즐거운 감정이든 고통스러운 감정이든 상관없이, 인간은 같은 감정을 무수히 반복하여 경험한다. 같은 감정을 무수히 반복하면서도 마치 처음 당하는 듯 받아들인다. 말이 안되는데 사실이다. 지긋지긋한 반복이 하염없이 이어지던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각성이 찾아오곤 한다. ‘이런 감정 분명히 전에도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먼발치에서 물끄러미 바라본다. 오늘 아침 내가 발견한 것은 집착, 소유욕, 소유할 수 없는 것을 향한 헛된 욕망, 그런 욕망이 빗어내는 끝도 없는 고통. 그런 것들이었다. 파란만장했던 개인사가 겨우 몇 마디의 무미건조한 단어와 그런 단어들의 조합으로 쉽게 치환되어 버린다. 이 역시 아침 햇살이 너무도 눈부신 탓일게다. 비록 한때나마 내 속에서 눈보라를 휘몰아치게 했던 시간들이었지만, 이미 낡은 추억이 되어 버렸다.
기운을 잃은 나비 한 마리가 마루 바닥에서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고 있다. 호랑이 눈을 연상케 하는 나비의 날개 무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어린 왕자가 사랑했던 장미의 가시같다. 나이가 들면 한 걸음 물러서 삶을 바라보는 신중함이 생긴다. 청춘의 뜨거운 열정에 대한 세월의 보상이다. 아쉬운대로 고마운 선물이다. 덕분에 나비는 나비로 장미는 장미로 보일 뿐, 그뿐이다. 사랑도 그저 집착이 된 정, 그뿐이다.
과거는 아름답고 소중하고 명료하다. 그래서 몇 마디의 말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제아무리 허접하고 별 볼 일 없고 치사하고 사소할지라도, 모호하고 설명하기 힘들다. 현재가 아닌 삶은 몇 마디의 단어, 흐릿한 이미지에 불과하다. 오직 현재만이 영원하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날씨가 좋다. 뭐라도 해야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에 덜 미안할 것 같아, 아무 글이나 손이 가는 대로 써 보았다.
눈부신 햇살을 핑계 삼아, 시름시름 몸살을 앓고 있는 이 가을에 케케묵어 먼지 풀풀 날리는 사랑들을 하나둘 꺼낸다. 바닥에 스윽 펼쳐 놓고 물끄러미 바라본다. 긴 세월을 건너 다시 본 그것은 어쩌면 우정이었다. 아니면 어떤 것은 행복, 어떤 것은 쓰라린 고통, 어떤 것은 상실, 어떤 것은 좌절, 어떤 것은 연민, 어떤 것은 다만 욕심, 어떤 것은 자아도취, 어떤 것은 책임이었다. 한결같이 세월의 먼지에 삭아서 이게 정녕 사랑이었는지 의아하기만 하다. 왜 나는 그것들에게 사랑이란 라벨을 붙혀서 기억의 창고에 보관했을까?
어떤 경험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알 수 있다. 즐거운 감정이든 고통스러운 감정이든 상관없이, 인간은 같은 감정을 무수히 반복하여 경험한다. 같은 감정을 무수히 반복하면서도 마치 처음 당하는 듯 받아들인다. 말이 안되는데 사실이다. 지긋지긋한 반복이 하염없이 이어지던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각성이 찾아오곤 한다. ‘이런 감정 분명히 전에도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먼발치에서 물끄러미 바라본다. 오늘 아침 내가 발견한 것은 집착, 소유욕, 소유할 수 없는 것을 향한 헛된 욕망, 그런 욕망이 빗어내는 끝도 없는 고통. 그런 것들이었다. 파란만장했던 개인사가 겨우 몇 마디의 무미건조한 단어와 그런 단어들의 조합으로 쉽게 치환되어 버린다. 이 역시 아침 햇살이 너무도 눈부신 탓일게다. 비록 한때나마 내 속에서 눈보라를 휘몰아치게 했던 시간들이었지만, 이미 낡은 추억이 되어 버렸다.
기운을 잃은 나비 한 마리가 마루 바닥에서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고 있다. 호랑이 눈을 연상케 하는 나비의 날개 무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어린 왕자가 사랑했던 장미의 가시같다. 나이가 들면 한 걸음 물러서 삶을 바라보는 신중함이 생긴다. 청춘의 뜨거운 열정에 대한 세월의 보상이다. 아쉬운대로 고마운 선물이다. 덕분에 나비는 나비로 장미는 장미로 보일 뿐, 그뿐이다. 사랑도 그저 집착이 된 정, 그뿐이다.
과거는 아름답고 소중하고 명료하다. 그래서 몇 마디의 말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제아무리 허접하고 별 볼 일 없고 치사하고 사소할지라도, 모호하고 설명하기 힘들다. 현재가 아닌 삶은 몇 마디의 단어, 흐릿한 이미지에 불과하다. 오직 현재만이 영원하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날씨가 좋다. 뭐라도 해야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에 덜 미안할 것 같아, 아무 글이나 손이 가는 대로 써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