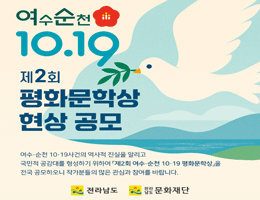[책과 세상] 꽃들에게서 지혜를 얻다
혹한이 계속되고 있다. 라니냐현상으로 올 겨울은 기습한파가 잦고 눈이 많이 올 거라고 한다. 그러나 백두산 꼭대기의 툰드라만 할까. 두세 달 정도만 10도 이하의 영상 기온을 유지하고 나머지 기간 내내 영하 20∼30도를 오르내리는 동토의 땅, 툰드라. 그래서 툰드라는 러시아어로 ‘나무가 없는 땅’이라는 뜻이라고 하지 않던가.
하지만 그런 땅에서도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사방에서 휘몰아치는 초속 15∼35m의 강풍과 혹한, 수시로 하늘을 뒤덮는 검은 구름과 안개, 밤톨 크기의 우박 등으로 끊임없이 생명을 위협받으면서도, 두세 달 정도의 짧은 성장기간에 후손을 남기기 위해 부단히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가는 식물들이 있다.
나는 갑자기 생각이 막힐 때 종종 ‘식물의 살아남기’(이성규 글·김정명 사진, 대원사 2003)라는 책을 집어 든다. 거기에는 백두산 툰드라에서 서식하는 식물들과 그들의 삶과 사랑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기록되어 있다. 그 과정은 눈물겹지만 그네들의 수많은 전략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그 지혜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숭고하기까지 하다.
대표적 전략 몇 개만 살펴보자. 첫째, 대부분의 식물들이 10cm 이하로 키를 낮춘다. 바람에 저항하고 차가운 기온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이불처럼 따스한 눈에 덮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여럿이 뭉쳐 카펫이나 쿠션 모양의 집단을 이룬다. 방향 없이 수시로 불어오는 거친 바람을 쉽게 분산시키고, 밀집함으로써 보온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백두산에서 넓은 밭을 이룬 야생화 군락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잎을 가늘거나 작게 하고 지표면에 가깝게 뻗어나간다. 이 역시 바람을 가르고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이다.
넷째, 식물 스스로 추위에 생리적으로 저항하여 잎 속에 부동액을 만들어 추위를 견디고 동결을 막는다. 노란만병초의 푸른 잎을 떠올려 보라.
다섯째, 꽃의 색깔을 선명하고 짙게 한다. 생장기간이 짧은 만큼 꽃가루받이를 위해 곤충을 빨리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백두산 야생화가 여느 꽃들보다 그토록 아름다운 것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네들의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툰드라 식물의 공통된 전략일 뿐 식물 하나하나의 독특한 전략을 살펴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기까지 한다. 두메양귀비는 꽃잎이 하늘하늘해서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다. 그러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꽃잎을 꼭 오므리고 꽃대를 숙인다. 심한 바람이 불 때는 반대 방향으로 180도 꽃대를 돌려 바람을 피한다. 아기가 태어나도록 해줄 꽃가루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눈밭 속에서 피어나는 복수초는 자신이 방출한 열이 주변의 온도보다 5도 이상 높아 눈을 뚫고 일찍 꽃을 피울 수 있다. 주변의 식물들이 나오기 전에 일찍 서둘러 꽃을 피우고 생을 마쳐 경쟁을 피하고 안전하게 후손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성장 시기를 달리하는 틈새 전략을 활용해 경쟁을 피하는 식물의 대표적 성공 사례이다.
꽃의 색깔이나 모양, 냄새, 무늬, 이 모든 것은 식물이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니다. 수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단히 변화해온 결과의 모습이다. 암수 결합의 목적 역시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우수한 후손을 만들고 퍼뜨리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은 동물보다 훨씬 면밀하게 기획된 성 체계를 이루고 있다.
식물들 또한 인간 사회 못지않게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러나 인간처럼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이겨내고 오랜 세월 자신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 비록 두뇌는 없지만 끊임없이 생존 전략을 짜내고 그 전략을 실천하는 그네들에게서 오늘도 나는 지혜를 얻는다.
/강맑실 사계절출판사 대표
나는 갑자기 생각이 막힐 때 종종 ‘식물의 살아남기’(이성규 글·김정명 사진, 대원사 2003)라는 책을 집어 든다. 거기에는 백두산 툰드라에서 서식하는 식물들과 그들의 삶과 사랑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기록되어 있다. 그 과정은 눈물겹지만 그네들의 수많은 전략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그 지혜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숭고하기까지 하다.
둘째, 여럿이 뭉쳐 카펫이나 쿠션 모양의 집단을 이룬다. 방향 없이 수시로 불어오는 거친 바람을 쉽게 분산시키고, 밀집함으로써 보온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백두산에서 넓은 밭을 이룬 야생화 군락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잎을 가늘거나 작게 하고 지표면에 가깝게 뻗어나간다. 이 역시 바람을 가르고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이다.
넷째, 식물 스스로 추위에 생리적으로 저항하여 잎 속에 부동액을 만들어 추위를 견디고 동결을 막는다. 노란만병초의 푸른 잎을 떠올려 보라.
다섯째, 꽃의 색깔을 선명하고 짙게 한다. 생장기간이 짧은 만큼 꽃가루받이를 위해 곤충을 빨리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백두산 야생화가 여느 꽃들보다 그토록 아름다운 것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네들의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툰드라 식물의 공통된 전략일 뿐 식물 하나하나의 독특한 전략을 살펴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기까지 한다. 두메양귀비는 꽃잎이 하늘하늘해서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다. 그러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꽃잎을 꼭 오므리고 꽃대를 숙인다. 심한 바람이 불 때는 반대 방향으로 180도 꽃대를 돌려 바람을 피한다. 아기가 태어나도록 해줄 꽃가루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눈밭 속에서 피어나는 복수초는 자신이 방출한 열이 주변의 온도보다 5도 이상 높아 눈을 뚫고 일찍 꽃을 피울 수 있다. 주변의 식물들이 나오기 전에 일찍 서둘러 꽃을 피우고 생을 마쳐 경쟁을 피하고 안전하게 후손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성장 시기를 달리하는 틈새 전략을 활용해 경쟁을 피하는 식물의 대표적 성공 사례이다.
꽃의 색깔이나 모양, 냄새, 무늬, 이 모든 것은 식물이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니다. 수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단히 변화해온 결과의 모습이다. 암수 결합의 목적 역시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우수한 후손을 만들고 퍼뜨리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은 동물보다 훨씬 면밀하게 기획된 성 체계를 이루고 있다.
식물들 또한 인간 사회 못지않게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러나 인간처럼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이겨내고 오랜 세월 자신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 비록 두뇌는 없지만 끊임없이 생존 전략을 짜내고 그 전략을 실천하는 그네들에게서 오늘도 나는 지혜를 얻는다.
/강맑실 사계절출판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