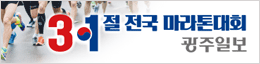사라지는 자의 영원성 -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
새해의 결심은 ‘익숙함’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새해인사를 나눈 것이 엊그제인데 벌써 1월 하순에 접어들었다. 세웠던 원대한 계획과 다짐들은 아직도 살아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매년 더 나은 삶, 변화된 삶을 꿈꾸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의 익숙함과 편안함 속으로 기를 쓰고 되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변화가 이토록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는 이유 자체가 ‘이전의 나’를 바꾸기보다 ‘더 잘난 나’를 유지하고 확장시키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유혹한다. 광활한 우주 속에 ‘나’라는 존재를 각인시키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현대인의 숙명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나를 증명하려는 각별한 노력은 때론 우리를 고립시킨다.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삶은 고달프고 외로우며 진정한 평화는 멀어지는 것 같다.
존재 자체가 소리가 되어 사라지면서 길을 만들어 놓은 예언자, 세례자 요한이 떠오른다. 성경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았음에도 스스로 무대 뒤로 사라지기를 선택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며 앞으로 오실 구원자의 길을 준비했던 예언자였다. 당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물론 일반인과 지식인 그리고 기득권층 조차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가 혹시 자신들이 기다려 온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정도였다.
만약 그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화려한 인기와 추종 세력을 향해 조금만 욕심을 냈었다면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한 찬사를 단호하게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요한 복음 3,30)고 말하며 거절한다.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소리일 뿐임을 명확히 알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는 메시아라는 빛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를 그림자 속으로 감추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삶과 하느님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진 놀라운 역설을 만나게 된다. 세상의 논리는 ‘가진 자가 이기고, 드러내는 자가 기억된다’고 말하지만 신앙의 논리는 ‘내어주는 자가 얻고, 사라지는 자가 영원하다’고 가르친다. 결국 세례자 요한은 사라지는 사람이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표시하고 사라진 사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기꺼이 잊히기를 선택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사라짐으로써 가장 온전하게 자신을 드러냈던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지워버렸고 지워버린 자리에 창조주의 거룩한 뜻을 가득 채웠다.
그의 삶은 어리석어 보였다. 그러나 이 거룩한 바보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은총과 기쁨의 원천이다. 나를 낮추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는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의 실현, 존재의 확장이다. 내가 비워질 때 비로소 하느님의 신비가 내 삶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우리의 삶 또한 세례자 요한의 사명과 닮아있다. 이 혹독하고 메마른 세상의 광야에서 누군가가 사랑과 희망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숭고한 역할이다. ‘사라진다’는 말은 결코 염세적이거나 허무한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해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겸손이며 더 큰 가치를 위해 나를 봉헌하는 용기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신을 지우며 헌신할 때 그 사랑이 자녀의 생명 안에 영원히 남듯,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을 세상과 하늘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사라짐’은 곧 ‘영원한 현존’의 다른 이름이다. 올 한 해, 나를 드러내려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사라질 줄 아는 ‘소리’가 되어보자.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만약 그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화려한 인기와 추종 세력을 향해 조금만 욕심을 냈었다면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한 찬사를 단호하게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요한 복음 3,30)고 말하며 거절한다.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소리일 뿐임을 명확히 알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는 메시아라는 빛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를 그림자 속으로 감추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삶과 하느님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진 놀라운 역설을 만나게 된다. 세상의 논리는 ‘가진 자가 이기고, 드러내는 자가 기억된다’고 말하지만 신앙의 논리는 ‘내어주는 자가 얻고, 사라지는 자가 영원하다’고 가르친다. 결국 세례자 요한은 사라지는 사람이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표시하고 사라진 사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기꺼이 잊히기를 선택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사라짐으로써 가장 온전하게 자신을 드러냈던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지워버렸고 지워버린 자리에 창조주의 거룩한 뜻을 가득 채웠다.
그의 삶은 어리석어 보였다. 그러나 이 거룩한 바보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은총과 기쁨의 원천이다. 나를 낮추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는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의 실현, 존재의 확장이다. 내가 비워질 때 비로소 하느님의 신비가 내 삶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우리의 삶 또한 세례자 요한의 사명과 닮아있다. 이 혹독하고 메마른 세상의 광야에서 누군가가 사랑과 희망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숭고한 역할이다. ‘사라진다’는 말은 결코 염세적이거나 허무한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해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겸손이며 더 큰 가치를 위해 나를 봉헌하는 용기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신을 지우며 헌신할 때 그 사랑이 자녀의 생명 안에 영원히 남듯,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을 세상과 하늘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사라짐’은 곧 ‘영원한 현존’의 다른 이름이다. 올 한 해, 나를 드러내려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사라질 줄 아는 ‘소리’가 되어보자.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