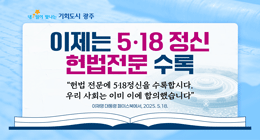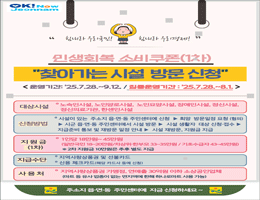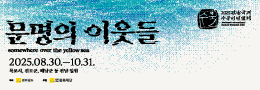‘남도의 유관순’ 윤형숙…불꽃같은 삶 무대에
1919년 3·10 광주 만세운동 선두에 선 어린 여학생
일본 헌병 칼날에 왼팔 잘리고 모진 고문에 눈도 잃어
항일운동·여성 계몽·문맹 퇴치운동 앞장 ‘조선의 혈녀’
여수연극협회 ‘그날, 그녀는 불꽃이 되었다’…15일 여수 시민회관
연극·음악·퍼포먼스 어우러진 총체극…‘격동의 현장’ 몰입감 선사
일본 헌병 칼날에 왼팔 잘리고 모진 고문에 눈도 잃어
항일운동·여성 계몽·문맹 퇴치운동 앞장 ‘조선의 혈녀’
여수연극협회 ‘그날, 그녀는 불꽃이 되었다’…15일 여수 시민회관
연극·음악·퍼포먼스 어우러진 총체극…‘격동의 현장’ 몰입감 선사
 윤형숙 열사 |
“나는 조선의 혈녀(血女)다.”
1919년 3·10 광주 만세운동의 선두에 한 어린 여학생이 있었다. 바로 윤형숙 열사. 시위 도중 일본 헌병의 칼날에 왼팔이 잘려나갔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 오른손으로 태극기를 높이 치켜들고, 더욱 우렁차게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팔을 잃고, 눈을 잃고도 꺾이지 않았던 그날의 불꽃 같은 외침이 106년 만에 무대 위에서 되살아난다.
여수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 윤형숙(1900~1950) 열사의 삶을 그린 총체극 ‘그날, 그녀는 불꽃이 되었다’가 오는 15일 오후 4시 여수 시민회관 무대에 오른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동안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무대다.
이번 작품은 여수연극협회와 극단 예술마당이 공동주최하고, 강남진 백제예술대 교수가 연출을 맡았다.
윤형숙 열사는 여수 화양면에서 태어나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친척과 변요한 선교사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갔다. 광주 수피아여학교에 진학한 그는 박애순 교사에게 민족교육을 배우며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1919년 3월, 3·1운동의 함성이 전국을 울리던 시기, 윤 열사는 박 교사와 동지 학생들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며 거사에 나섰다.
3월 10일 광주 장날. 인파가 붐비는 장터에서 태극기를 높이 든 윤형숙은 시위대의 맨 앞에 섰다. 그 순간 일본 헌병이 군도를 휘둘러 왼팔이 잘려나가는 참변이 벌어졌다.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그는 곧 일어나 오른손에 태극기를 움켜쥐고, 오히려 더 크게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체포된 뒤 “배후가 누구냐”는 거듭된 추궁에도 “나는 보다시피 피를 흘리는 조선의 혈녀다”라며 당당히 맞섰다.
혹독한 옥고와 고문으로 결국 오른쪽 눈까지 잃었지만, 윤 열사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출옥 후에도 그는 ‘혈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항일운동과 여성 계몽, 문맹 퇴치 운동에 앞장섰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하며 학생들과 연대했고, 원산·고창·여수 등지에서 교사와 전도사로 활동했다. ‘외팔·외눈박이 전도사’로 불리던 그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독립정신을 전파했다.
그러나 그의 삶은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1950년 9월 서울이 수복되던 날 전도사라는 이유로 인민군에게 체포된 그는 손양원 목사와 함께 여수 둔덕동 과수원에서 총살됐다. 정부는 2004년 그의 공훈을 기려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이번 공연은 이러한 윤형숙 열사의 치열한 생애를 무대 위에 되살린다. 무대는 그녀가 생을 마감하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며 어떤 폭력과 억압도 꺾을 수 없었던 신념과 용기를 담아낸다. 어린 시절 “여자도 배워야 한다”는 어머니의 당부를 품고 배움의 길을 걷던 소녀가 민족교육의 뜻을 깨닫고 독립운동의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지는 장면,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어린 학생들을 깨우치는 장면을 통해 여성도 민족 해방의 주체가 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작품은 연극·음악·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총체극 형식으로, 단순한 전기극을 넘어 역사와 감정을 입체적으로 풀어낸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장면 전환, 상징적인 퍼포먼스와 무대 장치는 관객으로 하여금 100여 년 전 격동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시위 장면에서는 웅장한 군중 합창과 북소리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옥중 장면에서는 절제된 조명과 음악이 인물의 내면을 비춘다.
여수연극협회 양은순 지부장은 “윤형숙 열사는 여성 독립운동가로서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이번 무대를 통해 그 고귀한 정신이 오늘의 관객들에게 생생히 전달되고, 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자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에서 태어나 지역을 위해 싸운 인물이 이렇게 재조명되는 일은 지역민의 자긍심을 세우는 중요한 문화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1919년 3·10 광주 만세운동의 선두에 한 어린 여학생이 있었다. 바로 윤형숙 열사. 시위 도중 일본 헌병의 칼날에 왼팔이 잘려나갔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 오른손으로 태극기를 높이 치켜들고, 더욱 우렁차게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팔을 잃고, 눈을 잃고도 꺾이지 않았던 그날의 불꽃 같은 외침이 106년 만에 무대 위에서 되살아난다.
이번 작품은 여수연극협회와 극단 예술마당이 공동주최하고, 강남진 백제예술대 교수가 연출을 맡았다.
윤형숙 열사는 여수 화양면에서 태어나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친척과 변요한 선교사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갔다. 광주 수피아여학교에 진학한 그는 박애순 교사에게 민족교육을 배우며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1919년 3월, 3·1운동의 함성이 전국을 울리던 시기, 윤 열사는 박 교사와 동지 학생들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며 거사에 나섰다.
혹독한 옥고와 고문으로 결국 오른쪽 눈까지 잃었지만, 윤 열사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출옥 후에도 그는 ‘혈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항일운동과 여성 계몽, 문맹 퇴치 운동에 앞장섰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하며 학생들과 연대했고, 원산·고창·여수 등지에서 교사와 전도사로 활동했다. ‘외팔·외눈박이 전도사’로 불리던 그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독립정신을 전파했다.
그러나 그의 삶은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1950년 9월 서울이 수복되던 날 전도사라는 이유로 인민군에게 체포된 그는 손양원 목사와 함께 여수 둔덕동 과수원에서 총살됐다. 정부는 2004년 그의 공훈을 기려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양은순 배우와 남경읍 배우 |
작품은 연극·음악·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총체극 형식으로, 단순한 전기극을 넘어 역사와 감정을 입체적으로 풀어낸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장면 전환, 상징적인 퍼포먼스와 무대 장치는 관객으로 하여금 100여 년 전 격동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시위 장면에서는 웅장한 군중 합창과 북소리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옥중 장면에서는 절제된 조명과 음악이 인물의 내면을 비춘다.
여수연극협회 양은순 지부장은 “윤형숙 열사는 여성 독립운동가로서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이번 무대를 통해 그 고귀한 정신이 오늘의 관객들에게 생생히 전달되고, 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자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에서 태어나 지역을 위해 싸운 인물이 이렇게 재조명되는 일은 지역민의 자긍심을 세우는 중요한 문화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