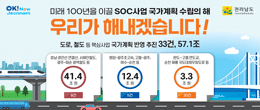석아·오방·의재의 무등산과 광주정신 - 이병훈 제21대 국회의원,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
무등의 숲이 짙다. 뛰어난 인재는 땅의 신령스러움에서 난다 했고, 무등산이 그 땅임을 호남인은 굳게 믿었다. ‘인걸지령무등산(人傑地靈無等山)’이라 하지 않았던가.
호남과 광주를 지칭할 때 구국, 예술, 봉사와 희생 같은 말들을 먼저 떠올린다. 근대기 호남의 역사에는 동학혁명,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5·18과 같은 굵직하면서도 이 대지를 굳건하게 지켜온 거대한 정신적 에너지들의 원천이 존재한다. 그보다 훨씬 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지키며 근거지로 삼았고, 결국 나라를 살려낸 곳이기도 하다. 문화적으로는 남종화와 판소리 그리고 다도의 맥을 이어 내려온 곳이기도 하다.
광주를 포함하여 호남에 이런 한국의 핵심 역사문화가 이어져 온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왜 유독 호남인가? 필자는 이 땅이 가진 인문지리적 유전자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믿고, 무등산에 그 유전자들이 오롯이 모인 스토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등산 중턱에 의재 허백련이 기거한 춘설헌(春雪軒)이 있는데, 춘설헌은 근대기 호남 인문학의 태자리라 할만하다. 그 자리에 이전에는 석아정(石啞亭)이 있었고 오방정(五放亭)이 있었다. 석아는 최원순의 호로 ‘돌벙어리’처럼 입을 무겁게 하겠다는 최원순의 평소 소신이 담겼다. 오방은 최흥종의 호인데 ‘다섯 가지를 버린다’는 의미다. 그 다섯 가지는 집안일, 사회적 체면, 경제적 이득, 정치활동, 종파 활동을 의미한다. 춘설(春雪)은 의재 허백련이 가꾼 차의 이름인데, 그는 농업학교를 운영하며 차를 보급했고 예술 활동과 함께 민족 계몽운동에 힘썼다. 이후 오방은 오방정을 의재 허백련에게 넘겼고, 이후 의재는 초가였던 오방정을 헐고 그 자리에 춘설헌을 개축했다.
석아 최원순은 광주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언론가다. 1919년 3·1운동 직전에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을 주도했다. 이광수가 ‘민족개조론’에서 조선민족은 “열악한 민족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인은 문명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석아는 “이광수는 3·1운동의 주체였던 조선 민중을 폄하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야만이다”라고 주장했다. 오방 최흥종은 1904년 유진 벨 선교사와 오언 선교사를 만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평생을 한센인 구제와 빈민을 돌보는 데 헌신했다. 그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 과정을 마친 후 목사가 되었다. 이후 광주 YMCA 초대 회장을 맡았고, 1927년에 석아 최원순 등과 함께 신간회를 창립하여 활동했다. 그는 광주 기독교병원 일대의 벽돌 가마터에 한센인을 격리하여 치료하기 시작했고, 1912년에는 제중원에 머물면서 봉선리(지금의 봉선동) 일대에 한센인 병원을 설립했는데, 이 병원은 1926년에 여수 애양원으로 옮겨갔다. 1966년 많은 기독교인이 실제의 삶에서 예수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며 명목만 기독교인임을 개탄하는 경고문을 집필한 후 절필했고, 무등산에 칩거하다가 타계했다.
의재 허백련은 소치(小痴) 허련, 미산(米山) 허형으로 이어지는 화맥을 이어받았으며, 초의선사로부터 허련으로 전해지는 다맥(茶脈)까지 이어받았다. 그가 평생 남종 문인화에 심취한 것은 남종화와 차에는 선(禪)의 기운이 동시에 흐른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1937년 연진회를 조직하여 광주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진작했고, 일제가 광주 호남동에 있던 연진회관 내에 봉안전(奉安殿)을 세우고 참배하기를 강요하자 스스로 문을 닫고 무등산 춘설헌에 칩거했다. 이후 해방이 되자 오방 최흥종과 함께 농업학교인 ‘삼애학원’을 세워 운영했다. ‘삼애’는 ‘애천(愛天), 애토(愛土), 애인(愛人)’으로서 우리 민족의 인내천(人乃天)에서 그 연원을 찾는다. 석아 오방 의재의 사상과 행적, 정신사에서 광주 정신의 뿌리를 찾는 데 많은 학자가 동의한다. 무등산 골짜기에 김구 선생이라든지 함석헌, 게오르규 등을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이 무시로 드나들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광주를 다시 보고 광주 정신을 재조명해야 할 때가 아닌가?
호남과 광주를 지칭할 때 구국, 예술, 봉사와 희생 같은 말들을 먼저 떠올린다. 근대기 호남의 역사에는 동학혁명,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5·18과 같은 굵직하면서도 이 대지를 굳건하게 지켜온 거대한 정신적 에너지들의 원천이 존재한다. 그보다 훨씬 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지키며 근거지로 삼았고, 결국 나라를 살려낸 곳이기도 하다. 문화적으로는 남종화와 판소리 그리고 다도의 맥을 이어 내려온 곳이기도 하다.
석아 최원순은 광주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언론가다. 1919년 3·1운동 직전에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을 주도했다. 이광수가 ‘민족개조론’에서 조선민족은 “열악한 민족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인은 문명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석아는 “이광수는 3·1운동의 주체였던 조선 민중을 폄하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야만이다”라고 주장했다. 오방 최흥종은 1904년 유진 벨 선교사와 오언 선교사를 만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평생을 한센인 구제와 빈민을 돌보는 데 헌신했다. 그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 과정을 마친 후 목사가 되었다. 이후 광주 YMCA 초대 회장을 맡았고, 1927년에 석아 최원순 등과 함께 신간회를 창립하여 활동했다. 그는 광주 기독교병원 일대의 벽돌 가마터에 한센인을 격리하여 치료하기 시작했고, 1912년에는 제중원에 머물면서 봉선리(지금의 봉선동) 일대에 한센인 병원을 설립했는데, 이 병원은 1926년에 여수 애양원으로 옮겨갔다. 1966년 많은 기독교인이 실제의 삶에서 예수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며 명목만 기독교인임을 개탄하는 경고문을 집필한 후 절필했고, 무등산에 칩거하다가 타계했다.
의재 허백련은 소치(小痴) 허련, 미산(米山) 허형으로 이어지는 화맥을 이어받았으며, 초의선사로부터 허련으로 전해지는 다맥(茶脈)까지 이어받았다. 그가 평생 남종 문인화에 심취한 것은 남종화와 차에는 선(禪)의 기운이 동시에 흐른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1937년 연진회를 조직하여 광주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진작했고, 일제가 광주 호남동에 있던 연진회관 내에 봉안전(奉安殿)을 세우고 참배하기를 강요하자 스스로 문을 닫고 무등산 춘설헌에 칩거했다. 이후 해방이 되자 오방 최흥종과 함께 농업학교인 ‘삼애학원’을 세워 운영했다. ‘삼애’는 ‘애천(愛天), 애토(愛土), 애인(愛人)’으로서 우리 민족의 인내천(人乃天)에서 그 연원을 찾는다. 석아 오방 의재의 사상과 행적, 정신사에서 광주 정신의 뿌리를 찾는 데 많은 학자가 동의한다. 무등산 골짜기에 김구 선생이라든지 함석헌, 게오르규 등을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이 무시로 드나들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광주를 다시 보고 광주 정신을 재조명해야 할 때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