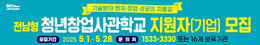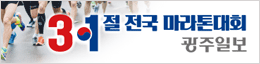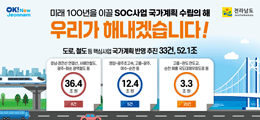세비야의 말 - 김향남 수필가
 |
세비야는 문명이 겹겹이 쌓인 도시다. 로마의 흔적, 이슬람의 문양, 가톨릭의 종탑이 한 도시 안에 공존하고, 광장과 성당, 궁전과 골목마다 정복과 저항, 기억과 망각이 뒤엉켜 있다. 이 복잡한 문명의 한가운데서, 말은 천천히 걷는다. 인간이 만든 문명 위를, 말은 말없이 지나간다. 그리고 그 걸음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문명을 만들었지만, 과연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 대의 마차에 올라 세비야의 시간을 흐르기로 한다. 마부는 손끝의 작은 움직임으로 말을 이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언어보다 오래된 묵약이 있다. 그 사이를 매개하는 건 채찍이 아니라 리듬이다. 걷고, 멈추고, 다시 걷는 느린 박자에 나는 점점 동화되어 간다.
마차가 천천히 광장을 한 바퀴 돈다. 반원형으로 펼쳐진 스페인광장은 붉은 벽돌과 황금빛 타일로 햇살을 머금고 있다. 멀찍이서 바라보는 건축물은 마치 거대한 무대 장치처럼 도시의 역사를 품고 서 있다. 말은 그 앞을 유영하듯 지나고, 광장은 어느새 말과 인간, 기억과 침묵이 함께 걷는 시간의 풍경이 된다.
관광객의 웃음소리, 이국의 풍경, 짙게 물든 하늘. 그러나 내 귀에 스며드는 것은 말발굽이 내는 규칙적인 울림이다. 땅을 두드리고, 시간을 두드리고,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말발굽 소리는 즐겁지도 않고 단순히 우아하지도 않다. 그것은 삶이 지나가는 소리, 고통을 품고 계속 나아가는 소리다.
히랄다탑이 시야에 들어온다. 세비야 대성당의 무거운 구조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다. 그 아래를 지나는 마차는 고요하고, 말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눈은 인간의 신앙과 권력, 영광과 죽음을 모두 지나온 눈이다. 성당은 인간이 하늘을 향해 뻗은 상징이지만, 말의 눈은 지상을 포기하지 않은 자의 시선을 품고 있다.
알카사르 앞을 지나고, 멀리 황금의 탑이 보인다. 이슬람과 기독교,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서사가 겹겹이 쌓인 공간은 말의 걸음을 통해 천천히 해체된다. 인간은 기념비를 세우고,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의 장소를 만든다. 그러나 진정한 기억은 돌에 새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몸을 통과해 흐르는 고통의 리듬 속에 있다. 말은 그 리듬을 밟고 걷는다.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자 도시의 숨결이 한층 가까이 느껴진다. 하얀 벽, 철제 창살, 만개한 제라늄이 이어지는 거리. 이 골목은 마치 누군가의 기억 속을 통과하는 것 같다. 말은 이 미로를 알고 있다. 말은 단순히 길을 아는 게 아니라, 도시의 깊은 결을 몸으로 기억하는 존재다.
나는 다시 말의 눈을 바라본다. 그 안에는 언어 이전의 세계가 있다. 슬픔과 인내와 침묵. 그것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을 비추는 타자의 세계다. 그 눈을 보며 스스로 묻는다. 나는 정말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문명의 환상 속을 걷고 있을 뿐인가.
어느 겨울, 토리노의 한 거리에서 니체는 말을 껴안고 울었다. 채찍질을 당하는 늙은 말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다. 때리는 인간과 맞는 말 사이에서 니체는 미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초인을 꿈꾸었으나 광인이 되어버린 그의 울음이 말발굽 소리에 또각또각 실려 온다. 아, 나는 무엇 앞에서 울 수 있을까? 무엇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가?
인간은 고통을 말로 표현하지만, 동물은 말없이 아픔을 견딘다. 순종하고 침묵한다. 그 침묵은 말보다 강한 언어다. 인간이 만든 윤리나 철학보다 오래된, 더 본능적인 진실이다. 인간은 말을 부리고, 채찍을 들고, 그리고 눈물을 삼킨다. 문득 그녀 ‘한강’의 목소리가 귓가에 머문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마차는 다시 스페인광장으로 돌아온다. 햇살은 반원을 그리며 퍼지고, 말은 조용히 숨을 고른다. 마부가 고삐를 풀자, 마차는 멈춘다. 내 안에서는 여전히 말의 눈이 움직이고 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나는 조용히 속삭인다. 너의 눈은 문명보다 오래되었다. 너는 인간을 기다린다. 우리가 인간이 되기를. 그리고 생각한다. 어쩌면 인간은, 말의 눈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인간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시 또 생각한다. 우리는 정말 인간인가, 아니면 아직 인간이 되어가는 중인가.
마차가 천천히 광장을 한 바퀴 돈다. 반원형으로 펼쳐진 스페인광장은 붉은 벽돌과 황금빛 타일로 햇살을 머금고 있다. 멀찍이서 바라보는 건축물은 마치 거대한 무대 장치처럼 도시의 역사를 품고 서 있다. 말은 그 앞을 유영하듯 지나고, 광장은 어느새 말과 인간, 기억과 침묵이 함께 걷는 시간의 풍경이 된다.
히랄다탑이 시야에 들어온다. 세비야 대성당의 무거운 구조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다. 그 아래를 지나는 마차는 고요하고, 말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눈은 인간의 신앙과 권력, 영광과 죽음을 모두 지나온 눈이다. 성당은 인간이 하늘을 향해 뻗은 상징이지만, 말의 눈은 지상을 포기하지 않은 자의 시선을 품고 있다.
알카사르 앞을 지나고, 멀리 황금의 탑이 보인다. 이슬람과 기독교,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서사가 겹겹이 쌓인 공간은 말의 걸음을 통해 천천히 해체된다. 인간은 기념비를 세우고,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의 장소를 만든다. 그러나 진정한 기억은 돌에 새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몸을 통과해 흐르는 고통의 리듬 속에 있다. 말은 그 리듬을 밟고 걷는다.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자 도시의 숨결이 한층 가까이 느껴진다. 하얀 벽, 철제 창살, 만개한 제라늄이 이어지는 거리. 이 골목은 마치 누군가의 기억 속을 통과하는 것 같다. 말은 이 미로를 알고 있다. 말은 단순히 길을 아는 게 아니라, 도시의 깊은 결을 몸으로 기억하는 존재다.
나는 다시 말의 눈을 바라본다. 그 안에는 언어 이전의 세계가 있다. 슬픔과 인내와 침묵. 그것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을 비추는 타자의 세계다. 그 눈을 보며 스스로 묻는다. 나는 정말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문명의 환상 속을 걷고 있을 뿐인가.
어느 겨울, 토리노의 한 거리에서 니체는 말을 껴안고 울었다. 채찍질을 당하는 늙은 말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다. 때리는 인간과 맞는 말 사이에서 니체는 미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초인을 꿈꾸었으나 광인이 되어버린 그의 울음이 말발굽 소리에 또각또각 실려 온다. 아, 나는 무엇 앞에서 울 수 있을까? 무엇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가?
인간은 고통을 말로 표현하지만, 동물은 말없이 아픔을 견딘다. 순종하고 침묵한다. 그 침묵은 말보다 강한 언어다. 인간이 만든 윤리나 철학보다 오래된, 더 본능적인 진실이다. 인간은 말을 부리고, 채찍을 들고, 그리고 눈물을 삼킨다. 문득 그녀 ‘한강’의 목소리가 귓가에 머문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마차는 다시 스페인광장으로 돌아온다. 햇살은 반원을 그리며 퍼지고, 말은 조용히 숨을 고른다. 마부가 고삐를 풀자, 마차는 멈춘다. 내 안에서는 여전히 말의 눈이 움직이고 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나는 조용히 속삭인다. 너의 눈은 문명보다 오래되었다. 너는 인간을 기다린다. 우리가 인간이 되기를. 그리고 생각한다. 어쩌면 인간은, 말의 눈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인간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시 또 생각한다. 우리는 정말 인간인가, 아니면 아직 인간이 되어가는 중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