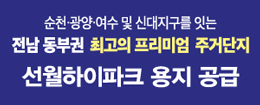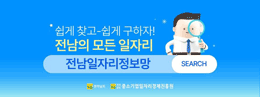전통과 현대의 경계서 들여다 본 심학규의 내면
[판소리 심청가 '두개의 눈' 공연 리뷰]
LED 스크린과 거문고·신디사이저…기존 판소리 재구성
'효' 털어낸 나약한 인간의 로드무비
LED 스크린과 거문고·신디사이저…기존 판소리 재구성
'효' 털어낸 나약한 인간의 로드무비
 ACC에서 지난 21일 ‘심청가’를 재해석한 창제극 ‘두 개의 눈’ 공연이 펼쳐졌다. 소리꾼이 심학규의 시선에서 노래하는 모습.<ACC 제공> |
“내 눈 팔아 너를 사지”, “너를 팔아 내 눈 뜨랴”….
덩 덕 쿵덕 쿵 덕 쿵덕~. 자진모리 장단에 맞춰 ‘심봉사’의 내면이 빠르게 내몰아친다.
가야금과 함께 울리는 신디사이저의 몽환적인 음색은 인간 내면의 여린 구석을 파고들고, “쾅”하고 내려치는 북소리에 온 몸이 전율한다.
붉고 희고 노란 빛을 발하는 조명장치는 위태롭게 흔들리면서 무대로 내려와 그 자체로 한 명의 무용수를 떠올리게 한다.
관객의 앞에 선 ‘심학규’는 그저 효심 깊은 심청의 아버지가 아니다. 일을 할 수 없어 가난한 장님이요, 아내를 잃은 홀아비다. 자신을 추스르기도 벅차 딸아이에게 모진 말을 내뱉다가도, 차마 애정을 버리지 못해 자존심을 구기고 구걸을 다니는 초라하고 인간적인 남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대표 창제극인 ‘두 개의 눈’은 판소리 ‘심청가’를 기반으로 한다. 효녀 심청이 맹인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스스로 인당수의 제물이 되지만, 용왕의 도움으로 환생해 심학규는 눈을 뜨게 된다는 익숙한 이야기다.
하지만 관객들은 무대에서 낯선 광경을 마주하게 된다. 기존 판소리의 내러티브와 소리 등을 철저하게 해체해 재구성한 이 작품에서 심청의 효(孝)는 찾아볼 수 없다. 그저 인간 심학규가 어떻게 세상을 견디고, 싸우고,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ACC는 개관 10주년 기념 레퍼토리 중 첫번째 작품인 ‘두 개의 눈’을 지난 21~22일 두 차례에 걸쳐 선보였다. 비주얼과 음악을 매개로 전통을 재해석하는 프로젝트 그룹 ‘무토’(MUTO)와 실험적인 판소리 창작 그룹 ‘입과 손 스튜디오’가 공동 창작을 통해 고전에 대한 다층적인 해석들을 녹여냈다.
작품은 지난 2021년 ACC에서 초연한 후 2021년 국립무형유산원 K-무형유산페스티벌 폐막작, 2023년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쿼드극장 초청공연, 2024년 키르기스스탄 건국 100주년 기념 초청공연 등을 펼쳤으며 오는 2026년 대만전통극장 초청공연이 예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ACC 대표 콘텐츠다.
극장1에서 상연된 이번 공연은 무대의 3면이 관객들에게 둘러쌓여 더욱 입체적인 장면을 연출해냈다. 출연진은 정해진 ‘중앙’ 없이 앞에서 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며 관객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대형 LED스크린이기도 한 무대는 꿈 속이 되기도, 바다가 되기도 하며 혼란스럽게 방황하는 심학규의 내면을 비춘다. 오르내리는 키네틱 레이저는 무대와 관객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효과를 발한다.
소리꾼 이승희와 김수진은 때로는 심학규, 심청이의 처지를 한탄하고, 때로는 벼락같이 울부짖으며 설움을 표출해낸다. 관객들은 흐르는 듯한 그들의 너름새(몸짓)를 따라 심학규의 여정에 올라탄다. 고수 김홍식과 이향하는 ‘얼쑤’하며 관객들이 이 흥겹고 강렬한 여정에 몰입하도록 채근한다.
박우재의 거문고와 신범호의 신디사이저는 연주를 통해 익숙하고도 낯선 내러티브를 연결한다. 거문고는 아름답게 삶의 애환을 표현하고, 신디사이저의 몽환적인 음색은 겹겹이 쌓이며 심학규의 꿈 속을 그려낸다.
특히 무대가 심봉사의 ‘말’로 빼곡하게 채워지는 장면은 압권이다. “사람들은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겠지요.” 심청이 떠난 후 심학규가 담담한 목소리로 내뱉는 나레이션을 따라 ‘대사’가 차곡차곡 내려앉고, 다시 흩어지고 일그러진다. 그에게 딸은, 아내는, 가난은, 삶은 어떤 의미였을까.
공연은 분명 판소리지만 판소리가 아니다. 단순히 화려한 무대장치와 서양음악이 합쳐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소리꾼의 한 서린 음색은 하나의 무대 위에서 힙합이 되기도, 락이나 동요가 되기도 한다. 효녀 심청의 고전적인 가치관을 털어내는 한편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 선 나약한 인간 삶을 로드무비식으로 풀어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덩 덕 쿵덕 쿵 덕 쿵덕~. 자진모리 장단에 맞춰 ‘심봉사’의 내면이 빠르게 내몰아친다.
가야금과 함께 울리는 신디사이저의 몽환적인 음색은 인간 내면의 여린 구석을 파고들고, “쾅”하고 내려치는 북소리에 온 몸이 전율한다.
관객의 앞에 선 ‘심학규’는 그저 효심 깊은 심청의 아버지가 아니다. 일을 할 수 없어 가난한 장님이요, 아내를 잃은 홀아비다. 자신을 추스르기도 벅차 딸아이에게 모진 말을 내뱉다가도, 차마 애정을 버리지 못해 자존심을 구기고 구걸을 다니는 초라하고 인간적인 남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대표 창제극인 ‘두 개의 눈’은 판소리 ‘심청가’를 기반으로 한다. 효녀 심청이 맹인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스스로 인당수의 제물이 되지만, 용왕의 도움으로 환생해 심학규는 눈을 뜨게 된다는 익숙한 이야기다.
ACC는 개관 10주년 기념 레퍼토리 중 첫번째 작품인 ‘두 개의 눈’을 지난 21~22일 두 차례에 걸쳐 선보였다. 비주얼과 음악을 매개로 전통을 재해석하는 프로젝트 그룹 ‘무토’(MUTO)와 실험적인 판소리 창작 그룹 ‘입과 손 스튜디오’가 공동 창작을 통해 고전에 대한 다층적인 해석들을 녹여냈다.
작품은 지난 2021년 ACC에서 초연한 후 2021년 국립무형유산원 K-무형유산페스티벌 폐막작, 2023년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쿼드극장 초청공연, 2024년 키르기스스탄 건국 100주년 기념 초청공연 등을 펼쳤으며 오는 2026년 대만전통극장 초청공연이 예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ACC 대표 콘텐츠다.
 |
대형 LED스크린이기도 한 무대는 꿈 속이 되기도, 바다가 되기도 하며 혼란스럽게 방황하는 심학규의 내면을 비춘다. 오르내리는 키네틱 레이저는 무대와 관객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효과를 발한다.
소리꾼 이승희와 김수진은 때로는 심학규, 심청이의 처지를 한탄하고, 때로는 벼락같이 울부짖으며 설움을 표출해낸다. 관객들은 흐르는 듯한 그들의 너름새(몸짓)를 따라 심학규의 여정에 올라탄다. 고수 김홍식과 이향하는 ‘얼쑤’하며 관객들이 이 흥겹고 강렬한 여정에 몰입하도록 채근한다.
박우재의 거문고와 신범호의 신디사이저는 연주를 통해 익숙하고도 낯선 내러티브를 연결한다. 거문고는 아름답게 삶의 애환을 표현하고, 신디사이저의 몽환적인 음색은 겹겹이 쌓이며 심학규의 꿈 속을 그려낸다.
특히 무대가 심봉사의 ‘말’로 빼곡하게 채워지는 장면은 압권이다. “사람들은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겠지요.” 심청이 떠난 후 심학규가 담담한 목소리로 내뱉는 나레이션을 따라 ‘대사’가 차곡차곡 내려앉고, 다시 흩어지고 일그러진다. 그에게 딸은, 아내는, 가난은, 삶은 어떤 의미였을까.
공연은 분명 판소리지만 판소리가 아니다. 단순히 화려한 무대장치와 서양음악이 합쳐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소리꾼의 한 서린 음색은 하나의 무대 위에서 힙합이 되기도, 락이나 동요가 되기도 한다. 효녀 심청의 고전적인 가치관을 털어내는 한편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 선 나약한 인간 삶을 로드무비식으로 풀어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