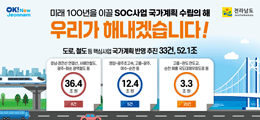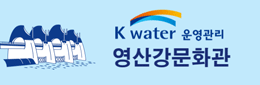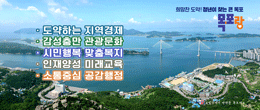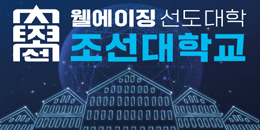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설계작 논란에 대한 시선 - 박홍근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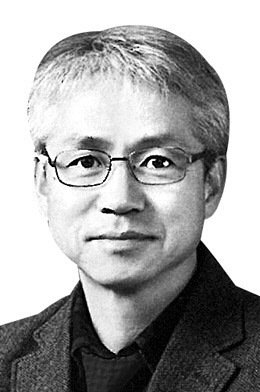 |
도시에서 삶의 지형을 바꾸는 것 중 하나는 건축물이다. 그중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 등 문화 예술 관련 건축물의 역할은 매우 크다. 대규모로 투자되고 상징성과 공공성, 지역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광주 비엔날레(Gwangju Biennale·GB) 전시관 당선작 선정을 두고 논란이 있다.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지만, 이면에는 당선작의 특별함과 자랑거리(?)가 될 ‘콘텐츠가 없다’로 들린다. 즉 세계적 건축가 설계, 독보적 디자인, 언론의 극찬과 관심 등등.
당선작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역 미술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어떤 생각일까.
첫째, 일상의 장소가 아니다. 쉽게 접근 가능한 장소인가? 목적을 가진 이벤트 장소인가? 문화시설들은 보통의 삶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 중인 부지는 대중교통과 보행, 야간 접근성이 취약하다. 행사가 있을 때는 어찌저찌 갈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과 관광객은 큰마음을 먹어야 갈 곳이다. 많은 사람이 산책하듯 접근할 수 있는 일상의 장소였으면 어떠했을까. 당연히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위치’가 경쟁력의 반이다.
둘째, 독특한 디자인 경쟁력이 없다. 행사용 공간을 만들 것인가? 광주 대표 건축물을 만들어 행사를 치를 것인가? 방향에 따라 결과는 다르다. 행정기관은 주어진 예산과 기간내에 성실히 행정업무를 진행했다. 그 결과 행사용 건물 외에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할 결과물은 얻지 못했다는 평이다. 지역사회는 광주를 상징하고, 비엔날레의 아이콘이 될 독특한 건축 작품을 원했다.
셋째, 설계자가 유명(有名)하지 않다. 설계 건축가(사)가 누구인가? 조합된 회사 이름만 있다. 작가 미상이다. 작가 이름도 없는데 명품이 될 수 있겠는가. 광주를 대표하는 비엔날레 전시관 설계는 세계적 유명 건축가였으면 했다. 그러나 설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컨소시엄 회사와 실무자만 있다. 건축가도 모르는 설계작으로 관심을 끌 건축물이 된 것은 거의 없다. 건축가를 밝히고, 그 이름을 걸고 설계토록 하자. 이를 통해서라도 유명하게 하자.
비엔날레 전시관은 다르길 바랐다.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스토리텔링 소재가 되길 바랐다. 아쉽게도 과정과 결과물을 볼 때 이전의 어느 현상공모와 별다름이 없었다. 무늬만 ‘국제설계공모’라는 것을 했지, 그 속은 비슷했다. 왜 그럴까. 혹시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 왜(why)는 없고, 어떻게(how)만 있다. 광주 비엔날레의 위상과 현실, 가치와 의미, 향후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자산 만들기’ 전략으로 건립기획을 진행했어야 했다. 전시관이 필요하니 ‘어떻게 만들지’하는 수준 정도로 좋은 건축자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둘, 목적(goal)은 없고, 목표(objective)만 있다.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이고, 목표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이다. 방향은 희미하고 대상만 선명했을까.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동네 수준이란 평이다. 목표만 보고 열심히만 했을까.
셋, 건축(architecture)은 없고, 건물(building)만 있다. 건축의 3가지 요소를 구조적 안전, 편리한 기능, 예술적 감탄이라고 한다. 구조와 기능을 충족하는 시설은 ‘건물’이라 하고, 여기에 ‘감탄’이 함께 있어야 ‘건축’이라고 한다. 건물만 생각하고 감탄을 주는 건축은 고려하지 못했을까.
광주에, 전국적 이목을 끈 건축자산이 있는가? 의재미술관(1999년 설계,2001년 준공), 아시아문화전당(2004년 설계,2015년 준공). 그 다음은... 지금부터라도 광주의 공공건축은 달라져야 한다. 왜 짓지, 어떤 목적을 가졌지, 감탄과 감동의 건축이 될지 계속 질문하면서 기획하고, 실천하고, 증명해야 한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 쉬운 일 아니다. 그래도 광주가, 공직자가 10년에 하나쯤은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광주 비엔날레(Gwangju Biennale·GB) 전시관 당선작 선정을 두고 논란이 있다.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지만, 이면에는 당선작의 특별함과 자랑거리(?)가 될 ‘콘텐츠가 없다’로 들린다. 즉 세계적 건축가 설계, 독보적 디자인, 언론의 극찬과 관심 등등.
첫째, 일상의 장소가 아니다. 쉽게 접근 가능한 장소인가? 목적을 가진 이벤트 장소인가? 문화시설들은 보통의 삶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 중인 부지는 대중교통과 보행, 야간 접근성이 취약하다. 행사가 있을 때는 어찌저찌 갈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과 관광객은 큰마음을 먹어야 갈 곳이다. 많은 사람이 산책하듯 접근할 수 있는 일상의 장소였으면 어떠했을까. 당연히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위치’가 경쟁력의 반이다.
셋째, 설계자가 유명(有名)하지 않다. 설계 건축가(사)가 누구인가? 조합된 회사 이름만 있다. 작가 미상이다. 작가 이름도 없는데 명품이 될 수 있겠는가. 광주를 대표하는 비엔날레 전시관 설계는 세계적 유명 건축가였으면 했다. 그러나 설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컨소시엄 회사와 실무자만 있다. 건축가도 모르는 설계작으로 관심을 끌 건축물이 된 것은 거의 없다. 건축가를 밝히고, 그 이름을 걸고 설계토록 하자. 이를 통해서라도 유명하게 하자.
비엔날레 전시관은 다르길 바랐다.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스토리텔링 소재가 되길 바랐다. 아쉽게도 과정과 결과물을 볼 때 이전의 어느 현상공모와 별다름이 없었다. 무늬만 ‘국제설계공모’라는 것을 했지, 그 속은 비슷했다. 왜 그럴까. 혹시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 왜(why)는 없고, 어떻게(how)만 있다. 광주 비엔날레의 위상과 현실, 가치와 의미, 향후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자산 만들기’ 전략으로 건립기획을 진행했어야 했다. 전시관이 필요하니 ‘어떻게 만들지’하는 수준 정도로 좋은 건축자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둘, 목적(goal)은 없고, 목표(objective)만 있다.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이고, 목표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이다. 방향은 희미하고 대상만 선명했을까.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동네 수준이란 평이다. 목표만 보고 열심히만 했을까.
셋, 건축(architecture)은 없고, 건물(building)만 있다. 건축의 3가지 요소를 구조적 안전, 편리한 기능, 예술적 감탄이라고 한다. 구조와 기능을 충족하는 시설은 ‘건물’이라 하고, 여기에 ‘감탄’이 함께 있어야 ‘건축’이라고 한다. 건물만 생각하고 감탄을 주는 건축은 고려하지 못했을까.
광주에, 전국적 이목을 끈 건축자산이 있는가? 의재미술관(1999년 설계,2001년 준공), 아시아문화전당(2004년 설계,2015년 준공). 그 다음은... 지금부터라도 광주의 공공건축은 달라져야 한다. 왜 짓지, 어떤 목적을 가졌지, 감탄과 감동의 건축이 될지 계속 질문하면서 기획하고, 실천하고, 증명해야 한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 쉬운 일 아니다. 그래도 광주가, 공직자가 10년에 하나쯤은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