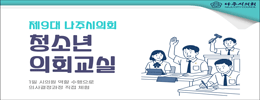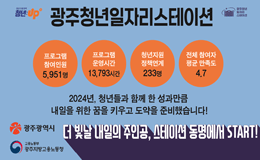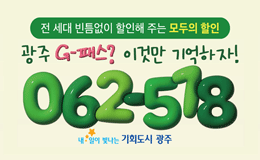노동계 “산재 예방 실질 효과”… 경영계 “비용 부담에 경영 악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노동·경제계 입장은?]
5일 뒤부터 광주·전남 사업체 36.2% 적용…5인 미만땐 63.7%
산업계 “중소기업, 안전체계 구축 마련 인력·비용 감당 못해”
노동계 “산재 사망사고 70%가 소형 사업장…더 일찍 적용됐어야”
5일 뒤부터 광주·전남 사업체 36.2% 적용…5인 미만땐 63.7%
산업계 “중소기업, 안전체계 구축 마련 인력·비용 감당 못해”
노동계 “산재 사망사고 70%가 소형 사업장…더 일찍 적용됐어야”
 /클립아트코리아 |
정부가 유예 입장을 밝혀오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27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광주·전남 노동계와 경제계가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산재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경제계는 영세 사업장을 옥죄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KOSIS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광주·전남에는 총 12만 3229곳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그동안 중대재해법 규제를 받은 광주전남 사업체(50인 이상 사업체)는 2%(2535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면 광주·전남 사업체 중 36.2%(50인 이상 포함)가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나머지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63.7%(7만8546곳)에 해당한다.
광주지역 경제계는 영세업체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 되지 않는다면 경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안전관련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와 안전설비 추가 설치 등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당장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되는 박승호 동서그린(광주시 북구 월출동) 이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개인의 부주의까지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 시행 이후 관건은 안전보건 구축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인데 현재 체계는 대기업 위주여서 중소기업은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며 “중소기업은 인력·비용적인 측면에서 대기업을 따라갈 수 없고, 결국은 조건을 갖춘 대기업에 일감이 몰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이 시행되면 당장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꾸리고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업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배치해야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것도 의무다.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또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해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결국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하지만 소규모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버겁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지역본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안전 보건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컨설팅과 설비 보강, 안전보강 조치 등을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쉽지 않다”며 “2년간 입법을 유예한다면 그 기간동안 조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상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 조직국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의 70% 이상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그동안 빠져 있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효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더 빠르게 적용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드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는 2년 유예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답답하다”며 “짧지않은 유예 기간동안 대비하지 않다 이제와서 영세사업장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민주노총 전남 노동보건안전 국장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지는 이들은 한해 2000여명이 넘고 이중 80%가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숨지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법 유예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산재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경제계는 영세 사업장을 옥죄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면 광주·전남 사업체 중 36.2%(50인 이상 포함)가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나머지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63.7%(7만8546곳)에 해당한다.
광주지역 경제계는 영세업체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 되지 않는다면 경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안전관련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와 안전설비 추가 설치 등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어 “법 시행 이후 관건은 안전보건 구축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인데 현재 체계는 대기업 위주여서 중소기업은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며 “중소기업은 인력·비용적인 측면에서 대기업을 따라갈 수 없고, 결국은 조건을 갖춘 대기업에 일감이 몰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이 시행되면 당장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꾸리고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업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배치해야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것도 의무다.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또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해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결국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하지만 소규모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버겁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지역본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안전 보건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컨설팅과 설비 보강, 안전보강 조치 등을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쉽지 않다”며 “2년간 입법을 유예한다면 그 기간동안 조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상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 조직국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의 70% 이상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그동안 빠져 있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효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더 빠르게 적용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드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는 2년 유예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답답하다”며 “짧지않은 유예 기간동안 대비하지 않다 이제와서 영세사업장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민주노총 전남 노동보건안전 국장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지는 이들은 한해 2000여명이 넘고 이중 80%가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숨지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법 유예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