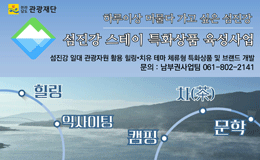당신도 누군가에겐 스치고 지나간 인연이다 - 중현 광주 증심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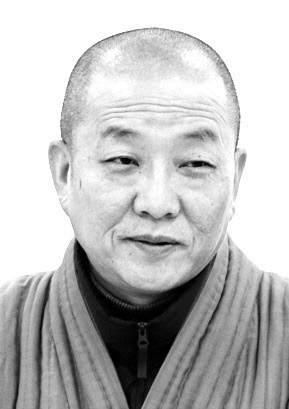 |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조용필 ‘바람의 노래’ 중)
시내에서 불교아카데미 강의를 마치고 밤 9시가 훨씬 넘어 절로 돌아왔다. 텅 빈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미리 예약이라도 한 듯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은 만사가 귀찮은 사람처럼, 주차장 중간쯤에서 주저앉았다. 조명이 비추는 텅 빈 주차장을 바라본다. 자동차 조명만한 크기로 오도마니 웅크리고 앉은 주차장은 누군가의 지친 뒷모습 같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디로 가는가?” 노래는 내게 묻는다. 그러게! 그 많고도 많던 인연들과 가슴 시린 그리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또 무슨 인연으로 나는 창백한 자동차 조명을 부추겨 주차장을 다독이고 있을까?
인연은 어느 날 문득 내게로 와서 함께 하다가 훌쩍 떠나 버린다. 나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인연이 나를 스치고 지나간다. 인연을 실은 세월만 무심하게 흘러간다. 우리는 이렇게 숙명적으로 인연을 맞고 또 이별하며 살아간다. ‘인연 따라 산다’는 말은 인연이 담고 있는 운명적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모두 ‘나’이기 때문에 ‘나’를 스쳐 지나간 인연들과 그리움들로 가슴 아파한다. ‘나’는 늦은 밤, 라디오를 들으며 ‘너’와 함께 했던 숱한 인연들과, 숱한 ‘너’들이 남기고 간 빈 자리를 온몸으로 느낀다. 이삿짐이 모두 빠져나간 빈 방을 바라보듯, ‘나’의 마음은 황망하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너’이기도 하다. ‘너’인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겐 스치고 지나간 인연이다.‘너’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존재여서 이 세상에 살다 간 흔적이라도 남겨두려 발버둥친다. ‘너’에게 숱한 ‘나’들은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산기슭의 하이에나에 불과할 뿐이다.
‘너’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 정상의 표범이고 싶어한다. 그러나 또한 ‘너’는 알고 있다. 그런 보잘것 없는 ‘나’들이 나무처럼 굳건하게 삶의 현장을 지키며 소중한 사람들과 소소한 행복을 꾸려가고 있음을.
‘너’가 그렇게도 애쓰는 삶의 흔적이 ‘나’에게는 상처 뿐인 기억 혹은 사무치는 그리움이다. ‘나’가 바라보는 ‘너’는 그리움만을 선사하곤 훌쩍 떠나버리는 무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쩌면 ‘나’라는 존재는 인연이란 두 글자 안에 녹아들어간 숱한 것들 중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다. ‘나’ 역시 스치고 간 숱한 인연들 하나 하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그저 ‘인연’이라는 두 글자가 선사하는 쓸쓸함에 잠시 취할 뿐이다.
우리들이 쌓아가는 것은 추억, 감성, 별리의 회한 같은 것들이다. ‘나’는 ‘너’를 그리워하고, ‘너’는 ‘나’를 흠모한다. 그것을 뭐라 부르건 결국은 정(情)이다. ‘나’가 ‘너’에 대하여, ‘너’가 ‘나’에 대하여 차곡 차곡 켜켜이 쌓은 정이다.
우리 모두는 ‘나’와 ‘너’이기 이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이다. 복잡한 인연의 고리가 얽히고 설켜 누가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실타래처럼 뒤엉켜 살고 있다. 우리는 ‘나’이기도 하고 ‘너’이기도 하다. 내가 없다면 너도 없고, 네가 없다면 나도 없다. 애초부터 나와 너는 ‘우리’ 안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그래서 너와 나 모두에게 실패와 고뇌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진다.
우뚝 선 고목이 들려주는 바람의 노래. 그리고 또 어딘가에서 ‘쿵’하며 꽃이 지고 있다. 가끔 우주를 상상하노라면 지금의 삶이 숭고해진다. 이 우주 속에서는 ‘나’도 없고 ‘너’도 없다. 오직 숱한 인(因)과 연(緣)이 뒤엉켜 거대하게 흘러갈 뿐이다.
지식이 하나 하나 쌓아가는 것이라면, 지혜는 쌓은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살아가는 것은 방법 만으로도 충분하다. 삶의 목적이나 존재 이유 같은 것들은 오히려 짐만 될 뿐이다. 삶은 여행이다. 그것도 시작도 끝도 없는 여행. 돌아갈 곳도 없고, 종착지도 없는 여행이다. 짐이 많을 수록 여행길은 괴로운 법이다.
가을이 온다. 귀기울여 바람의 노래를 들어보라.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디로 가는가?” 노래는 내게 묻는다. 그러게! 그 많고도 많던 인연들과 가슴 시린 그리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또 무슨 인연으로 나는 창백한 자동차 조명을 부추겨 주차장을 다독이고 있을까?
우리는 모두 ‘나’이기 때문에 ‘나’를 스쳐 지나간 인연들과 그리움들로 가슴 아파한다. ‘나’는 늦은 밤, 라디오를 들으며 ‘너’와 함께 했던 숱한 인연들과, 숱한 ‘너’들이 남기고 간 빈 자리를 온몸으로 느낀다. 이삿짐이 모두 빠져나간 빈 방을 바라보듯, ‘나’의 마음은 황망하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너’이기도 하다. ‘너’인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겐 스치고 지나간 인연이다.‘너’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존재여서 이 세상에 살다 간 흔적이라도 남겨두려 발버둥친다. ‘너’에게 숱한 ‘나’들은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산기슭의 하이에나에 불과할 뿐이다.
‘너’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 정상의 표범이고 싶어한다. 그러나 또한 ‘너’는 알고 있다. 그런 보잘것 없는 ‘나’들이 나무처럼 굳건하게 삶의 현장을 지키며 소중한 사람들과 소소한 행복을 꾸려가고 있음을.
‘너’가 그렇게도 애쓰는 삶의 흔적이 ‘나’에게는 상처 뿐인 기억 혹은 사무치는 그리움이다. ‘나’가 바라보는 ‘너’는 그리움만을 선사하곤 훌쩍 떠나버리는 무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쩌면 ‘나’라는 존재는 인연이란 두 글자 안에 녹아들어간 숱한 것들 중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다. ‘나’ 역시 스치고 간 숱한 인연들 하나 하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그저 ‘인연’이라는 두 글자가 선사하는 쓸쓸함에 잠시 취할 뿐이다.
우리들이 쌓아가는 것은 추억, 감성, 별리의 회한 같은 것들이다. ‘나’는 ‘너’를 그리워하고, ‘너’는 ‘나’를 흠모한다. 그것을 뭐라 부르건 결국은 정(情)이다. ‘나’가 ‘너’에 대하여, ‘너’가 ‘나’에 대하여 차곡 차곡 켜켜이 쌓은 정이다.
우리 모두는 ‘나’와 ‘너’이기 이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이다. 복잡한 인연의 고리가 얽히고 설켜 누가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실타래처럼 뒤엉켜 살고 있다. 우리는 ‘나’이기도 하고 ‘너’이기도 하다. 내가 없다면 너도 없고, 네가 없다면 나도 없다. 애초부터 나와 너는 ‘우리’ 안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그래서 너와 나 모두에게 실패와 고뇌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진다.
우뚝 선 고목이 들려주는 바람의 노래. 그리고 또 어딘가에서 ‘쿵’하며 꽃이 지고 있다. 가끔 우주를 상상하노라면 지금의 삶이 숭고해진다. 이 우주 속에서는 ‘나’도 없고 ‘너’도 없다. 오직 숱한 인(因)과 연(緣)이 뒤엉켜 거대하게 흘러갈 뿐이다.
지식이 하나 하나 쌓아가는 것이라면, 지혜는 쌓은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살아가는 것은 방법 만으로도 충분하다. 삶의 목적이나 존재 이유 같은 것들은 오히려 짐만 될 뿐이다. 삶은 여행이다. 그것도 시작도 끝도 없는 여행. 돌아갈 곳도 없고, 종착지도 없는 여행이다. 짐이 많을 수록 여행길은 괴로운 법이다.
가을이 온다. 귀기울여 바람의 노래를 들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