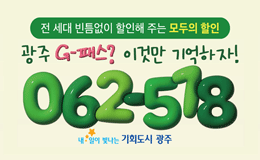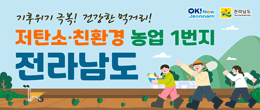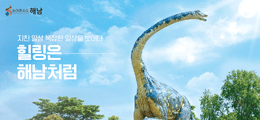수해 극복에 최선을 - 임성욱 사회복지학 박사
 |
그동안 우리 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동복호는 물론 주암호까지 거의 말라갈 정도로. 전남 일부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자체 식수 해결도 어려웠다. 그로 인해 민심까지 흉흉해지려는 찰나에 비가 내렸다. 처음에는 조금 내리다가 그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빗물이 넘치기 시작했다. 그래도 길어지는 장마를 미워하지 않고 ‘귀여운 장마’라는 애칭까지 붙여 줬다. 하지만 수마로 돌변해서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 곳곳을 강타해 버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물적인 피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이처럼 세상사는 예측할 수가 없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거대한 자연 현상 앞에서는 무기력해지는 게 인간 세상이 아니던가. 그런데도 눈앞의 편안함과 이익만을 위해 자연 훼손을 거듭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각종 공약 남발로 그 정도가 더더욱 심해지고 있다. 자신이 지방자치단체장일 때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기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의 훼손은 업적이 아니라 죄악이다. 현 세대만 이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대손손 사용해야 할 보물이란 말이다. 소아병적인 사고가 결국 오늘날의 수해로 인해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은 종합적인 국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될까도 걱정이다. 이미 지구가 너무 늙었다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우주 개척 경쟁의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화성을 식민지화할 계획까지 세웠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로켓을 통해 사람을 화성까지 운송하기 위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2월에는 최초로 팰컨 헤비 로켓의 발사에 성공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고급 지식이 내일에는 일반적인 상식이 돼 버린다. 이렇게 소용돌이치면서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할까. 참으로 난맥이다. 조금만 등한시해도 사회적 주류에서 밀려난다. 사회적 주류의 리더는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생존을 위해 이합집산하며 질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로마의 정치가이자 학자요 작가인 키케로(Cicero)는 이런 말을 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그렇다. 아무리 어두워도 항상 어둡지만은 않다. 반드시 낮은 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낮을 만들어 주는 요소 중의 하나가 사회 복지다. 사회 복지는 특히 스스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사회 복지의 영역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회 복지에서 중요시하는 문장 중의 하나를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상황 속의 인간’‘환경 속의 인간’이다. 우리는 누구나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번 수해로 인해 수많은 수재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들이 받은 스트레스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영원히 일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초래하기 전에 사회 복지사들을 비롯한 이 분야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맥커빈과 패터슨(McCubbin & Patterson, 1983)은 가족에 따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가족의 취약성과 재생력을 조사한 바 있다. 관계 기관에서는 특히 가족을 잃은 극단적 피해자들부터 이런 조사를 시행하길 바란다. 회복력(resilience) 정도가 낮은 가족부터 한시바삐 시행하여 그들이 일상생활을 빨리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빨리 회복할수록 그만큼 국가의 재원이 덜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민 화합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고급 지식이 내일에는 일반적인 상식이 돼 버린다. 이렇게 소용돌이치면서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할까. 참으로 난맥이다. 조금만 등한시해도 사회적 주류에서 밀려난다. 사회적 주류의 리더는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생존을 위해 이합집산하며 질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로마의 정치가이자 학자요 작가인 키케로(Cicero)는 이런 말을 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그렇다. 아무리 어두워도 항상 어둡지만은 않다. 반드시 낮은 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낮을 만들어 주는 요소 중의 하나가 사회 복지다. 사회 복지는 특히 스스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사회 복지의 영역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회 복지에서 중요시하는 문장 중의 하나를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상황 속의 인간’‘환경 속의 인간’이다. 우리는 누구나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번 수해로 인해 수많은 수재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들이 받은 스트레스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영원히 일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초래하기 전에 사회 복지사들을 비롯한 이 분야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맥커빈과 패터슨(McCubbin & Patterson, 1983)은 가족에 따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가족의 취약성과 재생력을 조사한 바 있다. 관계 기관에서는 특히 가족을 잃은 극단적 피해자들부터 이런 조사를 시행하길 바란다. 회복력(resilience) 정도가 낮은 가족부터 한시바삐 시행하여 그들이 일상생활을 빨리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빨리 회복할수록 그만큼 국가의 재원이 덜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민 화합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