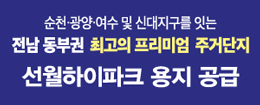‘박서보 예술상’ 논란을 보며
 |
제14회 광주비엔날레(4월7~7월9일)에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박서보 예술상’이 사실상 1회 시상을 끝으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박서보 예술상은 ‘광주비엔날레 눈(Noon) 예술상’ 이후 첫선을 보인 시상제라는 점에서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카드’였다. 지난 2010년 시행한 ‘광주비엔날레 눈 예술상’(중진작가 1만달러, 신진 5000달러)은 2016년 예산부족으로 6년 만에 중단됐다.
이런 이유로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지난해 박서보 개인 출연금으로 설립한 기지재단으로부터 총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기부받아 그의 이름을 딴 ‘박서보 예술상’을 제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서 일부 미술인들이 비엔날레 정체성과 박서보 화백의 과거 이력을 제기하면서 1년 여 만에 폐지될 위기를 맞았다.
이날 1회 수상자로 선정된 엄정순 작가에게 상금 10만달러가 명기된 패널판과 꽃다발을 시상하자 그 자리에 있었던 일부 미술인들이 ‘박서보 예술상을 폐지하라’는 피켓을 앞세우며 시위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다.
이번 박서보 예술상이 논란의 중심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비엔날레 정체성’이다. ‘단색화의 거장’인 박서보(91)화백의 기부금이라는 명분으로 작가의 이름을 내건 상이 5월항쟁의 아픔이 깃든 광주에서 탄생한 비엔날레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국제적인 미술상에 특정작가의 이름을 내건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전위예술가로 활동했던 박 화백의 이력을 감안하면 현대미술축제인 비엔날레와 관련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유야 어쨌든, 지역 문화계와 시민들은 개막 이후 ‘박서보 예술상’을 두고 불거진 일련의 논란을 ‘착잡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비엔날레 재단이 ‘박서보 예술상’을 공표한 지 1년 여 만에, 그것도 축제의 장이어야 할 개막식에서 피켓시위가 펼쳐지고 SNS상에서 폐지를 촉구하는 글이 릴레이처럼 퍼지는 모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재단이 지난해 ‘박서보 예술상’신설을 발표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왜 ‘뒤늦게’ 축제에 찬물을 끼얹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재단이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지난해 3월 기지재단으로 부터 기부금을 받은 후 기증자의 이름을 내건 미술상을 제정하면서 비엔날레 이사회 이외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기지재단으로부터 기증의사를 받았을 때 예술상의 명칭과 적합성 등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어땠을 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문제는 기부금의 향방이다. 기지재단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내건 예술상 명칭이 변경될 경우에도 매회 10만 달러를 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만약 박서보 화백 측이 비엔날레 재단의 ‘새로운’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박서보 예술상’은 물론 시상금도 없던 일이 될 수 있어서다.
흔히, ‘세상에 조건없는 기부는 없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번 박서보 예술상이 기부에 대한 상식을 깰지 지켜볼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의 권위다. 상금이 상의 명예와 품격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것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수상자를 뽑는 것이 곧 상의 권위를 지켜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후한 상금이 없어도 세계 최고의 명성을 뽐내는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처럼.
<문화·예향국장, 선임기자>
하지만 지난달 6일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서 일부 미술인들이 비엔날레 정체성과 박서보 화백의 과거 이력을 제기하면서 1년 여 만에 폐지될 위기를 맞았다.
이날 1회 수상자로 선정된 엄정순 작가에게 상금 10만달러가 명기된 패널판과 꽃다발을 시상하자 그 자리에 있었던 일부 미술인들이 ‘박서보 예술상을 폐지하라’는 피켓을 앞세우며 시위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지역 문화계와 시민들은 개막 이후 ‘박서보 예술상’을 두고 불거진 일련의 논란을 ‘착잡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비엔날레 재단이 ‘박서보 예술상’을 공표한 지 1년 여 만에, 그것도 축제의 장이어야 할 개막식에서 피켓시위가 펼쳐지고 SNS상에서 폐지를 촉구하는 글이 릴레이처럼 퍼지는 모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재단이 지난해 ‘박서보 예술상’신설을 발표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왜 ‘뒤늦게’ 축제에 찬물을 끼얹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재단이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지난해 3월 기지재단으로 부터 기부금을 받은 후 기증자의 이름을 내건 미술상을 제정하면서 비엔날레 이사회 이외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기지재단으로부터 기증의사를 받았을 때 예술상의 명칭과 적합성 등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어땠을 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문제는 기부금의 향방이다. 기지재단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내건 예술상 명칭이 변경될 경우에도 매회 10만 달러를 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만약 박서보 화백 측이 비엔날레 재단의 ‘새로운’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박서보 예술상’은 물론 시상금도 없던 일이 될 수 있어서다.
흔히, ‘세상에 조건없는 기부는 없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번 박서보 예술상이 기부에 대한 상식을 깰지 지켜볼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의 권위다. 상금이 상의 명예와 품격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것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수상자를 뽑는 것이 곧 상의 권위를 지켜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후한 상금이 없어도 세계 최고의 명성을 뽐내는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처럼.
<문화·예향국장,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