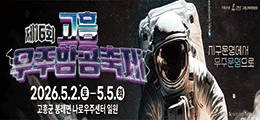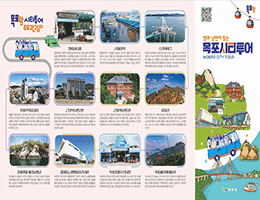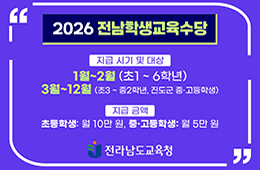옛 문헌을 왜 수집해야 하는가-안동교 한국학호남진흥원 자료교육부장
 |
일반적으로 전남·전북·제주 지역을 통틀어 ‘호남’(湖南)’이라 부른다. 예로부터 이 호남 지역은 다른 시도보다 땅이 넓고 사람이 많고 물산이 풍부한 곳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이 지역은 호남인들이 남긴 생활·학문·정치·문화·예술 자료 등이 다수 생산된 곳이기도 하다.
호남은 수차례 벌어진 전란의 와중에 가장 많은 자료들이 소실되거나 약탈당한 곳이기도 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대한제국기와 식민지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록자료들이 소실되거나 약탈당했던가. 이어진 6·25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귀중한 기록 자료들이 또 얼마나 잿더미로 변했던가.
‘문헌’(文獻)은 기록 자료(文)와 구술 자료(獻)를 통칭하는 것으로, 특정한 연구를 진행할 때에 참고가 되는 기초 자료를 가리킨다. 기록 자료는 종이·나무·비단·돌·쇠·도자기 등에 쓰이거나 새겨져 전승되어왔는데, 그중에서도 종이에 기록된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책자 형태로 묶인 고서, 낱장 형태로 적힌 고문서, 글씨와 그림을 담은 고서화, 종이에 찍기 위해 글자나 그림 등을 새긴 고목판 등이 기록 자료를 구성하는 자원들이다.
현재 호남 지역의 개인이나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 자료들은 항온·항습·소방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채 습기와 좀 벌레,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고서·고문서·고서화 등의 문화재적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절도범들의 기승도 심상치 않다. 필자는 담양 지역 계당(정철 후손가) 자료의 상당수가 좀벌레에 속절없이 부스러져 나가는 상황을 목격한 바 있고(지금은 수습되어 안전한 기관에 보관 중이다), 보성 지역 안방준 종가의 고서와 고문서가 절도당하여 이 지역에서 거래되거나 경상도 모 대학으로 팔려나간 사실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는 5년 전에 두 지자체의 상생 과제로 한국학호남진흥원을 출범시켰다. 호남권 한국학 자료의 수집·보존·연구·편찬·보급·확산의 중심에 서겠다는 것이 진흥원이 표방한 첫 번째 미션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 자료를 토대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호남 한국학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진흥원의 첫 번째 전략 목표이다.
진흥원은 5년여 동안에 고서·고문서·목판·서화·기타 유물 등 약 4만 5천 점을 수집하여 항온·항습·소방·방충시설을 갖춘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 중에는 보물 3점, 등록문화재 91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251점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해년마다 1만 점에서 1만 5천 점씩 수집한다고 가정하면 2050년에는 30만 점에서 40만 점 가량 수집되어 명실공히 호남의 기록 자료를 집적한 대표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낙후된 건물을 빌려 임시로 수장고를 운용해서는 불가능하다. 최첨단화한 넓고 안전한 수장고가 필요하다. 현재 임시로 조성한 수장고는 수장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체계적으로 정리·보존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다. 첫 번째 전략 목표를 원만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 청사를 하루 빨리 건립하여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혹자는 묻는다. 왜 옛날 문헌을 수집해야 하느냐고. 각종 대학교와 기관의 도서관에 엄청난 고서가 있지 않냐고.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이들은 활자로 인쇄된 기록 자료만 중시하는 일면적인 연구자들이다. 활자화한 기록 자료들은 정제된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지만, 진흥원에서 주로 수집하는 필사본 자료와 낱장 고문서에 담긴 다양한 정보들을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 예컨대 어떤 활자화한 문집에 실린 편지는 당사자가 평생 쓴 필사본 편지의 절반도 수록하지 못한다. 필사본 일기는 아예 문집에 실리지 못하거나 실려도 발췌 축약되어 실린다.
호남에서 한국학을 진흥하는 일은 인쇄본 자료와 필사본 자료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종합적·체계적 연구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수장고 시설을 갖추는 일과 연구 진흥을 시스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청사 건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두 지자체가 눈치를 보며 시일을 끌 사안이 결코 아니다. 먼저 출발한 경상도의 ‘한국국학진흥원’은 저만치 앞서가고, 나중에 출발한 충청도의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곧 개원한다고 하지 않는가.
호남은 수차례 벌어진 전란의 와중에 가장 많은 자료들이 소실되거나 약탈당한 곳이기도 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대한제국기와 식민지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록자료들이 소실되거나 약탈당했던가. 이어진 6·25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귀중한 기록 자료들이 또 얼마나 잿더미로 변했던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는 5년 전에 두 지자체의 상생 과제로 한국학호남진흥원을 출범시켰다. 호남권 한국학 자료의 수집·보존·연구·편찬·보급·확산의 중심에 서겠다는 것이 진흥원이 표방한 첫 번째 미션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 자료를 토대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호남 한국학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진흥원의 첫 번째 전략 목표이다.
진흥원은 5년여 동안에 고서·고문서·목판·서화·기타 유물 등 약 4만 5천 점을 수집하여 항온·항습·소방·방충시설을 갖춘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 중에는 보물 3점, 등록문화재 91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251점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해년마다 1만 점에서 1만 5천 점씩 수집한다고 가정하면 2050년에는 30만 점에서 40만 점 가량 수집되어 명실공히 호남의 기록 자료를 집적한 대표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낙후된 건물을 빌려 임시로 수장고를 운용해서는 불가능하다. 최첨단화한 넓고 안전한 수장고가 필요하다. 현재 임시로 조성한 수장고는 수장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체계적으로 정리·보존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다. 첫 번째 전략 목표를 원만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 청사를 하루 빨리 건립하여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혹자는 묻는다. 왜 옛날 문헌을 수집해야 하느냐고. 각종 대학교와 기관의 도서관에 엄청난 고서가 있지 않냐고.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이들은 활자로 인쇄된 기록 자료만 중시하는 일면적인 연구자들이다. 활자화한 기록 자료들은 정제된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지만, 진흥원에서 주로 수집하는 필사본 자료와 낱장 고문서에 담긴 다양한 정보들을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 예컨대 어떤 활자화한 문집에 실린 편지는 당사자가 평생 쓴 필사본 편지의 절반도 수록하지 못한다. 필사본 일기는 아예 문집에 실리지 못하거나 실려도 발췌 축약되어 실린다.
호남에서 한국학을 진흥하는 일은 인쇄본 자료와 필사본 자료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종합적·체계적 연구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수장고 시설을 갖추는 일과 연구 진흥을 시스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청사 건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두 지자체가 눈치를 보며 시일을 끌 사안이 결코 아니다. 먼저 출발한 경상도의 ‘한국국학진흥원’은 저만치 앞서가고, 나중에 출발한 충청도의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곧 개원한다고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