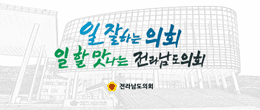후손 없는 독립운동가, 추모 공간 필요하다
호남지역만 무후선열 500위
합동추모 제단 등 조성해야
후손 확인작업 더욱 강화돼야
합동추모 제단 등 조성해야
후손 확인작업 더욱 강화돼야
‘무후선열’을 아십니까?
무후선열은 독립운동을 했지만 후손들이 확인되지 않는 유공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호남지역에서만 500위에 달하는 만큼 이들 영령을 한 자리에 모셔 추모하고,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단이나 추모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나라를 위해 산화한 선열의 후손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해야 한다는 점에서 후손 확인 작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07년 호남의병활동부터 1919년 3·1만세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까지 우리 선조들은 한반도의 독립을 위해 한마음으로 일제에 항거했다. 광주를 포함한 전라도에서만 정부에 의해 인정된 독립유공자는 모두 2107명이다. 북한을 포함한 10개 도에서 경상도(3420명), 평안도(2145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숫자다.
하지만 전라도 출신 독립유공자 중 후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비석으로나마 이름을 남겨 추모 받고 있지만 대부분은 기록상으로만 존재한다.
1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모두 1만 5689명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이중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유공자는 5697명(36.3%)이다. 전라도 출신은 독립유공자 2107명 중 493명(23.3%, 전남 162명·전북 331명)이 무후선열이다. 올해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식 계기 정부 포상 때도 광주·전남 출신 46명이 이름을 올렸지만 19명의 후손이 확인되지 않았다.
무후선열들의 훈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제작했지만 전수해줄 사람이 없어 후손이 확인될 때까지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에서 보관한다.
국가보훈처는 홈페이지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메뉴를 운영하고 있지만 후손이 확인되는 경우는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름이 알려진 독립운동가들은 후손이 없어도 기념사업회 등이 꾸려져 조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국립서울현충원의 경우 1975년 광복 30주년을 기념해 무후선열제단을 만들어 무후선열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숫자에 비하면 극히 일부다. 현재 선열 140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이곳에는 수피아여고 교사였던 김마리아 선생, 초대 광주시장을 지낸 정광호 선생 등이 있다.
하지만 1919년 3월 광주만세운동 때 일제에 항거하다 팔이 잘리고 평생 독신으로 산 윤형숙(1900~1950) 선생, 1907년 기삼연 등과 호남의병으로서 일제와 싸우다 교수형을 당한 의병장 김봉규(?~1908) 선생 등은 마을 주민이 제사를 지내주거나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합동추모제를 통해서만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무후선열들에 대한 추모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홍길 전남대 학생독립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은 “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무후선열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만들어 그들의 공적을 조명하고 후대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무후선열은 독립운동을 했지만 후손들이 확인되지 않는 유공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호남지역에서만 500위에 달하는 만큼 이들 영령을 한 자리에 모셔 추모하고,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단이나 추모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나라를 위해 산화한 선열의 후손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해야 한다는 점에서 후손 확인 작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라도 출신 독립유공자 중 후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비석으로나마 이름을 남겨 추모 받고 있지만 대부분은 기록상으로만 존재한다.
무후선열들의 훈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제작했지만 전수해줄 사람이 없어 후손이 확인될 때까지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에서 보관한다.
국가보훈처는 홈페이지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메뉴를 운영하고 있지만 후손이 확인되는 경우는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름이 알려진 독립운동가들은 후손이 없어도 기념사업회 등이 꾸려져 조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국립서울현충원의 경우 1975년 광복 30주년을 기념해 무후선열제단을 만들어 무후선열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숫자에 비하면 극히 일부다. 현재 선열 140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이곳에는 수피아여고 교사였던 김마리아 선생, 초대 광주시장을 지낸 정광호 선생 등이 있다.
하지만 1919년 3월 광주만세운동 때 일제에 항거하다 팔이 잘리고 평생 독신으로 산 윤형숙(1900~1950) 선생, 1907년 기삼연 등과 호남의병으로서 일제와 싸우다 교수형을 당한 의병장 김봉규(?~1908) 선생 등은 마을 주민이 제사를 지내주거나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합동추모제를 통해서만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무후선열들에 대한 추모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홍길 전남대 학생독립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은 “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무후선열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만들어 그들의 공적을 조명하고 후대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