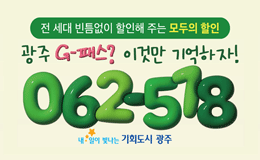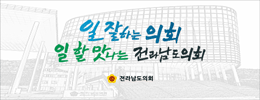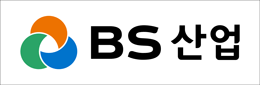확신을 확신하지 않기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가 이집트와의 전쟁에 승리했을 때, 승전국 페르시아의 왕 캄뷔세스는 패전국 이집트의 왕 프삼메니토스에게 모욕을 주고자 했다. 그래서 그를 길거리에 세워두고, 그의 딸이 하녀로 전락해 물동이를 지고 우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했다. 이 광경을 보고 모든 이집트인들이 슬퍼했으나 정작 왕은 땅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곧이어 아들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왕은 역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포로 행렬 속을 걸어가는 늙고 초라한 한 남자가 자기의 오래된 시종임을 알아본 순간, 왕은 주먹으로 머리를 치며 극도의 슬픔을 표현했다.
이것은 그리스 시대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기원전 5세기에 쓴 ‘역사’의 3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나는 이것을 독일의 문예비평가 발터 벤야민의 글 ‘이야기꾼’(한국어판 ‘발터 벤야민 선집’ 9)을 통해 알게 됐다. 이야기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해석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나는 이 글을 내보이고는 한다. 왕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의 에세이스트 몽테뉴는 이렇게 해석했다고 한다. “왕은 이미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조금만 그 양이 늘었어도 댐이 무너질 판이었다.” 딸과 아들까지는 잘 눌러 참았는데 시종을 보자 그 슬픔이 흘러넘쳤다는 것.
벤야민은 이 해석이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모양인지,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놓고 토론을 했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문학 수업의 모델이다.) 벤야민의 친구 프란츠 헤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 왕에 속한 가족들의 운명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운명은 그 자신의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벤야민이 친구의 말을 풀어 설명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가 어떤 뜻으로 한 말인지는 알겠다. 패전국의 왕과 그 자녀들이 고통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 가족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늙은 시종은 무슨 죄란 말인가. 비로소 왕은 죄책감에 몸부림 쳤다는 것.
한편 벤야민의 연인 아샤 라치스는 이렇게 해석했다고 한다. “실제의 삶에서는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는 것이 무대 위에서는 감동시키는 것이 많이 있다. 이 시종은 그 왕에게 단지 그러한 배우였을 뿐이다.” 알쏭달쏭한 말 같지만 그럴듯한 데가 있다. 우리는 정작 내 가족들의 고통은 무심하게 보아 넘기면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때는 펑펑 울기도 하질 않는가.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할 것 같은데 말이다. 가족에 비해 시종은 확실히 왕에게서 ‘떨어져’ 있는 존재다. 그 ‘거리’ 때문에 왕에게 시종은 일종의 극(劇)화된 비참으로 다가온 것일 수도 있었겠다.
이제 벤야민 자신의 해석을 들어볼 차례다. “거대한 고통은 정체되어 있다가 이완의 순간에 터져 나오는 법이다. 이 시종을 본 순간이 바로 그 이완의 순간이었다.” 예컨대 별안간 부모의 초상을 치르게 된 사람이 미처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는, 현관에 놓인 부모의 낡고 오래된 신발 한 짝을 보고 비로소 주저앉아 통곡하게 되는 상황 같은 것일까. 그럴 수도 있으리라. 벤야민은 자신의 해석까지 소개하고 나서 덧붙이기를, 헤로도토스가 왕의 심경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으므로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생명력을 갖게 된 것이라 했다.
이제 반전이 있다. 나는 벤야민의 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에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확인해 보고 놀랐다. 이야기 속 노인은 ‘시종’이 아니라 왕의 ‘친구’였다. 왕 자신의 해명도 이미 이야기 안에 있었다. “제 집안의 불행은 울고불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옵니다. 하지만 제 친구의 고통은 울어줄 만하옵니다.”(천병희 옮김) 이게 정답이라는 말은 아니다. 벤야민이 소개한 해석들이 내게는 여전히 더 흥미롭다. 그러나 직접 펼쳐 읽지 않았다면 원본은 다르다는 사실을 내내 몰랐으리라. 나는 다시 다짐한다. ‘무엇이건 네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마라. 아니, 눈으로 확인한 뒤에도, 당분간은 믿지 마라.’
<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
한편 벤야민의 연인 아샤 라치스는 이렇게 해석했다고 한다. “실제의 삶에서는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는 것이 무대 위에서는 감동시키는 것이 많이 있다. 이 시종은 그 왕에게 단지 그러한 배우였을 뿐이다.” 알쏭달쏭한 말 같지만 그럴듯한 데가 있다. 우리는 정작 내 가족들의 고통은 무심하게 보아 넘기면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때는 펑펑 울기도 하질 않는가.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할 것 같은데 말이다. 가족에 비해 시종은 확실히 왕에게서 ‘떨어져’ 있는 존재다. 그 ‘거리’ 때문에 왕에게 시종은 일종의 극(劇)화된 비참으로 다가온 것일 수도 있었겠다.
이제 벤야민 자신의 해석을 들어볼 차례다. “거대한 고통은 정체되어 있다가 이완의 순간에 터져 나오는 법이다. 이 시종을 본 순간이 바로 그 이완의 순간이었다.” 예컨대 별안간 부모의 초상을 치르게 된 사람이 미처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는, 현관에 놓인 부모의 낡고 오래된 신발 한 짝을 보고 비로소 주저앉아 통곡하게 되는 상황 같은 것일까. 그럴 수도 있으리라. 벤야민은 자신의 해석까지 소개하고 나서 덧붙이기를, 헤로도토스가 왕의 심경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으므로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생명력을 갖게 된 것이라 했다.
이제 반전이 있다. 나는 벤야민의 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에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확인해 보고 놀랐다. 이야기 속 노인은 ‘시종’이 아니라 왕의 ‘친구’였다. 왕 자신의 해명도 이미 이야기 안에 있었다. “제 집안의 불행은 울고불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옵니다. 하지만 제 친구의 고통은 울어줄 만하옵니다.”(천병희 옮김) 이게 정답이라는 말은 아니다. 벤야민이 소개한 해석들이 내게는 여전히 더 흥미롭다. 그러나 직접 펼쳐 읽지 않았다면 원본은 다르다는 사실을 내내 몰랐으리라. 나는 다시 다짐한다. ‘무엇이건 네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마라. 아니, 눈으로 확인한 뒤에도, 당분간은 믿지 마라.’
<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