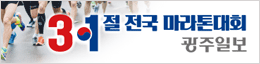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애물단지 전락하나
각종 규제 표적·새 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수도권 운행차량 질소산화물 정기검사까지
수도권 운행차량 질소산화물 정기검사까지
한 때 높은 연비를 앞세워 질주하던 경유차(디젤차)들이 최근 미세먼지 주범의 오명을 쓰고 각종 규제의 표적이 되면서 애물단지나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는 동시에, 내년부터는 심지어 새 차가 아닌 운행 중인 경유차(수도권 차량 한정)까지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고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23일 자동차 업계는 일단 신차 인증 때 배출가스 기준만 충족하면 운행 중 배출가스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낮은 만큼, 새 제도에 따른 기술·비용 측면의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이전 EU의 ‘유로5’ 기준보다 강화된 신차 배출가스 기준 ‘유로6’(질소산화물 0.08g/㎞ 이내)에 맞춰 디젤차를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연비·배기가스 측정방식(NEDC)보다 더 까다로운 국제표준시험방법(WLTP)과 ‘실제도로(Real Driving) 배출허용 기준(RED-LDV)’ 도입까지 대비해 신차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신차에 이 정도 높은 수준의 저감 장치가 탑재되면 이후 운행 중 검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준의 질소산화물이 검출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디젤차 규제 강화가 결국 소비자의 디젤차 수요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이미 업계는 최근 환경부가 잇따라 더 엄격한 디젤 신차 배기가스 검사 방식과 기준 도입을 추진하자, 이를 연기하고 시간을 버느라 진땀을 흘린 바 있다.
앞서 6월 29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새로 인증받는 디젤차 모델은 당장 10월부터, 현재 판매 중인 기존 디젤차 모델의 경우 2018년 9월 이후 실내인증시험 과정에 기존 연비·배기가스 측정방식(NEDC)보다 강화된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WLTP가 적용되면, 시험 중 주행거리와 평균·최고속도는 늘어나고 더 자주 감속·가속 상황이 연출된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테스트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기존 NEDC 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0.08g/㎞ 이하’ 기준(유로 6)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방침에 쌍용차, 르노삼성 등 일부 완성차업체들이 "기존 모델을 내년 9월까지 새 기준에 맞춰 출고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호소했고, 결국 환경부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안에서 기존 NEDC 기준에 맞춘 차량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처럼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될수록, 더 비싼 저감 장치가 필요한 만큼 필연적으로 디젤차 가격도 계속 오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디젤차를 주력 모델로 생산하는 업체 관계자는 "기존 모델을 새 WLTP 기준에 맞추려면 요소수로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인 SCR(선택적 촉매 환원장치)를 달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시스템 변경, 하부 재설계, 성능 최적화 등에 2년 이상의 기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 것이 더 많은데, 환경부가 미세먼지 절감 노력을 부각하기 위해 디젤차만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업계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이전 EU의 ‘유로5’ 기준보다 강화된 신차 배출가스 기준 ‘유로6’(질소산화물 0.08g/㎞ 이내)에 맞춰 디젤차를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연비·배기가스 측정방식(NEDC)보다 더 까다로운 국제표준시험방법(WLTP)과 ‘실제도로(Real Driving) 배출허용 기준(RED-LDV)’ 도입까지 대비해 신차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신차에 이 정도 높은 수준의 저감 장치가 탑재되면 이후 운행 중 검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준의 질소산화물이 검출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미 업계는 최근 환경부가 잇따라 더 엄격한 디젤 신차 배기가스 검사 방식과 기준 도입을 추진하자, 이를 연기하고 시간을 버느라 진땀을 흘린 바 있다.
앞서 6월 29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새로 인증받는 디젤차 모델은 당장 10월부터, 현재 판매 중인 기존 디젤차 모델의 경우 2018년 9월 이후 실내인증시험 과정에 기존 연비·배기가스 측정방식(NEDC)보다 강화된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WLTP가 적용되면, 시험 중 주행거리와 평균·최고속도는 늘어나고 더 자주 감속·가속 상황이 연출된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테스트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기존 NEDC 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0.08g/㎞ 이하’ 기준(유로 6)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방침에 쌍용차, 르노삼성 등 일부 완성차업체들이 "기존 모델을 내년 9월까지 새 기준에 맞춰 출고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호소했고, 결국 환경부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안에서 기존 NEDC 기준에 맞춘 차량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처럼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될수록, 더 비싼 저감 장치가 필요한 만큼 필연적으로 디젤차 가격도 계속 오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디젤차를 주력 모델로 생산하는 업체 관계자는 "기존 모델을 새 WLTP 기준에 맞추려면 요소수로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인 SCR(선택적 촉매 환원장치)를 달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시스템 변경, 하부 재설계, 성능 최적화 등에 2년 이상의 기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 것이 더 많은데, 환경부가 미세먼지 절감 노력을 부각하기 위해 디젤차만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