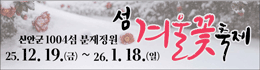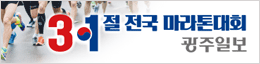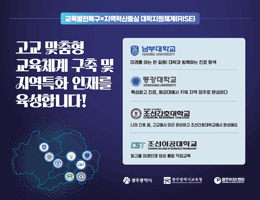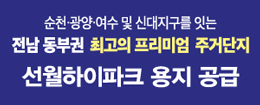곶감 - 김대성 전남 서·중부 전북 취재부장
깊고 진한 단맛의 곶감은 계절의 풍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떫었던 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맛으로 진해지고, 씹을수록 고유의 향이 입안에 가득한 것이 전래 민담에 나오듯 무서운 호랑이를 이길 만하다. 달콤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이라 ‘주황색 보석’으로도 불리는데 그만큼 귀하고 맛있다는 것이다.
곶감이 ‘곶’과 ‘감’의 결합이므로 ‘꼬챙이에 꽂은 감’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의미하는 ‘곶’에 방점을 두고 말리는 장소와 대상의 합성어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과거 감을 말리는 방법이 단순히 말리는 과정이 아니라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의 적절한 건조가 중요했기에 ‘곶’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곶감과 관련 지리적 표시제에 상주시와 산청군, 함양군, 영동군 등의 곶감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곳의 곶감이 맛과 질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다. 감을 말릴 때 정성과 기술을 담아 품질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인 결과로 겨울철 이 지역의 고유한 기후와 바람 덕분에 곶감이 더 맛있게 완성된다고 한다.
우리 지역에서도 순천과 광양, 장성 등지에서 곶감이 난다. 순천은 ‘월하시’ 품종을 조계산에서 불어오는 맑은 바람으로 자연 건조해 ‘순천꿀곶감’이라는 이름으로 생산하며, 장성에서는 주로 ‘대봉시’를 활용해 곶감을 만드는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쓰일 만큼 인기다.
곶감은 우리 민족에 있어 자연과 사람의 삶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제례에 빠지지 않고 올랐고 정을 나누는 선물로도 요긴하게 쓰였다. 손님이 올 때마다 곶감 한 조각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는 문화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왔다. 선조들은 가을에 수확한 감을 말려두고 겨울이 되면 가족이나 손님과 함께 나누며 그 달콤함을 음미했다. 이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계절의 변화를 존중하는 방식이었다.
인력난과 기후변화의 위기에 곶감 농사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아무쪼록 이 귀한 유산을 잘 보존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정겨운 향수로 오래 남아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대성 전남 서·중부 전북 취재부장
곶감과 관련 지리적 표시제에 상주시와 산청군, 함양군, 영동군 등의 곶감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곳의 곶감이 맛과 질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다. 감을 말릴 때 정성과 기술을 담아 품질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인 결과로 겨울철 이 지역의 고유한 기후와 바람 덕분에 곶감이 더 맛있게 완성된다고 한다.
곶감은 우리 민족에 있어 자연과 사람의 삶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제례에 빠지지 않고 올랐고 정을 나누는 선물로도 요긴하게 쓰였다. 손님이 올 때마다 곶감 한 조각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는 문화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왔다. 선조들은 가을에 수확한 감을 말려두고 겨울이 되면 가족이나 손님과 함께 나누며 그 달콤함을 음미했다. 이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계절의 변화를 존중하는 방식이었다.
인력난과 기후변화의 위기에 곶감 농사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아무쪼록 이 귀한 유산을 잘 보존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정겨운 향수로 오래 남아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대성 전남 서·중부 전북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