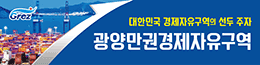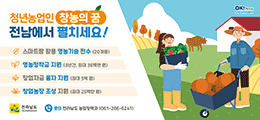그 흔하던 볏짚이 없어서 생긴 일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조사료 반출로 병해 늘어…벼 논 지력 회복 위해 환원사업을
조사료 반출로 병해 늘어…벼 논 지력 회복 위해 환원사업을
 /클립아트코리아 |
벼농사의 결실 중 쌀이 너무나 귀한 것이었다면 부산물인 볏짚은 그리 대접받지 못했다. 소작농이 많던 시대나 일제강점기 때 지주는 물론 일제도 쌀은 수탈했지만, 볏짚은 가벼이 여겨 손을 대지 않았다. 농민에게조차 하품으로 취급되면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취급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볏짚은 생활 전반에 유용했다. 마을 곳곳에 볏짚을 쌓아 놓았고, 집 안에도 여유 공간이 있으면 나중에 쓸 요량으로 가까운 곳에 준비해 뒀다.
볏짚의 쓰임은 다양했다. 우선 건축 자재로 이용했다. 초가집이 대부분이었을 때 농한기가 되면 동네 장정들은 두레패를 짜서 집마다 다니며 이엉을 엮어, 모든 집의 지붕을 새롭게 단장했다. 이때 볏짚이 긴히 사용됐다. 지붕만이 아니라 벽을 칠 때도 짚은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였다.
땔감으로는 얼마나 좋았는지, 집안 온돌을 데우기 위해 산에서 해온 장작이나 낙엽도 사용했지만 집 주변에 모아 두었던 짚은 난방용으로 제격이었다.
짚은 또 대부분의 생활 도구를 만드는 재료였다. 짚을 꼬아 촘촘히 엮으면 알곡이나 가루가 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저장 용기를 짚으로 만들었다. 멱서리는 알곡이나 왕겨 등을 담을 수 있는 용기였고, 멱둥그미는 고추나 콩 등을 짧은 기간 보관하기 위한 용기였다. 멍석은 흙바닥에 깔아 놓는 자리의 일종으로, 통풍이 잘되어 곡식을 말리고 사람들이 앉는 자리로도 썼다.
짚으로 만든 씨오쟁이, 망태 등은 습기가 차지 않아 썩을 염려가 없었다. 통풍이 잘 되어 다음 해 농사의 종자가 될 씨앗을 보관하는 용기로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 었다. 다듬잇돌을 올려놓는 다듬잇방석, 주둥이, 소등에 짐을 실을 때 쓰는 발채, 뚜껑을 예쁘게 만든 짚 독, 낫을 걸어 놓는 낫걸이, 낫 망태, 달걀 꾸러미, 토종 벌집을 덮은 멍덕, 주저리, 물동이를 이고 다닐 때 머리에 올려놓은 똬리, 짚방석, 닭 둥지, 심지어 짚 도시락까지 모든 생활 용구는 짚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농가에서 유용하게 썼던 짚은 가축에게 중요한 식량이었다. 농가에서 소는 땅 만큼이나 중요한 재산은 없었는데 소를 키울 때 쇠여물의 주재료가 바로 볏짚이었다. 볏짚은 보리짚이나 밀짚보다 부드러워서 소먹이로 적당했다.
이와 함께 짚은 비료의 중요한 재료였다.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시기엔 중요한 것이 시비(施肥)였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쓰였던 것이 두엄이다. 두엄은 인분(人糞)이나 외양간에 깔았던 짚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요긴하게 썼던 볏짚이 언제부턴가 사라졌다. 농업과 생활의 현대화에 따른 것인데 건축 자재는 벽돌과 콘크리트로 대체되고 땔감은 연탄이나 석유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가축의 식량 역시 대부분 사료를 사용하면서 쓰임이 줄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함에 따라 볏짚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확기 잦은 강우와 이상고온으로 벼 깨씨무늬병이 확산한데 따른 것인데, 전문가들은 지력 저하를 재해 확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한다. 볏짚이 유기물인데 논에 환원해야 하는 볏짚이 수년째 조사료로 반출되고 지력이 약해지면서 매년 ‘깨씨무늬병’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농정 당국이 벼 깨씨무늬병 확산과 수확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업부산물(볏짚) 자연 순환형 환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사업은 볏짚을 조사료로 쓰거나 소각, 폐기하는 대신 예전처럼 잘게 절단해 논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인데 현재로선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스럽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병해 저항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 복합적인 효과를 낼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자연에서 얻은 모든 산물은 당연히 그 뿌리가 되는 땅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는 이치를 돌이켜 봐야 한다. 그래야만 농사의 기본대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병해충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bigkim@kwangju.co.kr
하지만 이런 취급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볏짚은 생활 전반에 유용했다. 마을 곳곳에 볏짚을 쌓아 놓았고, 집 안에도 여유 공간이 있으면 나중에 쓸 요량으로 가까운 곳에 준비해 뒀다.
땔감으로는 얼마나 좋았는지, 집안 온돌을 데우기 위해 산에서 해온 장작이나 낙엽도 사용했지만 집 주변에 모아 두었던 짚은 난방용으로 제격이었다.
짚으로 만든 씨오쟁이, 망태 등은 습기가 차지 않아 썩을 염려가 없었다. 통풍이 잘 되어 다음 해 농사의 종자가 될 씨앗을 보관하는 용기로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 었다. 다듬잇돌을 올려놓는 다듬잇방석, 주둥이, 소등에 짐을 실을 때 쓰는 발채, 뚜껑을 예쁘게 만든 짚 독, 낫을 걸어 놓는 낫걸이, 낫 망태, 달걀 꾸러미, 토종 벌집을 덮은 멍덕, 주저리, 물동이를 이고 다닐 때 머리에 올려놓은 똬리, 짚방석, 닭 둥지, 심지어 짚 도시락까지 모든 생활 용구는 짚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농가에서 유용하게 썼던 짚은 가축에게 중요한 식량이었다. 농가에서 소는 땅 만큼이나 중요한 재산은 없었는데 소를 키울 때 쇠여물의 주재료가 바로 볏짚이었다. 볏짚은 보리짚이나 밀짚보다 부드러워서 소먹이로 적당했다.
이와 함께 짚은 비료의 중요한 재료였다.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시기엔 중요한 것이 시비(施肥)였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쓰였던 것이 두엄이다. 두엄은 인분(人糞)이나 외양간에 깔았던 짚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요긴하게 썼던 볏짚이 언제부턴가 사라졌다. 농업과 생활의 현대화에 따른 것인데 건축 자재는 벽돌과 콘크리트로 대체되고 땔감은 연탄이나 석유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가축의 식량 역시 대부분 사료를 사용하면서 쓰임이 줄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함에 따라 볏짚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확기 잦은 강우와 이상고온으로 벼 깨씨무늬병이 확산한데 따른 것인데, 전문가들은 지력 저하를 재해 확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한다. 볏짚이 유기물인데 논에 환원해야 하는 볏짚이 수년째 조사료로 반출되고 지력이 약해지면서 매년 ‘깨씨무늬병’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농정 당국이 벼 깨씨무늬병 확산과 수확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업부산물(볏짚) 자연 순환형 환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사업은 볏짚을 조사료로 쓰거나 소각, 폐기하는 대신 예전처럼 잘게 절단해 논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인데 현재로선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스럽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병해 저항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 복합적인 효과를 낼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자연에서 얻은 모든 산물은 당연히 그 뿌리가 되는 땅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는 이치를 돌이켜 봐야 한다. 그래야만 농사의 기본대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병해충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