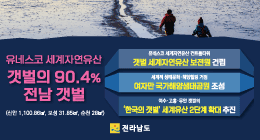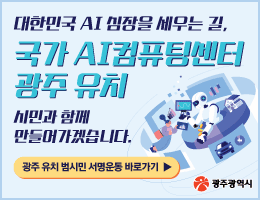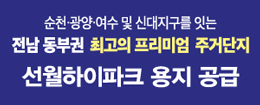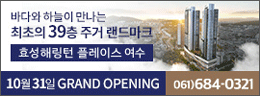고수온에 흑산도 어장 흔들
홍어·문어·소라·전복·우럭 등
어획양·양식장 출하량 영향
어획양·양식장 출하량 영향
 |
기후 위기로 서해 남부 흑산도 어장이 흔들리고 있다. 흑산도의 뜨거운 바다는 계속해서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양식업계와 해양환경 전문가들도 긴장하고 있다.
29일 국립수산과학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흑산도의 연도별 최고 기온은 2021년 27.1도, 2022년 28.0도, 2023년 27.8도, 2024년 26.8도, 올해 28.6도다. 지난 7월 29일 흑산도에 고수온 주의보가 추가 발령됐고 8월 19일과 9월 6일에는 역대 최고온도인 28.6도가 관측됐다.
수온 이상은 곧바로 어획량 및 양식장 출하량, 수산자원의 품질 이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흑산수협 집계에 따르면 대표 연근해종인 홍어는 2020년 1109t에서 2024년 417t으로 어획량이 급감했다.
문어도 어획량이 늘긴 했지만 폐사된 게 적지 않다. 통발 위주로 조업이 이뤄지는 흑산 문어의 경우 지금까지 따로 분리하지 않다 고수온기에 폐사가 많아지면서따로 분류했더니 4.4t이나 나왔다. 어민들은 햇빛으로 윗물 수온이 높아지면 문어가 예년보다 먹이 활동을 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라도 유통 단계의 손실이 커졌다.
양현우 흑산수협 계장은 “100kg 단위로 경매해도 실제로는 60kg이 죽고 40kg만 살아 남을 때가 많다. 패각류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을 까봐야 죽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보이지 않는 피해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연산 전복은 사실상 사라졌다. 2023년만 해도 1106kg(6400만원)이나 됐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위판 실적이 없다. 전복 가격이 너무 떨어져 해녀들이 채취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양식 전복도 생산비에 따른 압박이 거세지면서 2024년 89t(21억 800만원), 2025년 39t(7억 8200만원)으로 줄었고 양식 우럭은 전국적으로 고수온 폐사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1769t(258억8800만원)에서 올 들어서는 1251t(215억7200만원)으로 출하 물량이 부족해졌다.
흑산면에서 25년째 전복을 키워온 박춘배 씨(51)는 “치패는 한 마리에 300~330원이고, 한 번에 3억들여서 사오는데 열심히 키워도 한마리당 1300원이 안나온다. 생산비랑 수지타산이 안맞으니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우럭양식 어민들은 현재 보상단가는 치어 1마리당 665원, 성어 마리당 188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판매단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년째 우럭양식을 하고 있는 김경식(29)씨는 “가두리 한 칸에 7000마리가 살고 있는데, 망을 올려보면 요즘은 절반이 죽어있다”며 “올해 연간 보험료만 8000만원이 나와서 가입도 못 했다. 보상받으려면 생물 피해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통계 집계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흑산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
29일 국립수산과학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흑산도의 연도별 최고 기온은 2021년 27.1도, 2022년 28.0도, 2023년 27.8도, 2024년 26.8도, 올해 28.6도다. 지난 7월 29일 흑산도에 고수온 주의보가 추가 발령됐고 8월 19일과 9월 6일에는 역대 최고온도인 28.6도가 관측됐다.
흑산수협 집계에 따르면 대표 연근해종인 홍어는 2020년 1109t에서 2024년 417t으로 어획량이 급감했다.
문어도 어획량이 늘긴 했지만 폐사된 게 적지 않다. 통발 위주로 조업이 이뤄지는 흑산 문어의 경우 지금까지 따로 분리하지 않다 고수온기에 폐사가 많아지면서따로 분류했더니 4.4t이나 나왔다. 어민들은 햇빛으로 윗물 수온이 높아지면 문어가 예년보다 먹이 활동을 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양현우 흑산수협 계장은 “100kg 단위로 경매해도 실제로는 60kg이 죽고 40kg만 살아 남을 때가 많다. 패각류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을 까봐야 죽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보이지 않는 피해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연산 전복은 사실상 사라졌다. 2023년만 해도 1106kg(6400만원)이나 됐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위판 실적이 없다. 전복 가격이 너무 떨어져 해녀들이 채취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양식 전복도 생산비에 따른 압박이 거세지면서 2024년 89t(21억 800만원), 2025년 39t(7억 8200만원)으로 줄었고 양식 우럭은 전국적으로 고수온 폐사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1769t(258억8800만원)에서 올 들어서는 1251t(215억7200만원)으로 출하 물량이 부족해졌다.
흑산면에서 25년째 전복을 키워온 박춘배 씨(51)는 “치패는 한 마리에 300~330원이고, 한 번에 3억들여서 사오는데 열심히 키워도 한마리당 1300원이 안나온다. 생산비랑 수지타산이 안맞으니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우럭양식 어민들은 현재 보상단가는 치어 1마리당 665원, 성어 마리당 188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판매단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년째 우럭양식을 하고 있는 김경식(29)씨는 “가두리 한 칸에 7000마리가 살고 있는데, 망을 올려보면 요즘은 절반이 죽어있다”며 “올해 연간 보험료만 8000만원이 나와서 가입도 못 했다. 보상받으려면 생물 피해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통계 집계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흑산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