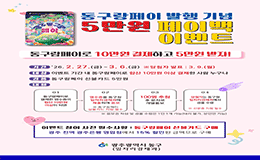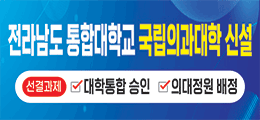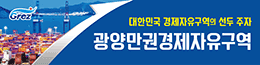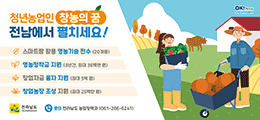[조인호의 키워드로 읽는 광주·전남 미술사] 공공 조형물로 기틀 … 자연·시대정신 반영 ‘남도 맥’ 이어
(9 ) 남도 현대조각의 형성-김영중·탁연하·양두환
■ 김영중
1926년 장성 출신…전국에 공공 조형물 설치
문화예술 행정규범 마련 등 조각계 거목
■ 탁연하
1953년 광주 상무대 을지문덕상 건립 제안
제작 참여하며 동상으로 남도 조각 터 다져
■ 김영중
1926년 장성 출신…전국에 공공 조형물 설치
문화예술 행정규범 마련 등 조각계 거목
■ 탁연하
1953년 광주 상무대 을지문덕상 건립 제안
제작 참여하며 동상으로 남도 조각 터 다져
 김영중 ‘큰 뜻’, 1983, 중외공원 (옛 어린이공원) |
호남 현대미술에서 조각 쪽은 한국화나 서양화에 비하면 전공작가들의 등단이나 무리 형성이 늦은 편이다. 긴 화맥의 한국화단은 말할 것도 없고, 1940년대 후반 들어 공적 활동이 시작된 서양화단에 비해 조각계는 1960년대에 이르러서이기 때문이다. 서구식 조각의 기준으로는 남도의 삶과 정서가 배인 불상, 장승·벅수 등 전통조각과는 결이 달라 그 공백이 크다. 여기 취미나 정신활동의 일환으로 그림을 더 높이 치는 전통적 문화관에서 육신의 노동을 피할 수 없는 조각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료로 가장 이른 예는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결성된 ‘목포미술동맹’ 조각부에 동경미술학교 조각과를 졸업한 박승구(朴勝龜)의 참여다. 1919년 수원 출생이고, 1945년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졸업 후 서울에서 중등 미술교원으로 교단에 서며 1949년 ‘제1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國展)에서 ‘성관음상(聖觀音像)’으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고 한국전쟁 때 월북한 그가 어떻게 목포미술동맹에 이름을 올렸는지 알 수 없다. 또한, 1947년 광주 중앙국민학교 강당에서 열린 ‘제1회 조선미술동맹 광주지부 전람회’에 인물초상을 출품한 김수암과 조각가로 기록된 정우택이 있는데, 어떤 작품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남도조각의 대부 김영중
1926년 장성 출신…전국에 공공 조형물 설치
문화예술 행정규범 마련 등 조각계 거목
조형성 중시하며 문명·인간 존재 등 함축
추상 조각 모임 창립·광주비엔날레 창설 제안
이 지역 출신으로 일찍이 남도 현대조각의 터를 다진 이는 장성 출신 김영중(金泳中, 1926~2005)이다. 그는 전시회보다는 공공 조형물을 전국 곳곳에 설치하고,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행정규범이나 제도 마련 등에서 더 폭넓은 활동을 펼친 한국 현대조각계의 거목이다. 광주농업고등학교 재학 시절 조각부에서 진흙으로 소조를 처음 손댔고, 1948년 서울대 예술대학 미술학부에 입학해서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출신인 김종영(金鍾瑛)의 지도로 조각을 전공했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 피난 겸 진도중학교에서 목각과 도자기 등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미술을 지도하기도 했다.
1954년 홍익대학교 조각과로 편입해서 동경미술학교 출신으로 당시 기념조각상 대부분을 맡던 윤효중(尹孝重)의 제자 겸 조수로 현대조각과 공공조형물 작업을 익혔다. 1958년 ‘제7회 국전’ 때 ‘장갑 낀 여인’으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고, 1963년에는 국내 첫 실험적 추상조각 모임인 ‘원형조각회’를 결성하고 창립전도 열었다. 이 시기 구조적 조형성을 중시하면서 현대문명과 자연 생명, 인간존재의 관계를 함축시킨 반추상 작업과 더불어 가마솥이나 폐고철 등을 이용한 반 기계주의 개념의 비정형(앵포르멜) 철조작업을 계속했다.
김영중이 남도조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것은 ‘전라남도 미술전람회’(道展)의 심사위원으로 첫 회부터 20회까지 계속 참여하면서다(16·17회 제외). 공모전 출품을 계기 삼아 작품도 제작하고 관전 입상경력을 쌓으려는 지역 미술인들에겐 일년 농사나 마찬가지였던 ‘도전’의 위세만큼이나 심사위원의 영향력도 대단하던 시절이었다. 이제 갓 씨앗이 돋기 시작한 지역 조각계에서 미술학도나 청년조각가들의 관심이 집중된 ‘도전’ 심사를 고리로 고향 후배들도 챙기면서 자신의 무게감을 만들어 갔다.
김영중은 말라 시든 해바라기를 소재로 구상한 1960~70년대 추상조각과 사실적 기념동상 작업을 병행했다. 또한 1980년대부터는 인체를 단순 조형화해 역동감과 율동감을 높이는 공공조각상들(세중문화회관 외벽 ‘비천상’ 부조, 독립기념관 ‘강인한 한국인상’ 등)으로 독자적인 조형세계를 펼쳐냈다. 이와 함께 1982년 목포 유달산에 전국 최초로 야외조각공원을 조성하고, 같은 해 광주 어린이공원에 ‘큰 뜻’ 조형물을 비롯, 이후 88고속도로 지리산 휴게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등 전국 곳곳에 공공조형물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5·18 이후 침체된 광주의 도시문화 변화를 위해 광주비엔날레 창설을 제안해 1995년 첫 문을 열게 하고, 이를 기념하는 아치형 육교 조형물 ‘경계를 넘어’(무지개다리)를 호남고속도로 서광주 나들목에 설치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동상제작으로 남도조각의 터를 다진 탁연하
1953년 광주 상무대 을지문덕상 건립 제안
제작 참여하며 동상으로 남도 조각 터 다져
광주 어린이 헌장탑·충혼탑 등 다수 작품
조선대 출강 이후 서울서 조경분야 활동
남도 조각의 공적인 역사는 기념동상으로 시작되었다. 그 첫 선도자가 목포 출생인 탁연하(卓鍊河, 1932~)다. 한국전쟁 시기 광주 상무대 헌병대 문관으로 근무하던 1953년 ‘을지문덕상’ 건립을 제안하고 제작에 함께 참여했다. 피난 중이던 평양미술학교 출신 박제소와 차근호와 팀을 이루고, 부산에서 피난 중이던 김찬식과 김순득까지 불러와 7m 높이의 대형 조각상을 만들었다. 금동 최부자집 창고를 빌려 작업할 때 처음 보는 대규모 인물상 제작과정이 시민들의 구경거리였다. 짧은 기간과 기술 부족으로 허리 부분이 벌어져 즉결처분 위기까지 넘기면서 진해 해군공창에서 포탄 탄피를 녹여 주물을 떠 와 가까스로 작업을 마무리했다.
일반인과는 격리된 군부대 내였지만 광주의 첫 서구식 기념동상이자 공공조형물이었다. 이 작업에 참여했던 김찬식은 1954년 광주 미국공보원에서 사실적인 석고조각상들로 국내 첫 조각 개인전을 열었다.
탁연하는 홍익대학교 조각과에 편입해서 윤효중 교수의 기념조각상 제작을 도우며 전공 과정을 마쳤다. 재학 중 육군사관학교 ‘화랑기마상’(1956)을 비롯 50년대 후반 각 기별 졸업기념 조형물을 도맡다가 1959년 광주공원 ‘어린이 헌장탑’현상공모에 당선되어 다시 광주로 내려왔다. 광주에서 ‘4.19학생의거 기념탑’과 ‘충혼탑’(1961, 광주공원), ‘어린이 헌장탑’(1966, 목포 유달공원), ‘충무공 이순신장군 동상’(1967, 여수 수정공원), ‘문열공 김천일장군 동상’(1968, 나주공원), ‘충무공 이순신장군 동상’ ‘강감찬장군 동상’ ‘충장공 김덕령장군 동상’(1972, 광주 상무공원), ‘충무공 이순신장군 동상’(1974, 목포 유달공원) 등 수많은 기념동상을 제작했다. 이 시기에 설계사무소를 열어 제일극장 건축을 비롯해 여러 실내장식을 맡기도 하면서 조선대학교 공대와 미술과에 출강하다가 1970년대 중반 서울로 활동지를 옮겼다. 이후 건축과 조경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단순 간결한 추상조각 ‘트위스트’ 연작을 발표하기도 했다.
◇목조각에 열정을 쏟은 양두환
진도농고 재학시절 화강암으로 조각 시작
1967년 전남도전서 목조각 ‘양지’로 최고상
‘풍요’·‘상황 72’로 2회 연속 문공부장관상
이전의 서정성 대신 민족 분단 등 시의성 담아
남도조각에서 독보적이고 짧은 생이 아쉬운 조각가가 진도 출신 양두환(梁斗煥, 1941~74)이다. 진도농고 재학시절 미술에 대한 열망으로 귀한 화구 대신 주변에 흔한 화강암을 쪼으며 조각을 시작했다. 군복무 후 행남사에 근무하며 ‘국전’에 연속 입선하는 재주를 아깝게 여긴 주변의 권유로 늦깎이로 조선대학교에 입학했고, 1학년 때인 1967년 ‘제3회 전남도전]에서 목조각 ‘양지’로 최고상을 수상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계속해서 연속 특선과 우수상을 차지하다가 졸업 직후 석산고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한 1971년과 이듬해 연속으로 ‘국전’에서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하여 지역 미술계를 크게 고무시켰다.
양두환의 ‘제20회 국전’ 문공부장관상 수상작 ‘풍요’(1971)는 과일광주리를 머리에 인 여인 앞에 사내아이를 세운 모자상이다. 통나무 표면에 잔잔한 칼맛으로 질감을 내면서 엷은 옷으로 신체 골격과 살붙임을 드러냈다. 이듬해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한 ‘상황 72’(1972)는 이전의 서정성 대신 시사성을 담은 야심작이다. 애절한 표정의 두 남녀가 높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서 있고, 남자 손에는 비둘기, 아래쪽에 사내아이, 구멍이 뚫린 장벽에는 쇠사슬 오브제를 구성했다. 당시 민족분단과 이산가족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1972~73년)과 ‘7.4남북공동성명’(1972) 발표 등 남북 교류와 정치 교섭이 진행되던 시기의 시의성이 담긴 조형작업이다.
2회 연속 문공부장관상 수상에 힘을 얻는 그는 이듬해 더 열정을 쏟아 ‘상황-73’을 ‘국전’에 출품했다. 벼락에 쓰러진 진도의 당산나무 거목을 옮겨다 한쪽 무릎을 꿇은 여인과 뒤에 아이를 안고 선 남자, 그 사이를 창살 꽂힌 구멍들과 쇠사슬이 얽힌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서사적 연출의 작품이다. 대통령상을 바라며 혼신을 쏟아부었지만, 그러나 결과는 입선이었다. 장대한 구성에 맞추려다 보니 해부학적 골격과 비례가 크게 어긋나 있었다. 유럽 유학 등 다음 단계까지 구상하며 원대한 포부의 전기로 삼으려던 시점에서 뜻밖의 좌절은 심각한 심적 타격과 실의에 빠지게 했고, 이듬해 1974년 2월 우연찮은 사고로 33세에 갑자기 요절하고 말았다.
조인호 전문가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
▲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 홍익대 대학원 한국미술사 전공.
▲ (재)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 정책기획실장 역임
▲‘남도미술의 숨결’, ‘광주 현대미술의 현장’ 등 출간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1926년 장성 출신…전국에 공공 조형물 설치
문화예술 행정규범 마련 등 조각계 거목
조형성 중시하며 문명·인간 존재 등 함축
추상 조각 모임 창립·광주비엔날레 창설 제안
이 지역 출신으로 일찍이 남도 현대조각의 터를 다진 이는 장성 출신 김영중(金泳中, 1926~2005)이다. 그는 전시회보다는 공공 조형물을 전국 곳곳에 설치하고,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행정규범이나 제도 마련 등에서 더 폭넓은 활동을 펼친 한국 현대조각계의 거목이다. 광주농업고등학교 재학 시절 조각부에서 진흙으로 소조를 처음 손댔고, 1948년 서울대 예술대학 미술학부에 입학해서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출신인 김종영(金鍾瑛)의 지도로 조각을 전공했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 피난 겸 진도중학교에서 목각과 도자기 등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미술을 지도하기도 했다.
1954년 홍익대학교 조각과로 편입해서 동경미술학교 출신으로 당시 기념조각상 대부분을 맡던 윤효중(尹孝重)의 제자 겸 조수로 현대조각과 공공조형물 작업을 익혔다. 1958년 ‘제7회 국전’ 때 ‘장갑 낀 여인’으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고, 1963년에는 국내 첫 실험적 추상조각 모임인 ‘원형조각회’를 결성하고 창립전도 열었다. 이 시기 구조적 조형성을 중시하면서 현대문명과 자연 생명, 인간존재의 관계를 함축시킨 반추상 작업과 더불어 가마솥이나 폐고철 등을 이용한 반 기계주의 개념의 비정형(앵포르멜) 철조작업을 계속했다.
김영중이 남도조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것은 ‘전라남도 미술전람회’(道展)의 심사위원으로 첫 회부터 20회까지 계속 참여하면서다(16·17회 제외). 공모전 출품을 계기 삼아 작품도 제작하고 관전 입상경력을 쌓으려는 지역 미술인들에겐 일년 농사나 마찬가지였던 ‘도전’의 위세만큼이나 심사위원의 영향력도 대단하던 시절이었다. 이제 갓 씨앗이 돋기 시작한 지역 조각계에서 미술학도나 청년조각가들의 관심이 집중된 ‘도전’ 심사를 고리로 고향 후배들도 챙기면서 자신의 무게감을 만들어 갔다.
김영중은 말라 시든 해바라기를 소재로 구상한 1960~70년대 추상조각과 사실적 기념동상 작업을 병행했다. 또한 1980년대부터는 인체를 단순 조형화해 역동감과 율동감을 높이는 공공조각상들(세중문화회관 외벽 ‘비천상’ 부조, 독립기념관 ‘강인한 한국인상’ 등)으로 독자적인 조형세계를 펼쳐냈다. 이와 함께 1982년 목포 유달산에 전국 최초로 야외조각공원을 조성하고, 같은 해 광주 어린이공원에 ‘큰 뜻’ 조형물을 비롯, 이후 88고속도로 지리산 휴게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등 전국 곳곳에 공공조형물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5·18 이후 침체된 광주의 도시문화 변화를 위해 광주비엔날레 창설을 제안해 1995년 첫 문을 열게 하고, 이를 기념하는 아치형 육교 조형물 ‘경계를 넘어’(무지개다리)를 호남고속도로 서광주 나들목에 설치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양두환 ‘상황 72’,1972, 목조, ‘제21회 국전’문공부장관상 수상작. |
1953년 광주 상무대 을지문덕상 건립 제안
제작 참여하며 동상으로 남도 조각 터 다져
광주 어린이 헌장탑·충혼탑 등 다수 작품
조선대 출강 이후 서울서 조경분야 활동
남도 조각의 공적인 역사는 기념동상으로 시작되었다. 그 첫 선도자가 목포 출생인 탁연하(卓鍊河, 1932~)다. 한국전쟁 시기 광주 상무대 헌병대 문관으로 근무하던 1953년 ‘을지문덕상’ 건립을 제안하고 제작에 함께 참여했다. 피난 중이던 평양미술학교 출신 박제소와 차근호와 팀을 이루고, 부산에서 피난 중이던 김찬식과 김순득까지 불러와 7m 높이의 대형 조각상을 만들었다. 금동 최부자집 창고를 빌려 작업할 때 처음 보는 대규모 인물상 제작과정이 시민들의 구경거리였다. 짧은 기간과 기술 부족으로 허리 부분이 벌어져 즉결처분 위기까지 넘기면서 진해 해군공창에서 포탄 탄피를 녹여 주물을 떠 와 가까스로 작업을 마무리했다.
일반인과는 격리된 군부대 내였지만 광주의 첫 서구식 기념동상이자 공공조형물이었다. 이 작업에 참여했던 김찬식은 1954년 광주 미국공보원에서 사실적인 석고조각상들로 국내 첫 조각 개인전을 열었다.
탁연하는 홍익대학교 조각과에 편입해서 윤효중 교수의 기념조각상 제작을 도우며 전공 과정을 마쳤다. 재학 중 육군사관학교 ‘화랑기마상’(1956)을 비롯 50년대 후반 각 기별 졸업기념 조형물을 도맡다가 1959년 광주공원 ‘어린이 헌장탑’현상공모에 당선되어 다시 광주로 내려왔다. 광주에서 ‘4.19학생의거 기념탑’과 ‘충혼탑’(1961, 광주공원), ‘어린이 헌장탑’(1966, 목포 유달공원), ‘충무공 이순신장군 동상’(1967, 여수 수정공원), ‘문열공 김천일장군 동상’(1968, 나주공원), ‘충무공 이순신장군 동상’ ‘강감찬장군 동상’ ‘충장공 김덕령장군 동상’(1972, 광주 상무공원), ‘충무공 이순신장군 동상’(1974, 목포 유달공원) 등 수많은 기념동상을 제작했다. 이 시기에 설계사무소를 열어 제일극장 건축을 비롯해 여러 실내장식을 맡기도 하면서 조선대학교 공대와 미술과에 출강하다가 1970년대 중반 서울로 활동지를 옮겼다. 이후 건축과 조경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단순 간결한 추상조각 ‘트위스트’ 연작을 발표하기도 했다.
 |
진도농고 재학시절 화강암으로 조각 시작
1967년 전남도전서 목조각 ‘양지’로 최고상
‘풍요’·‘상황 72’로 2회 연속 문공부장관상
이전의 서정성 대신 민족 분단 등 시의성 담아
남도조각에서 독보적이고 짧은 생이 아쉬운 조각가가 진도 출신 양두환(梁斗煥, 1941~74)이다. 진도농고 재학시절 미술에 대한 열망으로 귀한 화구 대신 주변에 흔한 화강암을 쪼으며 조각을 시작했다. 군복무 후 행남사에 근무하며 ‘국전’에 연속 입선하는 재주를 아깝게 여긴 주변의 권유로 늦깎이로 조선대학교에 입학했고, 1학년 때인 1967년 ‘제3회 전남도전]에서 목조각 ‘양지’로 최고상을 수상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계속해서 연속 특선과 우수상을 차지하다가 졸업 직후 석산고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한 1971년과 이듬해 연속으로 ‘국전’에서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하여 지역 미술계를 크게 고무시켰다.
양두환의 ‘제20회 국전’ 문공부장관상 수상작 ‘풍요’(1971)는 과일광주리를 머리에 인 여인 앞에 사내아이를 세운 모자상이다. 통나무 표면에 잔잔한 칼맛으로 질감을 내면서 엷은 옷으로 신체 골격과 살붙임을 드러냈다. 이듬해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한 ‘상황 72’(1972)는 이전의 서정성 대신 시사성을 담은 야심작이다. 애절한 표정의 두 남녀가 높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서 있고, 남자 손에는 비둘기, 아래쪽에 사내아이, 구멍이 뚫린 장벽에는 쇠사슬 오브제를 구성했다. 당시 민족분단과 이산가족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1972~73년)과 ‘7.4남북공동성명’(1972) 발표 등 남북 교류와 정치 교섭이 진행되던 시기의 시의성이 담긴 조형작업이다.
2회 연속 문공부장관상 수상에 힘을 얻는 그는 이듬해 더 열정을 쏟아 ‘상황-73’을 ‘국전’에 출품했다. 벼락에 쓰러진 진도의 당산나무 거목을 옮겨다 한쪽 무릎을 꿇은 여인과 뒤에 아이를 안고 선 남자, 그 사이를 창살 꽂힌 구멍들과 쇠사슬이 얽힌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서사적 연출의 작품이다. 대통령상을 바라며 혼신을 쏟아부었지만, 그러나 결과는 입선이었다. 장대한 구성에 맞추려다 보니 해부학적 골격과 비례가 크게 어긋나 있었다. 유럽 유학 등 다음 단계까지 구상하며 원대한 포부의 전기로 삼으려던 시점에서 뜻밖의 좌절은 심각한 심적 타격과 실의에 빠지게 했고, 이듬해 1974년 2월 우연찮은 사고로 33세에 갑자기 요절하고 말았다.
 김영중 ‘경계를 넘어’(무지개다리), 1995, 철조, 서광주I.C. <조인호 전문가 제공> |
▲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 홍익대 대학원 한국미술사 전공.
▲ (재)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 정책기획실장 역임
▲‘남도미술의 숨결’, ‘광주 현대미술의 현장’ 등 출간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