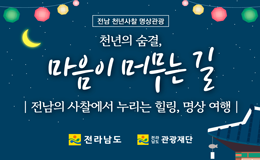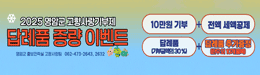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차와 대흥사
 |
최근에 대흥사에 들렀다. 해남의 너른 땅은 두륜산에서 제대로 깊어진다. 초의선사가 머물던 초당까지 올라갔다. 예상과 다른 위치에 선방이자 다실이 있다. 전후에 폐허가 되고 허물어진 것을 나중에 복원하였다 한다. 다실이 있는 곳은 그 좋은 대흥사 가람 위치에서도 한참 떨어진달까,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처사가 봐도 당최 왜 이런 곳에 다실이 있을까 싶을 정도다. 그게 초의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더 낮게, 더 소박하게. 그의 차 마음도 그랬다.
초의는 조선 차를 부흥하고 일으켜서 다성(茶聖)이라 한다. 이미 조선에서 불교가 많이 기울어서 쇠락해진 때였다. 스님들은 초의를 따라 버려진 차밭을 일구고 다시 기도의 마음을 붙들 수 있었으리라. 초의는 당시 많은 당대 지식들과 교유했다. 김정희, 정약용과 이룬 교분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서울에도 들렀는데 봉은사에서 그를 기다리던 명망가들에게 차와 불법을 전수했다고 전한다. 도성 안에서 모임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김정희, 홍현주 등이 그 자리에 있었다. 김정희는 다 아는 추사이고, 홍현주는 누구인가. 바로 정조의 딸 숙선옹주와 혼인해 영명위(永明尉)로 불린 사위가 아닌가. 그는 문학과 서화, 풍류에 조예가 깊었고 차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다. 홍현주는 당시 지인인 진도 부사 변지화를 통해 초의선사에게 차문화에 관한 질문과 자료 요청을 전했다.
초의선사는 이에 응답하듯 ‘동다행(東茶行)’이라는 제목으로 초안을 작성했고, 이후 필사 및 정정 과정을 거쳐 ‘동다송(東茶頌)’이라는 이름으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칠언절구 형식의 17송(章)으로 구성돼 차의 역사와 종류, 제다법, 차 맛 감별법, 차를 마시는 예법 등 차 문화의 전모를 시적 언어로 정리했다. 이는 조선 후기 쇠퇴하던 차 문화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문학적으로 승화한 기록물로 평가된다. 불교 수행과 더불어 차문화를 연구·실천하면서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사상을 발전시킨 일대 사건이자 혁명에 가까운 일이었다.
한국인은 어느샌가 커피에 깊게 빠져 있다. ‘얼죽아’(얼어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는 뜻)라는 말이 흔하게 쓰일 만큼 커피는 일상이다. 기호음료를 즐기는 것을 뭐라 할 수 없다. 다만 우리에게는 좋은 차 문화도 있는데 균형이 너무 기울었다.
요즘 말차가 유행이라고 한다. 말차도 좋지만 이 기회에 맑은 우리 차를 마셔보는 기회가 많은 이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나도 커피를 마시지만, 차는 소중한 마음으로 또 아낀다. 차는 알 수 없는 선격(仙格)과 품위가 있다. 몇 번이고 우릴 수 있고, 그때마다 다른 맛을 보여준다. 차 한 잔에 인간의 일생이 압축되어 있는 듯하다. 힘차게 파릇한 기운이 첫 잔이라면, 서너 번째 우리면 은은하고 여운이 짙다. 몇 번이고 마시면서 차의 변화를 그 짧은 시간에 두루 맛볼 수 있다. 그게 차의 힘이다. 굳이 말하자면, 카페인도 커피보다 훨씬 적어서(보통 20퍼센트 내외) 여러 잔을 마셔도 부담이 적다. 명징해지는 정신은 물론 차의 가장 큰 선물이다.
초의선사는 차를 재배하고 따고 말리고 덖고 마시는 전 과정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고 보았다. 노동하는 일이야말로 차의 세계라고 생각했다. 차는 또한 나누는 것이라 했다. 한 봉지의 작은 차를 벗에게, 선생님에게 나누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소중한 기억을 남기는 일이다.
예전에 한 선배는 내가 찾아가면 마시고 있는 차 봉지를 열어 한 줌이라도 나눴다. 차는 그렇게 줘도 결례가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차의 마음에는 순정한 나눔이 있는 셈이다.
가을이 되었다. 남쪽에는 머지않아 단풍이 들 것이다. 올해 단풍도 별로라는 말이 있다. 날씨가 너무 더우면 단풍이 곱게 들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래도 초의가 머물면서 차 향을 영원히 가람에 채워둔 아름다운 대흥사에 가보시라. 아니면 집에서, 찻집에서 차 한 잔을 우려 마시는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음식 칼럼니스트>
그는 서울에도 들렀는데 봉은사에서 그를 기다리던 명망가들에게 차와 불법을 전수했다고 전한다. 도성 안에서 모임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김정희, 홍현주 등이 그 자리에 있었다. 김정희는 다 아는 추사이고, 홍현주는 누구인가. 바로 정조의 딸 숙선옹주와 혼인해 영명위(永明尉)로 불린 사위가 아닌가. 그는 문학과 서화, 풍류에 조예가 깊었고 차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다. 홍현주는 당시 지인인 진도 부사 변지화를 통해 초의선사에게 차문화에 관한 질문과 자료 요청을 전했다.
한국인은 어느샌가 커피에 깊게 빠져 있다. ‘얼죽아’(얼어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는 뜻)라는 말이 흔하게 쓰일 만큼 커피는 일상이다. 기호음료를 즐기는 것을 뭐라 할 수 없다. 다만 우리에게는 좋은 차 문화도 있는데 균형이 너무 기울었다.
요즘 말차가 유행이라고 한다. 말차도 좋지만 이 기회에 맑은 우리 차를 마셔보는 기회가 많은 이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나도 커피를 마시지만, 차는 소중한 마음으로 또 아낀다. 차는 알 수 없는 선격(仙格)과 품위가 있다. 몇 번이고 우릴 수 있고, 그때마다 다른 맛을 보여준다. 차 한 잔에 인간의 일생이 압축되어 있는 듯하다. 힘차게 파릇한 기운이 첫 잔이라면, 서너 번째 우리면 은은하고 여운이 짙다. 몇 번이고 마시면서 차의 변화를 그 짧은 시간에 두루 맛볼 수 있다. 그게 차의 힘이다. 굳이 말하자면, 카페인도 커피보다 훨씬 적어서(보통 20퍼센트 내외) 여러 잔을 마셔도 부담이 적다. 명징해지는 정신은 물론 차의 가장 큰 선물이다.
초의선사는 차를 재배하고 따고 말리고 덖고 마시는 전 과정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고 보았다. 노동하는 일이야말로 차의 세계라고 생각했다. 차는 또한 나누는 것이라 했다. 한 봉지의 작은 차를 벗에게, 선생님에게 나누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소중한 기억을 남기는 일이다.
예전에 한 선배는 내가 찾아가면 마시고 있는 차 봉지를 열어 한 줌이라도 나눴다. 차는 그렇게 줘도 결례가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차의 마음에는 순정한 나눔이 있는 셈이다.
가을이 되었다. 남쪽에는 머지않아 단풍이 들 것이다. 올해 단풍도 별로라는 말이 있다. 날씨가 너무 더우면 단풍이 곱게 들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래도 초의가 머물면서 차 향을 영원히 가람에 채워둔 아름다운 대흥사에 가보시라. 아니면 집에서, 찻집에서 차 한 잔을 우려 마시는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음식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