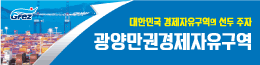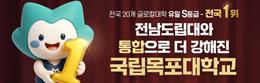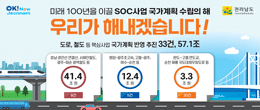산재·사망자 줄이지 못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국회 조사처 ‘영향 분석’ 보고서
산재자 수·재해율은 되레 늘어
광주·전남 2022년~올 상반기
144개 산업현장서 154명 사망
수사 지연·형사처벌 미흡도 문제
산재자 수·재해율은 되레 늘어
광주·전남 2022년~올 상반기
144개 산업현장서 154명 사망
수사 지연·형사처벌 미흡도 문제
 /클립아트코리아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차를 맞은 가운데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986건 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사업주 법 위반 사실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분석 결과 입법 이후에도 산업재해자 수가 늘고 사망자수가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산재 감소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2022년 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재해자수는 2022년 13만명, 2023년 13만 6000여명, 2024년 14만 2000여명 등 지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수도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의 수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2022년 0.65%, 2023년 0.66%, 2024년 0.67% 등이었다.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수 비율)은 2022년 1.10%, 2023년 0.98%, 2024년 0.98%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전남에서는 144개 산업현장에서 154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48명(광주 12명·전남 36명), 2023년 41명(8명·33명), 2024년 42명(4명·38명) 등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23명(광주 4명·전남 19명)의 작업자가 중대재해로 숨졌다.
정작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형사 처벌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광주지법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심 판결은 2건 뿐이었으며, 그나마도 벌금 5000만원 1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억원 1건 등이었다.
전국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10.7%에 달했으며, 이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비율인 3.1%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처벌 수준도 타 범죄에 비해 낮았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36.5%)보다 2.3배 높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총 47건이었으며 형량 평균은 1년 1개월에 그친데다 이 중 42건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였다.
벌금액수도 선박 난간 보수 공사 중 추락 사고를 겪은 삼강에스엔씨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은 사례 외에는 대부분 수천만원 수준이었다. 전국 평균 벌금 액수는 7280만원에 그쳤다.
또 전체 수사 대상 1252건 중 917건(73%)이 아직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고용노동부 사건의 50%, 검찰 사건의 56.8%가 수사 기간 6개월을 초과하는 등 수사 속도도 ‘하세월’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우선 법 시행령에서 ‘충실하게’, ‘필요한’ 등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큰 표현이 남발되고 있어 형사 처벌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높은 무죄율과 수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 지적이다.
현행법상 경제적 제재 방안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내놨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오히려 피해·가해자 간 합의를 유도해 형사처벌이 약화되게 만드는 효과만 내놓고 있으며 입법 취지인 ‘형사처벌 통한 산재 예방’ 효과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 각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등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현행법은 산업재해 전반을 억제하는 효과를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입법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를 재설계해서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986건 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사업주 법 위반 사실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지난 2022년 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재해자수는 2022년 13만명, 2023년 13만 6000여명, 2024년 14만 2000여명 등 지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수도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의 수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2022년 0.65%, 2023년 0.66%, 2024년 0.67% 등이었다.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수 비율)은 2022년 1.10%, 2023년 0.98%, 2024년 0.98%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전남에서는 144개 산업현장에서 154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48명(광주 12명·전남 36명), 2023년 41명(8명·33명), 2024년 42명(4명·38명) 등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23명(광주 4명·전남 19명)의 작업자가 중대재해로 숨졌다.
정작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형사 처벌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광주지법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심 판결은 2건 뿐이었으며, 그나마도 벌금 5000만원 1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억원 1건 등이었다.
전국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10.7%에 달했으며, 이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비율인 3.1%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처벌 수준도 타 범죄에 비해 낮았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36.5%)보다 2.3배 높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총 47건이었으며 형량 평균은 1년 1개월에 그친데다 이 중 42건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였다.
벌금액수도 선박 난간 보수 공사 중 추락 사고를 겪은 삼강에스엔씨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은 사례 외에는 대부분 수천만원 수준이었다. 전국 평균 벌금 액수는 7280만원에 그쳤다.
또 전체 수사 대상 1252건 중 917건(73%)이 아직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고용노동부 사건의 50%, 검찰 사건의 56.8%가 수사 기간 6개월을 초과하는 등 수사 속도도 ‘하세월’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우선 법 시행령에서 ‘충실하게’, ‘필요한’ 등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큰 표현이 남발되고 있어 형사 처벌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높은 무죄율과 수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 지적이다.
현행법상 경제적 제재 방안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내놨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오히려 피해·가해자 간 합의를 유도해 형사처벌이 약화되게 만드는 효과만 내놓고 있으며 입법 취지인 ‘형사처벌 통한 산재 예방’ 효과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 각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등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현행법은 산업재해 전반을 억제하는 효과를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입법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를 재설계해서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