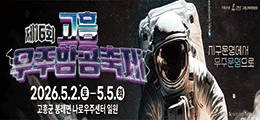‘영 케어러’의 숨 고르기를 위해 -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
“저녁이면 또 집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치매 앓는 할머니와 둘이 살거든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면 집에 계신 할머니가 걱정돼 일찍 일어서거나 아예 참석을 안 하게 됩니다.”
갓 스물을 넘은 대학생의 고백이다. 이처럼 중증 질환, 치매 등을 앓는 부모·조부모의 간병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영 케어러(Young Carer, 가족돌봄 청소년)’라 부른다.
겉으로는 평범한 학생이지만 집에서는 어른의 몫을 대신 짊어진 이들. 학업은 뒤로 밀리고 진로 탐색이나 취업 기회도 줄어들며 또래 관계에서 고립되기 쉽다. 장기간의 돌봄 부담으로 상당수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 건강 문제에 노출되지만 이를 도와줄 사회적 안전망은 매우 부족하다.
실제로 지난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의 약 7%가 ‘가족 돌봄을 정기적으로 맡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숙제나 시험 준비를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조차 하지 못한 채 가정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영 케어러’의 개념조차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정책 지원의 근거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반면 해외 사례는 한 발 앞서 있다. 1980년대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알려졌으며 2014년 ‘아동 및 가족법’을 통해 지자체가 영 케어러를 발굴하고 지원할 의무를 법에 명시했다. 일본도 2020년부터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 상담 교사와 연계해 학업 지원·심리 상담·돌봄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이 돌봄 때문에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사회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한국에도 영 케어러가 없을 리 없었지만 무려 30년 가까이 지나서야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영 케어러가 주목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2021년 아픈 50대 아버지를 간병하다 포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20대 청년 사건이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영 케어러를 복지 대상자로 발굴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후 이들을 ‘가족 돌봄 청년’이라 부르고 있다.
자신의 삶을 끌어가기에도 벅찬 나이에 어깨에 큰 바위를 지고 사는 이들. 무엇보다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마저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올 2월 국회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내년 3월부터 법 시행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하나의 큰 전환기를 맞고있다. 드디어 ‘가족’의 이름으로 홀로 짊어졌던 이들에게서 돌봄의 부담과 책임의 무게를 국가가 함께 나누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2023년 9월 광주시의회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지원조례’를 제정해 이들의 안정적 자립을 도울 근거를 마련했으며, 광주시는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펼쳐왔다. 또 광주시 서구는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수당을 지급해 이들이 희망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기도 했다. 관련 법 통과와 시행 이전부터 광주시는 나름의 준비를 해온 셈이다.
광주사회서비스원도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과 지원 경험 연구’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광주지역 청소년·청년(9~39세) 영 케어러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 설문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또 이들 영 케어러들을 위한 마음건강지원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 영 케어러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신과 가족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생활 지원, 심리 상담 지원, 건강 지원, 돌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호자로서 가족을 돌보는 것에 집중되었던 노고를 덜고 영 케어러 본인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설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와 시범사업의 발판 위에 영 케어러의 돌봄 부담을 덜어낼 공적 서비스가 확충된다면 무겁기만 했던 삶의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를 시간과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돌봄의 사각지대, 영 케어러를 향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때다.
갓 스물을 넘은 대학생의 고백이다. 이처럼 중증 질환, 치매 등을 앓는 부모·조부모의 간병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영 케어러(Young Carer, 가족돌봄 청소년)’라 부른다.
실제로 지난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의 약 7%가 ‘가족 돌봄을 정기적으로 맡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숙제나 시험 준비를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조차 하지 못한 채 가정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영 케어러’의 개념조차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정책 지원의 근거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한국에도 영 케어러가 없을 리 없었지만 무려 30년 가까이 지나서야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영 케어러가 주목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2021년 아픈 50대 아버지를 간병하다 포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20대 청년 사건이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영 케어러를 복지 대상자로 발굴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후 이들을 ‘가족 돌봄 청년’이라 부르고 있다.
자신의 삶을 끌어가기에도 벅찬 나이에 어깨에 큰 바위를 지고 사는 이들. 무엇보다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마저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올 2월 국회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내년 3월부터 법 시행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하나의 큰 전환기를 맞고있다. 드디어 ‘가족’의 이름으로 홀로 짊어졌던 이들에게서 돌봄의 부담과 책임의 무게를 국가가 함께 나누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2023년 9월 광주시의회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지원조례’를 제정해 이들의 안정적 자립을 도울 근거를 마련했으며, 광주시는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펼쳐왔다. 또 광주시 서구는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수당을 지급해 이들이 희망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기도 했다. 관련 법 통과와 시행 이전부터 광주시는 나름의 준비를 해온 셈이다.
광주사회서비스원도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과 지원 경험 연구’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광주지역 청소년·청년(9~39세) 영 케어러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 설문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또 이들 영 케어러들을 위한 마음건강지원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 영 케어러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신과 가족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생활 지원, 심리 상담 지원, 건강 지원, 돌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호자로서 가족을 돌보는 것에 집중되었던 노고를 덜고 영 케어러 본인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설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와 시범사업의 발판 위에 영 케어러의 돌봄 부담을 덜어낼 공적 서비스가 확충된다면 무겁기만 했던 삶의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를 시간과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돌봄의 사각지대, 영 케어러를 향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