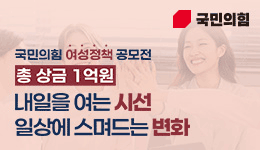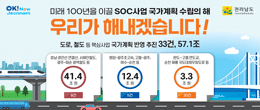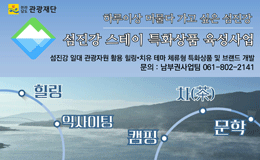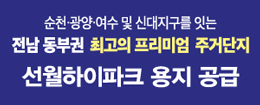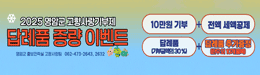문화광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 박진현 문화·예향국장, 선임기자
 |
지난달 31일 전 세계의 이목이 홍콩의 빅토리아 하버에 쏠렸다.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대규모 불꽃놀이와 음악쇼가 펼쳐지는 신년맞이 대규모 카운트다운(New Year Countdown Celebration)을 보기 위해서다. 매년 열리는 이벤트이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거웠다. 20여 년 간 베일에 가려졌던 서구룡 문화지구(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이하 WKCD)가 행사의 메인 무대였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WKCD는 1998년 홍콩이 ‘아시아의 문화허브’를 내걸고 빅토리아 하버 일대의 간척지 12만평에 예산 3조원을 투입해 17개의 초대형 문화 인프라를 건립하는 꿈의 프로젝트다. ‘쇼핑과 미식의 도시’에서 벗어나 뉴욕이나 런던처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亞문화허브’된 홍콩 서구룡
실제로 홍콩은 지난 2019년 중국식 오페라 하우스 ‘시추센터’(Xiqu Center)와 복합문화쇼핑몰 ‘K11 뮤제아’ 개관을 필두로 신개념 미술관 ‘M+’(엠플러스), 홍콩고궁박물관, 아트파크 등 오는 2026년까지 20여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가운데 지난 2021년 문을 연 M+미술관은 서구룡문화지구의 꽃이다. 이름 그대로 ‘미술관 이상의 미술관’(More than Museum)을 표방한 이 곳은 개관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단숨에 글로벌 명소로 급부상했다. 33개의 전시공간(6만5000㎡)을 통해 현대미술부터 근대미술, 영상, 디자인까지 아시아 최초의 동시대 시각미술관으로서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무엇보다 빼어난 건축미와 화려한 컬렉션이 압권이다. 영국 테이트모던 미술관을 설계한 스위스 건축가 헤르조그&드뫼롱은 짙은 녹색 유약을 건물 외벽에 입혀 대나무를 형상화하고 영화관, 레스토랑, 카페, 옥상정원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해 홍콩의 랜드마크로 탄생시켰다. 낮에는 전시를 감상하고 밤에는 홍콩의 야경을 즐기는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은 것이다.
특히 8000여 점에 달하는 컬렉션은 ‘아트홍콩’을 이끈 힘이다. 개관 이전부터 퀄리티 높은 소장품 확보에 주력한 홍콩은 2800억 원을 작품구입비로 지원했고, 스위스 출신의 유명 컬렉터 울리 지그(Uli Sigg)에게 러브콜을 보내 중국미술컬렉션 1460여 점을 기증받는 쾌거를 거뒀다.
새해부터 홍콩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 놓은 건 지지부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문화수도 조성사업)와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문화수도조성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2013년, 기자가 WKCD 프로젝트의 현장을 둘러볼 때만해도 지금의 모습을 예상하지 못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마찬가지로 당시 WKCD의 주요 시설들이 건립중이어서 허허벌판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구룡전철역에서 내려 빅토리아 하버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라는 안내판이 유일했다. 광주의 ACC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것과 달리 WKCD는 세상에 나올 기미가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났다. 홍콩이 정중동(靜中動)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광주는 정부의 예산삭감 등 적잖은 우여곡절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핵심시설인 ACC는 2차례 연기 끝에 당초 목표 보다 5년 늦게 개관했다.
개관 10돌 맞은 ACC 미래는
그렇다고 지나간 세월을 탓하기에는 광주가 갈 길이 멀다. 마침 올해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근간인 ACC가 개관한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다행스럽게도 ACC는 시행착오를 딛고 제2의 비상을 향한 출발선에 섰다. 개관 초기 동시대 현대예술의 발신지라는 틀에 갇혀 난해한 콘텐츠로 ‘그들만의 전당’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수년전부터 예술성과 대중성을 아우른 ‘열린’ 콘텐츠를 보완해 문턱을 낮추고 있다.
그동안 ACC가 진행한 프로그램은 총 1910건(2024년 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자체 창·제작 및 기획한 콘텐츠가 1255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기획한 2개의 융복합콘텐츠 전시는 개관 이래 각각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연간 방문객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2015년 개관이후 지난해 11월말 까지 누적 방문객도 1862만 명에 달하는 등 매년 방문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광주시의 문화컨트롤 타워인 광주문화재단(재단)도 장밋빛 미래를 향한 대장정에 나서 희망을 갖게 한다. 지난해 10월 미래문화도시, 예술지원 혁신방안, 시민중심 공간브랜딩 3개 분과를 구성해 45명의 민관산학 전문가들과 함께 문화도시의 미래를 그려 나가기로 한 것이다. 올해로 창립 14주년을 맞은 재단이 매머드 ‘문화예술 정책 거버넌스’를 조직해 광주의 내일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5년 새해가 밝았다. ‘문화로 먹고 사는 도시’를 내건 광주의 상상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길 기대한다.
‘亞문화허브’된 홍콩 서구룡
실제로 홍콩은 지난 2019년 중국식 오페라 하우스 ‘시추센터’(Xiqu Center)와 복합문화쇼핑몰 ‘K11 뮤제아’ 개관을 필두로 신개념 미술관 ‘M+’(엠플러스), 홍콩고궁박물관, 아트파크 등 오는 2026년까지 20여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빼어난 건축미와 화려한 컬렉션이 압권이다. 영국 테이트모던 미술관을 설계한 스위스 건축가 헤르조그&드뫼롱은 짙은 녹색 유약을 건물 외벽에 입혀 대나무를 형상화하고 영화관, 레스토랑, 카페, 옥상정원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해 홍콩의 랜드마크로 탄생시켰다. 낮에는 전시를 감상하고 밤에는 홍콩의 야경을 즐기는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은 것이다.
특히 8000여 점에 달하는 컬렉션은 ‘아트홍콩’을 이끈 힘이다. 개관 이전부터 퀄리티 높은 소장품 확보에 주력한 홍콩은 2800억 원을 작품구입비로 지원했고, 스위스 출신의 유명 컬렉터 울리 지그(Uli Sigg)에게 러브콜을 보내 중국미술컬렉션 1460여 점을 기증받는 쾌거를 거뒀다.
새해부터 홍콩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 놓은 건 지지부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문화수도 조성사업)와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문화수도조성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2013년, 기자가 WKCD 프로젝트의 현장을 둘러볼 때만해도 지금의 모습을 예상하지 못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마찬가지로 당시 WKCD의 주요 시설들이 건립중이어서 허허벌판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구룡전철역에서 내려 빅토리아 하버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라는 안내판이 유일했다. 광주의 ACC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것과 달리 WKCD는 세상에 나올 기미가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났다. 홍콩이 정중동(靜中動)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광주는 정부의 예산삭감 등 적잖은 우여곡절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핵심시설인 ACC는 2차례 연기 끝에 당초 목표 보다 5년 늦게 개관했다.
개관 10돌 맞은 ACC 미래는
그렇다고 지나간 세월을 탓하기에는 광주가 갈 길이 멀다. 마침 올해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근간인 ACC가 개관한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다행스럽게도 ACC는 시행착오를 딛고 제2의 비상을 향한 출발선에 섰다. 개관 초기 동시대 현대예술의 발신지라는 틀에 갇혀 난해한 콘텐츠로 ‘그들만의 전당’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수년전부터 예술성과 대중성을 아우른 ‘열린’ 콘텐츠를 보완해 문턱을 낮추고 있다.
그동안 ACC가 진행한 프로그램은 총 1910건(2024년 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자체 창·제작 및 기획한 콘텐츠가 1255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기획한 2개의 융복합콘텐츠 전시는 개관 이래 각각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연간 방문객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2015년 개관이후 지난해 11월말 까지 누적 방문객도 1862만 명에 달하는 등 매년 방문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광주시의 문화컨트롤 타워인 광주문화재단(재단)도 장밋빛 미래를 향한 대장정에 나서 희망을 갖게 한다. 지난해 10월 미래문화도시, 예술지원 혁신방안, 시민중심 공간브랜딩 3개 분과를 구성해 45명의 민관산학 전문가들과 함께 문화도시의 미래를 그려 나가기로 한 것이다. 올해로 창립 14주년을 맞은 재단이 매머드 ‘문화예술 정책 거버넌스’를 조직해 광주의 내일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5년 새해가 밝았다. ‘문화로 먹고 사는 도시’를 내건 광주의 상상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