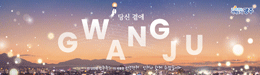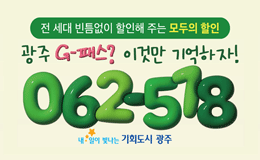[수필의 향기] 아! 전대 신문 -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그때 전대 신문이 그랬다.
1면, 첫 인상은 언제나 강렬했다. 녹두장군의 부릅뜬 눈과 움켜쥔 죽창 같았다. 기미 독립선언서 같았고, 1920년대 개벽, 조선지광 그리고 카프 같았다. 시대를 깨우는 날카로운 문장과 강렬한 흑백 판화로 어둠을 깨우고 시대 여론을 이끌었다.
1980년대는 절망의 시대였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비참함은 더했다. TV나 신문은 모두 전두환, 노태우 나팔수였다. 그래서 더 참혹했다.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산업현장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며 쓰러졌다. 젊은이들이 고문 당하고 투신해도 오직 3S 정책, 용비어천가 타령이었다. 그때 그 답답함을 토로해 준 ‘참언론’이 바로 대학 신문, 전대신문이었다. 전대신문은 당대 사회 민주 통일 노동 여성 등의 여러 의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새로운 세계를 꿈꾸던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제시한 신문이었다. 지금 우리가 나름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 것 역시 상당 부분 전대신문 덕분인지 모른다.
당시 전대신문은 주일에 두 번, 화·목요일에 캠퍼스 곳곳에 배포되었고 금방 동이 났다. 신문 나오는 날은 우체국도 붐볐다. 서로 자기 대학 신문을 다른 대학 친구들에게 발송해주기 바빴고 군에 있는 남자친구, 공장의 노동자들, 고향의 부모님에게도 보내졌다. 전대신문은 그렇게 용봉 캠퍼스를 떠나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더 많은 대학 신문들이 날개를 달고 용봉캠퍼스로 날아들었다. 그렇게 학과실 앞 우편함에는 시대를 깨우는 전국 대학 신문들이 수북수북 꽂혀 있었다.
아주 간혹, 따듯한 봄날 잔디밭에 여대생의 엉덩이에 깔려 비명횡사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학생들 책갈피에 가방 속에 끼어 소중히 귀가하였고, 시내버스나 화장실에서도 독자의 손과 손으로 이어지는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 학보는 그렇게 꼼꼼히 읽어야 하는 필수과목, 이른바 정독 신문이었다.
대학 신문이라고 꼭 딱딱하지만 않았다. 예술 문화 지면은 대학생들의 청춘, 사랑, 방황을 공유하는 낭만 가득한 곳이었다. 나는 신문 맨 뒤쪽 문예 지면에 수필을 간혹 싣곤 했다. 한 번은 수업을 받고 있는데 신문 기자가 찾아온 적도 있었다. 청탁 날짜를 깜박한 것이었다. 그때 부랴부랴 마감 시간에 쫓겨 썼는데, 신통하게 그 순간은 마치 거미가 꽁지에서 실을 뽑듯 글을 쓴 적도 아련하다.
그 전대신문 덕분에 개인적 인연도 적지 않았다. 어느 봄날 발신자가 없는 연분홍빛 꽃 편지가 오기도 했다. 서울 어느 대학에 다니는 생면부지의 미대생이었다. 한 번은 예쁜 여대생이 글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오기도 했다. 어느 날은 학과 교수님이 호출해서 찾아가니, 내 글을 붉은 볼펜으로 이곳저곳 교정을 보아놓고 계셨다. 국어학 전공이셨던 송하진 교수님은 어법의 힘을 손수 보여주셨다. 약학대학 박행순 교수님은 내 글을 ‘영자 신문’에 평론으로 다뤄주시기도 했다. 전대신문은 그렇게 내게 많은 인연을 맺어주었다.
제2학생회관 건물에 신문사가 있었는데, 노란 봉투에 고료를 꺼내주던 선생님도 선하다. 그 당시 장당 3000원의 고료는 지금 생각해도 적지 않아서 학비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얼마 전 어느 대학교 사회학과 장례식이 있었다. 또 지난 11월 18일에는 발행 예정인 전대신문 1668호를 발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위기에 처한 신문, 전대 신문이라고 비껴가겠는가마는 그 혹독하고 날카로운 칼날에도 견뎌냈던 신문이 빈사 상태라니 안타깝고 서글프다.
여전히 지금 신문, 대학 신문의 힘은 유효한 세상이다. 채상병과 이태원 문제는 물론이려니와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기후 위기, 여성과 노인, 노동자 문제, AI와 빈곤 등 각종 문제에서 신문은 늘 선구적 역할을 다해왔다. 또 전대신문 출신의 기자와 필자들 상당수가 여전히 우리나라 중역으로 곳곳에서 활동하며 세상을 이끌고 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여전히 칼보다 펜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는 빛, 전대신문을 발행하지 못했는데, 그 누구도 광야에 목 놓아 소리치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하겠는가. 재정 문제나 여타 문제가 없을까마는 1980년대 눈보라 속에서도 의연했던 전대신문, 그 신문이 부디 다시 힘껏 일떠서서 미치광이 계엄령 따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용봉캠퍼스와 무등 그리고 대한민국의 창공을 힘차게 비상하길 바란다.
1면, 첫 인상은 언제나 강렬했다. 녹두장군의 부릅뜬 눈과 움켜쥔 죽창 같았다. 기미 독립선언서 같았고, 1920년대 개벽, 조선지광 그리고 카프 같았다. 시대를 깨우는 날카로운 문장과 강렬한 흑백 판화로 어둠을 깨우고 시대 여론을 이끌었다.
1980년대는 절망의 시대였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비참함은 더했다. TV나 신문은 모두 전두환, 노태우 나팔수였다. 그래서 더 참혹했다.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산업현장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며 쓰러졌다. 젊은이들이 고문 당하고 투신해도 오직 3S 정책, 용비어천가 타령이었다. 그때 그 답답함을 토로해 준 ‘참언론’이 바로 대학 신문, 전대신문이었다. 전대신문은 당대 사회 민주 통일 노동 여성 등의 여러 의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새로운 세계를 꿈꾸던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제시한 신문이었다. 지금 우리가 나름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 것 역시 상당 부분 전대신문 덕분인지 모른다.
대학 신문이라고 꼭 딱딱하지만 않았다. 예술 문화 지면은 대학생들의 청춘, 사랑, 방황을 공유하는 낭만 가득한 곳이었다. 나는 신문 맨 뒤쪽 문예 지면에 수필을 간혹 싣곤 했다. 한 번은 수업을 받고 있는데 신문 기자가 찾아온 적도 있었다. 청탁 날짜를 깜박한 것이었다. 그때 부랴부랴 마감 시간에 쫓겨 썼는데, 신통하게 그 순간은 마치 거미가 꽁지에서 실을 뽑듯 글을 쓴 적도 아련하다.
그 전대신문 덕분에 개인적 인연도 적지 않았다. 어느 봄날 발신자가 없는 연분홍빛 꽃 편지가 오기도 했다. 서울 어느 대학에 다니는 생면부지의 미대생이었다. 한 번은 예쁜 여대생이 글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오기도 했다. 어느 날은 학과 교수님이 호출해서 찾아가니, 내 글을 붉은 볼펜으로 이곳저곳 교정을 보아놓고 계셨다. 국어학 전공이셨던 송하진 교수님은 어법의 힘을 손수 보여주셨다. 약학대학 박행순 교수님은 내 글을 ‘영자 신문’에 평론으로 다뤄주시기도 했다. 전대신문은 그렇게 내게 많은 인연을 맺어주었다.
제2학생회관 건물에 신문사가 있었는데, 노란 봉투에 고료를 꺼내주던 선생님도 선하다. 그 당시 장당 3000원의 고료는 지금 생각해도 적지 않아서 학비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얼마 전 어느 대학교 사회학과 장례식이 있었다. 또 지난 11월 18일에는 발행 예정인 전대신문 1668호를 발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위기에 처한 신문, 전대 신문이라고 비껴가겠는가마는 그 혹독하고 날카로운 칼날에도 견뎌냈던 신문이 빈사 상태라니 안타깝고 서글프다.
여전히 지금 신문, 대학 신문의 힘은 유효한 세상이다. 채상병과 이태원 문제는 물론이려니와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기후 위기, 여성과 노인, 노동자 문제, AI와 빈곤 등 각종 문제에서 신문은 늘 선구적 역할을 다해왔다. 또 전대신문 출신의 기자와 필자들 상당수가 여전히 우리나라 중역으로 곳곳에서 활동하며 세상을 이끌고 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여전히 칼보다 펜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는 빛, 전대신문을 발행하지 못했는데, 그 누구도 광야에 목 놓아 소리치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하겠는가. 재정 문제나 여타 문제가 없을까마는 1980년대 눈보라 속에서도 의연했던 전대신문, 그 신문이 부디 다시 힘껏 일떠서서 미치광이 계엄령 따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용봉캠퍼스와 무등 그리고 대한민국의 창공을 힘차게 비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