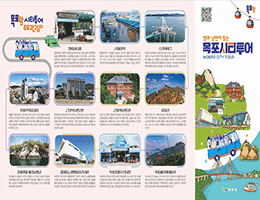용담유사, 최제우 지음·박맹수 옮김
“동학은 민초들을 살리려는 ‘살림 사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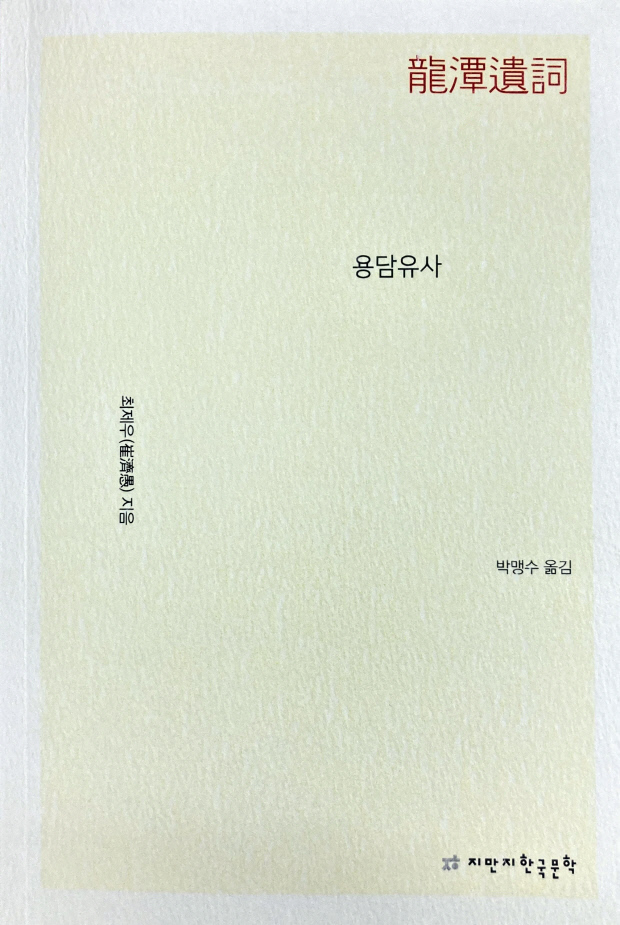 |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쓰고 무엇하리/ 무수장삼 떨쳐입고 이 칼 저 칼 넌짓 들어/ 호호망망 너른 천지 일신으로 비켜서서/ 칼 노래 한 곡조를 시호시호 불러내니/ 용천검 날랜 칼은 일월을 희롱하고/ 게으른 무수장삼 우주에 덮여있네/ 만고명장 어디 있나 장부당전 무장사라/ 좋을시고 좋을시고 이내 신명 좋을시고.”
동학을 창도한 수운(水雲) 최제우(1824~1864) 선생이 1861년 3~4월께 지은 ‘검가’(劍歌·칼노래)는 10구에 불과하지만 강렬한 변혁의 의지를 품고있다. 이에 조선 조정은 ‘칼노래’를 부르며 몰래 무리를 모아 난을 일으키려 했다는 빌미를 만들어 수운을 체포해 처형했다. 경신 사월(1860년 음력 4월) 5일, 오랜 구도 행각 끝에 득도를 한 수운은 포교를 통해 동학의 가르침을 전파한다. 19세기 중엽, 조선 민초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나라 안으로는 전염병과 재해, 토지세, 군역 등으로 고통 받았고, 나라 밖으로는 밀려드는 서양 열강에 위기감을 느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동학은 민초들 사이에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동학의 가르침은 2대 교조 해월(海月) 최시형(1827~1898)의 38년에 걸친 지하 포교를 거쳐 마침내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분출됐다. 당시 인구 1052만 명 가운데 250만~350만 명(희생자 30만 명 추정)이 동학농민혁명 대열에 참가했다고 한다. 수운에서 비롯된 동학은 혁명에 사상적·조직적 기반을 제공했다.
‘용담유사’(龍潭遺詞)는 ‘검가’를 비롯해 수운이 지은 한글가사(歌辭) 9편으로 구성된 핵심 동학경전이다. 득도한 1860년부터 관에 의해 체포되는 1863년 사이에 경주 용담정과 남원 은적암 등지 피신과정에서 주로 쓰여 졌다. ‘용담유사’는 1881년 충청도 단양 천동에서 목활자본으로 첫 간행됐고, 1883년에 ‘북접’이라는 이름으로 간행(계미중추판)됐다.
동학연구자인 박맹수 원광대 명예교수는 계미중추판을 저본으로 삼아 MZ세대를 위해 ‘용담유사’를 현대 한글로 새롭게 옮겼다. 수운은 민초들에게 익숙한 가사체 형식 속에 동학의 ‘시천주(侍天主·모든 사람은 제 안에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존재를 모시고 있다)’ 등 새롭고 혁신적인 사상을 담았다. 득도 직후에 쓰여진 ‘용담가’에 ‘하늘님’이, ‘권학가’에 ‘보국안민’(輔國安民·잘못되어 가는 나라를 바로잡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이, ‘몽중노소문답가’(夢中老小問答歌)와 ‘안심가’(安心歌)에 ‘다시 개벽’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다.
신간에 실린 가사 가운데 ‘검가’가 유독 눈길을 끈다. 1881년과 1883년 간행된 ‘용담유사’에는 실려있지 않은 가사다. 박 교수는 전북 진안 용담면에서 ‘검가’가 실려있는 신해년(1911년) 필사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발굴한 바 있다. 여러 판본에 실려있는 ‘검가’를 서로 비교·대조해 처음으로 정본화했다. 박 교수는 ‘칼노래’에 대해 “동학농민혁명 당시 수많은 농민군들을 혁명의 대열로 안아들게 하고, 근대식 무기 앞에서도 목숨 걸고 나아가 싸우게 했다”고 말한다.
책 말미에 붙여진 ‘동학의 길, 문명개벽의 길’이라는 제목의 해설을 통해 ‘살림의 사상’ 동학의 새로운 면모를 접할 수 있다. 박 교수는 “1860년에 탄생한 동학은 타자에 대해 활짝 열러 있으면서도 제 나라 제 땅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세상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사상이었다”라고 강조한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우선적으로 ‘용담유사’를 꼼꼼하게 읽으며 조선 후기 민초들의 마음속 결을 따라 가 볼 일이다. <지만지한국문학·1만88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동학연구자인 박맹수 원광대 명예교수는 계미중추판을 저본으로 삼아 MZ세대를 위해 ‘용담유사’를 현대 한글로 새롭게 옮겼다. 수운은 민초들에게 익숙한 가사체 형식 속에 동학의 ‘시천주(侍天主·모든 사람은 제 안에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존재를 모시고 있다)’ 등 새롭고 혁신적인 사상을 담았다. 득도 직후에 쓰여진 ‘용담가’에 ‘하늘님’이, ‘권학가’에 ‘보국안민’(輔國安民·잘못되어 가는 나라를 바로잡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이, ‘몽중노소문답가’(夢中老小問答歌)와 ‘안심가’(安心歌)에 ‘다시 개벽’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다.
신간에 실린 가사 가운데 ‘검가’가 유독 눈길을 끈다. 1881년과 1883년 간행된 ‘용담유사’에는 실려있지 않은 가사다. 박 교수는 전북 진안 용담면에서 ‘검가’가 실려있는 신해년(1911년) 필사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발굴한 바 있다. 여러 판본에 실려있는 ‘검가’를 서로 비교·대조해 처음으로 정본화했다. 박 교수는 ‘칼노래’에 대해 “동학농민혁명 당시 수많은 농민군들을 혁명의 대열로 안아들게 하고, 근대식 무기 앞에서도 목숨 걸고 나아가 싸우게 했다”고 말한다.
책 말미에 붙여진 ‘동학의 길, 문명개벽의 길’이라는 제목의 해설을 통해 ‘살림의 사상’ 동학의 새로운 면모를 접할 수 있다. 박 교수는 “1860년에 탄생한 동학은 타자에 대해 활짝 열러 있으면서도 제 나라 제 땅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세상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사상이었다”라고 강조한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우선적으로 ‘용담유사’를 꼼꼼하게 읽으며 조선 후기 민초들의 마음속 결을 따라 가 볼 일이다. <지만지한국문학·1만88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